-

-
최재천 스타일 - 지적생활인의 공감 ㅣ 최재천 스타일 1
최재천 지음 / 명진출판사 / 2012년 7월
평점 :

품절

딱딱하지 않은 과학자의 에세이
이 책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의 에세이이다. 이 책은 그와 관련된 사람이나 개념, 또는 서적을 소재로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이야기 해 나가는 형식의 에세이다. 과학자가 쓴 글이라 그런지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일관되고, 다른 에세이에 비해 조금은 덜(?) 감성적이다. 내가 최재천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통섭(consilence)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이다.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제자이기도 한 저자는 스승의 책을 우리나라 말로 ‘통섭'이라고 번역해 국내에 출판했다. 통섭이라는 개념은 최재천 교수를 알게 해주는 두 단어 중 하나이다. (또 하나는 아마도 ‘다윈'이겠지) 통섭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교육의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학교에 다니는 음악에 재주있는 아이들은 악보나 악기에 대해 배우기 전에 숲으로 간다. 그곳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변의 사물에 눈을 뜬다. 우리라면 어떨까? 피아노 신동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학원에 보낸다. 하루 12시간씩 피아노만 배우고 국어며 수학이며 다 빼고 연주만 하게 한다. 유도 신동은 열 두시간 유도만 하고, 피아노 신동은 열두시간 피아노만 친다. 그런 엘리트 교육이 우리나라를 외향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올려놨을 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순위에 들지 못한 대부분의 인생을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겼다.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통섭은 하나의 전문분야로는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편향된 교육과 많이 닮아 있다.
통합, 융합 아닌 통섭
통섭은 하나의 학문으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여러 학문을 모아 분석함으로써 최상의 답을 찾아낸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좀 더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모아야 하며,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 더 완벽한 답을 찾는다. 음악 공부하는 아이들이 음악만 공부하지 않고 눈을 감고 새소리, 물소리를 듣는 이유는 그런 교육 속에서만이 진정한 마에스트로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라 할지라도 다른 분야의 지식을 배경으로 할 수 있어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러다 보면 또 결국 진화론으로 이야기로 돌아간다. 통섭이라는 개념을 생물학 쪽에 적용 시키다 보면, 저자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
인간은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최재천 교수가 만든 용어이다. 저자의 책이나 강의를 듣다보면 알게되는 사실이지만, 사실 그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알면 사랑한다'이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호모 심비우스'이다. 진화론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학문에 대해 지식을 쌓는다는 의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걸 강하게 느끼는 것이 저자의 글을 볼 때이다.
진화는 어느 한 개체가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살아남은 후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다른 종의 개체가 서로 도우며 살아 남은 증거이기도 하다. 진화는 결코 1등이 살아 남는 것이 아니다. 저자의 말처럼 ‘나는 가수다'에서 한 명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살아 남듯, 진화 또한 앞선 6명의 개체가 살아 남는 것과 같다. 나머지 개체들은 서로 생존에 도움을 주며 공생하고 있으며 이런 개념이 '호모 심비우스'의 중요 개념이다. 저자는 늘 그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진화에서 살아 남은 종은 특별히 우수하다고 판명된 것이 아니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 교수는 ‘생명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에서,
“만일 우리가 지구의 역사가 담긴 영화를 다시 돌린다고 할 때 마지막 장면에 우리 인간이 또 다시 등장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말한다.
인간이 생겨나 생존한 것은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뛰어나서도 아니고, 유난히 적응을 잘해서도 아니다. 인간은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자연 선택 과정의 우연한 결과물일 뿐이다. (다윈지능 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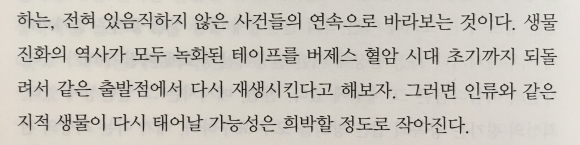
[생명,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 스티븐 제이굴드]
그런 생각 때문인지 에세이 곳곳에 겸손함이 묻어나고 공생을 강조한다. 인간이라고 해서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다룰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며, 우리가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 영향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 말하고 있다. 특히 제인 구달 박사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그 느낌은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너무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극곰은 얼음과 얼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줄 모른다. 예전에는 그런 걸 측정할 필요가 없었다. 얼음이 늘 그들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p.60)
호모심비우스 즉 공생하는 인간을 그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통섭'의 개념처럼, 모든 생명체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완벽한 공존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보여주려 했던 것은 과학자 최재천이 아니라, 인간 최재천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읽다보면 결국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고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느낀다. 인간 최재천을 보여주는 일이 곧 과학자 최재천을 보여주는 일이고 그래서 더욱 진솔한 느낌이 나는 에세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