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의미의 축제
밀란 쿤데라 지음, 방미경 옮김 / 민음사 / 2014년 7월
평점 :

절판

지난 토요일은 약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의미했다. 토요일이면 피로에 찌든 몸이, 곧장 침대로 쓰러지거나, 허겁지겁 당분을 섭취하기에 바빴는데, 지난 토요일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피곤을 예상하고 아무런 일정도 계획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다. 아는 이들에게 단체톡을 보냈지만 2시간 동안 누구도 답톡이 없었다. 무슨 일이지 싶어 일일이 전화를 걸자, 아무도 받지 않았다. 어쩐지 의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려던 순간, 다행히 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고, 연속해 답톡들이 달렸다. 그 순간 나는 불안감이 점차 고조될까 두려워, 아무데로나 가고 있었고, 그 아무데는 결국 물건이며 사람이며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대형마트였고, 대형마트에 들어서는 입구에서 갑자기 돌연 이래도 되나 싶게'무의미'해졌다. 나는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생각에 휩싸여 그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 시간쯤 지나 차로 돌아왔을 때, 뒷자리에는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가 벗어놓은 자켓 아래에 하얀 모서리를 내밀고 있었다. 띠지에는 쿤데라의 흑백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고, 어쩐지 나는 쿤데라를 그 어떤 작가의 얼굴보다 뚜렷하게 기억한다는 착각이 들었다. 같은 사진, 확대된 사진, 흑백 사진, 그리고 체코, 프라하, 여성, 섹스에 대한 그의 거침없는 글을 몇 번 본 것이 더욱 그를 잘 안다는 착각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잘 안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착각의 소지가 있었다.
라몽, 다르델로, 알랭(아마도 그럴 것이다, 읽고 바로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므로 미처 인물 이름을 재확인할 겨를도 없었다)은 뤽상부르 공원을 각자의 사연으로 돌고 있다. 처음과 끝인 뤽상부르 공원, 이 장소는 상징적으로 재현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연극 무대를 위해 급조된 흔한 공원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 급히 설계된 배경은 무슨 역사성인가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역사인지 잘 알아보지 못하게끔 이중 설계되어 있어, 사실 읽는 이의 입장에서 그저 '무대'이상으로 보이지 않곤 했다. 그러니까 이 '무대'라는 느낌과 작중 인물들의 '대사'적인 대화는 소설을 '연극 대본' 혹은 '허구의 것'으로 의도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실제로 인물들은 자신들이 고안해낸 파키스탄어(라고 되어 있지만 결코 파키스탄어가 아닌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다르델로의 삶과 죽음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자신들만의 희한한 연극을 지속한다. 대체로 어이가 없지만, 이 상황에서 그들은 촌철살인을 나눈다. 우리가 무의미해져야 하는 이유를 열변한다.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곤하던 신비로움, 의미를 부여하는 장난스러운 행위들은 이제 그 장난의 행위자들에게도 지겹고 지루한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의미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쓸모없음의 기분을 사랑해야한다는 것이다. 가만 보면 작가는 그 '쓸모없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수중에 책은 없지만 단 한 장 찍어놓은 페이지가 증거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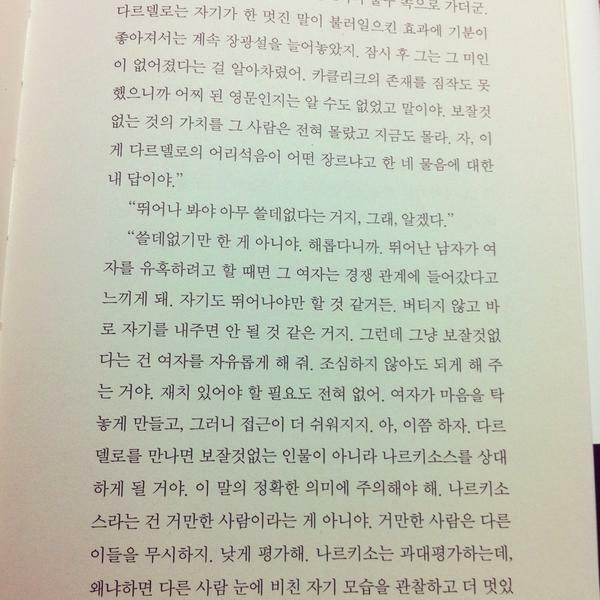
쿤데라는 종종 그랬듯이 이번에도 작가 그 자신으로 소설에 불쑥 등장하고, 이걸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변사'라고 할텐데,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쿤데라는 자신의 서술을 반복하고, 자신의 이 반복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면서 능청을 떤다. 만약 쿤데라의 소설을 처음 보는 이라면 '당황'할 테고, 여러 번 보는 이라면 '친근'하고, 없으면 허전할 테다다. 서술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그것이 장난 정도로 비춰지지 않고 '문학성'으로 인정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쿤데라는 다른 작가들과 좀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된다.(아마도 그 위치는 수직적이라기보다 수평적 범위에서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무의미의 축제>의 인물들은 정신없이 쏟아지는 격이다. 너무 짧아서, 몇 안 되는 인물일지라도 너무 많아 보인다. 하지만 단연 돋보이는 존재는 칼리닌이다. 스탈린의 연민을 '회복'하는 존재. 잦은 요의로 초라해진 존재.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귀족)으로서 고귀한 위치에 놓여있어, 대중 앞에 곧잘 나서는 존재였다.(원하든 원치않든) 그가 대중 연설 같은 걸 하면 도중에 수 차례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해서, 연단에 들고 날 때마다 대중의 만세 외침을 받아야 했다. 나중에는 그 주기가 짧아져 대중의 외침이 무슨 축제의 환호성처럼 들리며, 결국 대중들이 떠들썩한 흥분에 휩싸여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게 한, (요의를)참을 수 없는 존재였다.
칼리닌은 모든 인간이 경험한 고통을 기념하여, 자기 자신 외에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필사적인 투쟁을 기념하여 오래 기억될 유일한 이름이지(44)
예전처럼 모두 여기 있는데, 칼리닌만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끔찍한 요의에 쫓겨 크렘린 궁 복도들을 헤매고 다녀보지만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나가 거리를 달린다.(128)
150페이지, 여백이 많은 이 소설은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미뤄져 혼자 남게 된 카페에서 다 읽었다. 사실 책을 좀 읽으려고 한 시간 일찍 나간 자리였는데 한 시간이 더 늦춰져, 두 시간을 혼자 보내야했다. 두 개의 서점을 돌고, 잡화점을 구경하고, 물을 사 먹고 요거트를 사먹고 카페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있어도 시간은 남았다. 그리고 나는 몇 쪽 남지 않은 책을 찬찬히 다 읽었고, 돌아오는 길에 그 날 만난 사람들 중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을 건네줬다.(이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