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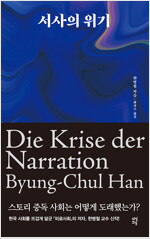

마르틴 부버(1878-1965)의 하시디즘 100개의 이야기가 번역됐다. 하시디즘은 유대교 경건주의 운동으로 짤막한 우화를 많이 남겼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1885)>와 집필시기가 비슷하다. 구도자의 삶과 신앙의 신비를 쉬운 일화에 녹여낸 것도 공통점이다.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이 천사 미하일을 만난 스토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된 것 같기도, 서머싯 몸의 면도날(1944)의 주인공 래리의 전생이 할머니가 침대 맡에서 들려주던 구술버전으로 짤막하게 각색된 것 같기도 하다.
훈계는 없다. 말은 적지만 속은 단단하다. 가르치려들지 않고 노골적이지 않다. 허나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흐릿하지도 않다. 담백한 문장이 또각또각 발을 맞춰 나아가다 어느 대목에서 문득 멈춰 한 토막 스르르 물러선다. 고요한 웃음 속에서 독자는 제 그림자와 조우한다.
덮고 난 뒤 오히려 파문이 번져가듯 둥글게, 잔잔한 마음이 사각사각 페이지 사이에서 울린다. 흡사 얇은 종이를 넘기다 손끝에 남는 미세하되 뚜렷한 촉감처럼 보이지 않되 또렷한 인상이다.
이런 류의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2025년 말에 번역된 한병철과 시몬 베유와의 대화 <신에 관하여>와 걸출한 독문학자 김태환의 <이야기의 논리>도 필히 마음에 들어할 것 같다. 한병철의 다른 아포리즘 중에서는 <서사의 위기>도.
책 속에 수록된 일화는 "어느 날 압테의 랍비가 한 마을에 도착했다(p104)"라든지 "부르카의 랍비 이츠하크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제자 하나가 코브린의 랍비 모셰를 찾아갔다"같은 이동이 사건을 전개하는 케이스와
말했다, 조언을 구했다, 토론을 벌였다, 생각을 했다, 보게 되었다, 싸웠다 같은 술어로 시작하는 케이스
"하나님은 어디계신가?" 질문으로 포문을 여는 케이스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마치 황석영처럼 속도감 있는 용언 중심으로 서술해 스토리가 빠르게 질주하며 해석과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신화, 민화 등등 오래도록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전해진 스토리란 이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