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타임즈를 보는 이유는 김세정 저널리스트 때문이다. 글이 다르다. 원어민 느낌이 난다. 물론 영국 브리스톨 킹칼리지에서 영문학 학사, 미국 아메리칸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마냥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다. 더코리아타임즈 입사 후 거의 20년에 이르는 동안 한국의 이슈, 문화와 콘텐츠를 어떻게 영어스럽게, 맛깔나게 번역할 것인지 고민했기 때문이다. 정다현 기자도 있고 더코리아타임즈가 다른 한국내 영자신문보다 좋다.
중앙일보는 외부필진 인터뷰가 좋은 편인데 중앙데일리는 그 인터뷰를 잘 번역하는 데 강점이 있으나 코리아헤럴드와 더불어 깊이있는 특집기사 같은 부분이 조금 아쉽다. 더코리아타임즈는 특집도 좋고, AP 같은 외부통신사에서 공급받는 기사도 좋다.
무엇을 보고 영작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쓴 기사같은 글이 아니라 영어답게 영어를 쓰는 기사는 어떠한가? 노하우 세 개가 있다.
1. 우리말은 체언을 반복한다.
선수는 말했다. 선수는 이적했다. 선수는 골을 넣었다.
작가는 말했다. ~라고 작가는 표현했다. 작가의 책에 의하면..
그러나 영어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동의어로 재서술해서 대상의 의미를 확장한다. 지난 주말 김세정 기자의 글 냉면에서 보면
냉면 한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재서술해서 뉘앙스를 풍부하게 더해 독자로 하여금 냉면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게 했다.

1) 한국의 여름 국수 Korea's summer noodels
2) slippery, chilled noodles served in icy broth, topped with slices of meat, pickled radish and pear 얼음 국물에 고기 조각, 단무지, 배를 얹은 미끄럽고 차가운 국수
3) this refreshing comfort food 이 상쾌하고 간편한 음식
4) 그외에도 Korean cold noodles, a summer dish, cold refreshment, chilled noodle dishes 한국식 차가운 냉면, 여름 요리, 시원한 간식, 시원한 국수 요리 같은 표현으로 썼다. 영작의 paraphrasing기법이다.
2. 술어를 잘 사용한다.
중고등학교 때는 내신성적과 입시위주의 잘못된 영어교육의 결과 뉘앙스 분별없는 무작정 단어암기로 올바른 정답 하나 맞추는 위주로 공부하다가
대학을 갔더니 여전히 취직, 진학을 위해 토플, 토익시험 동의어 암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인.
좋은 원서를 읽지 않으니 원어민이 동사를 얼마나 풍부하게 사용하는지 그 감각을 잘 모른다.
요즘 다시 읽고 있는 해리포터 3권에서만 봐도 스니코스코프의 시끄러운 소리를 버논 삼촌의 낡은 양말에 감싸 그 소리가 줄어들게했다라는 말을 deadened the sound라고 했다. 명사로만 알고 있는 dead를 동사로 활용했다.
카톡보내줘! 라는 말도 please send me a message to me through Kakaotalk같이 번거롭게 말하지 하고 katalk me하고 술어로 사용한다. 원어민적 감각이다.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룬 김세정 기자의 이번 주 다른 기사에서는 손님이 몰려들다라는 말을 flock in이라고 표현했다. flock은 양떼의 떼, 무더기를 말하는 말로 in이라는 전치사까지 넣어 손님들이 떼지어 레스토랑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공감각까지 주었다. 전치사의 다채로운 사용이 술어의 깊이를 더한다.
3. 라임을 잘 쓴다.
셰익스피어 이후 영시의 유구한 전통에 영향을 받아 산문에도 장단모음, 각운, 라임 등의 시적 장치가 글의 맛을 더해준다. 영시 전통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은 연극대사고 당대에서 매체와 무대를 바꾸어 발전시킨 것은 랩이다.
예컨대 아까 언급했던 해리포터 3권에서도 The witch's eyes moved from Scabbers's tattered left ear to his front paw, which had a toe missing, and tutted loudly.
tattered left ear 망가진 왼쪽 귀의 t-e-d + l 라임이
tutted loudly 혀를 쯧쯧 찼다로 연결된다.
퓰리쳐상급의 좋은 역사교양서(논픽션)에서도 이런 산문의 맛을 더하는 기법이 자주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 MIT 역사교수 존 다우어의 패배를 껴안고(Embracing Defeat, 한국어판은 절판)의 인트로에서도 이런 표현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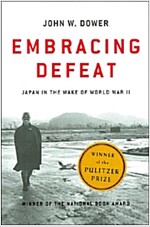


genie out of the bottle─and that genie had become a blood-soaked monster. 램프의 요정을 꺼냈는데 그 요정이 피칠갑을 한 몬스터였다는 것, 즉,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의미.
natter on about how it might be necessary 투덜거리다 좋은 표현. 말하다에서 다운그레이드된 표현으로 how 이하의 절에 대한 저자의 관점이 포함된다.
strange seclusion s의 각운을 맞추면서 효과적으로 압축해서 역사적 평가를 내림
messianic fervor 일본제국의 태평양전쟁에 대한 광기를 메시아적 열정이라고 동의어를 활용해서 표현
일본의 점령은 (백인이 미개인을 개화시키는 의무를 지녔다는) 백인의 짐이라고 알려진 colonial conceit 의 천박한 행위(immodest exercise)였다.
라는 부분에 c와 c의 각운도 있고, conceit은 비유, 자만심, 기발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장치라는 삼중의 의미가 있어서 일본의 식민정책에 대해 이 삼중의 의미가 약간씩 드러난다.
백인의 짐을 동양적 버전으로 잘못 적용했다, 자만심이 많았다,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등등
이런 맛깔스러운 글이 번역이 참 힘들고 역자는 결국 한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모든 의미를 희생할 수 밖에 없다.
출발어의 문제가 아니라 도착어의 문제인데 패션이나 KPOP의 수용도 문제의 결이 같을 것이다. 수신자가 발신한 자의 메시지와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수신자가 위치한 문화권의 감각때문이다. 도착어에 출발어와 같은 언어적, 문화적 맥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러한 맥락까지 만들어줘야한다. 국가간 문화적 교량이자 언어의 중간자인 문화번역가 모두에게 주어진 부담이다. 또한 역자의 각주로 매번 그 선택의 의미를 부연설명하면 페이지수가 증가해 출판사에서 좋아하지 않을테다.
이런 풍부한 글의 맛을 다 음미하려면 독자 스스로 원서를 읽어야하지만 원서를 읽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비유하자면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직접 밀을 재배하고 소도 기른 다음 치즈발효에 베이커리법까지 익힌 다음 자기가 해먹어야하는 것이다. 즉물적 쾌락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너무 지난할 것이다.
게다가 기초 영문법은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맞닥뜨리는 고급영어는 각개격파해야한다.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글은 스스로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하기 때문. 하산한 이후의 수행이 더 어려운 법이다.
그러니 남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남의 언어로 쓰여진 글은 더더욱 더. 하지만 그 보상은 확실히 따른다. 정신적 보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