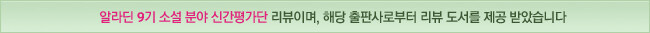[미칠 수 있겠니]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미칠 수 있겠니]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미칠 수 있겠니
김인숙 지음 / 한겨레출판 / 2011년 5월
평점 :



어떤 언어인들 그렇지 않겠냐만은 특히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또 문장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소지가 참 높다. "미칠 수 있겠니"라는 제목은 한 번 미쳐볼래?가 아니라 어떻게 미칠 수 있겠니라는 뜻이라는 것을 책을 다 읽고나서야 이해했으니 말이다.
살면서 미치고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고 싶었던 일이 좌절되었을 때, 인정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더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의지도 없을 때, 나는 미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죽고 싶었다. 아직 잘 살고 있지만. 그보다...미치고 싶었던 순간은 아마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킬 수 없었을 때...가 아닐까.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 하지만 서로의 자존심에, 고집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꼭 미칠 것만 같다.
"우연이란 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면 그것이 필연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법이다."...151p
이 소설은 진과 진이라는 주인공들이 같은 이름을 가진 것처럼 우연과 사건이 만나고 필연처럼 이어진다. 현재와 과거(칠년 전)를 오가면서 그녀에게 잊혀진 어떤 중요한 사건을 짜맞추어 간다. 현재에서는 도저히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쓰나미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시체와 슬픔을 목격하며 살아남고, 과거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미치면 안 돼? 그냥 미쳐서 살면 왜 안 되는데?"...235p
안타깝게도 난 여자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도 진보다는 유진의 입장에 공감이 된다. 삼십 년이나 게이임을 숨기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케이크 가게를 열고나서 드디어 섬으로 왔다는 덴마크인에게도. 왜...그러면 안되는 걸까. 왜 그렇게 그를 떠나보내기 전에 이해해주었으면 안되었던걸까.
김인숙이라는 작가는 <<소현>>을 통해 만났다. 아름다운 문체와 간결함이 참으로 마음에 들었던 작가이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 그녀가 말하려던 것은 정녕 무엇일까. 그렇게 미칠 것 같은 일을 여러 번 겪고나서도 결국은 정신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게 삶이라고? 물론이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그렇게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면...더 살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말이다. 때로는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선 한 번쯤 미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건의 필연성이 무척이나 아쉬웠던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