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타는 소녀들
C. J. 튜더 지음, 이은선 옮김 / 다산책방 / 2021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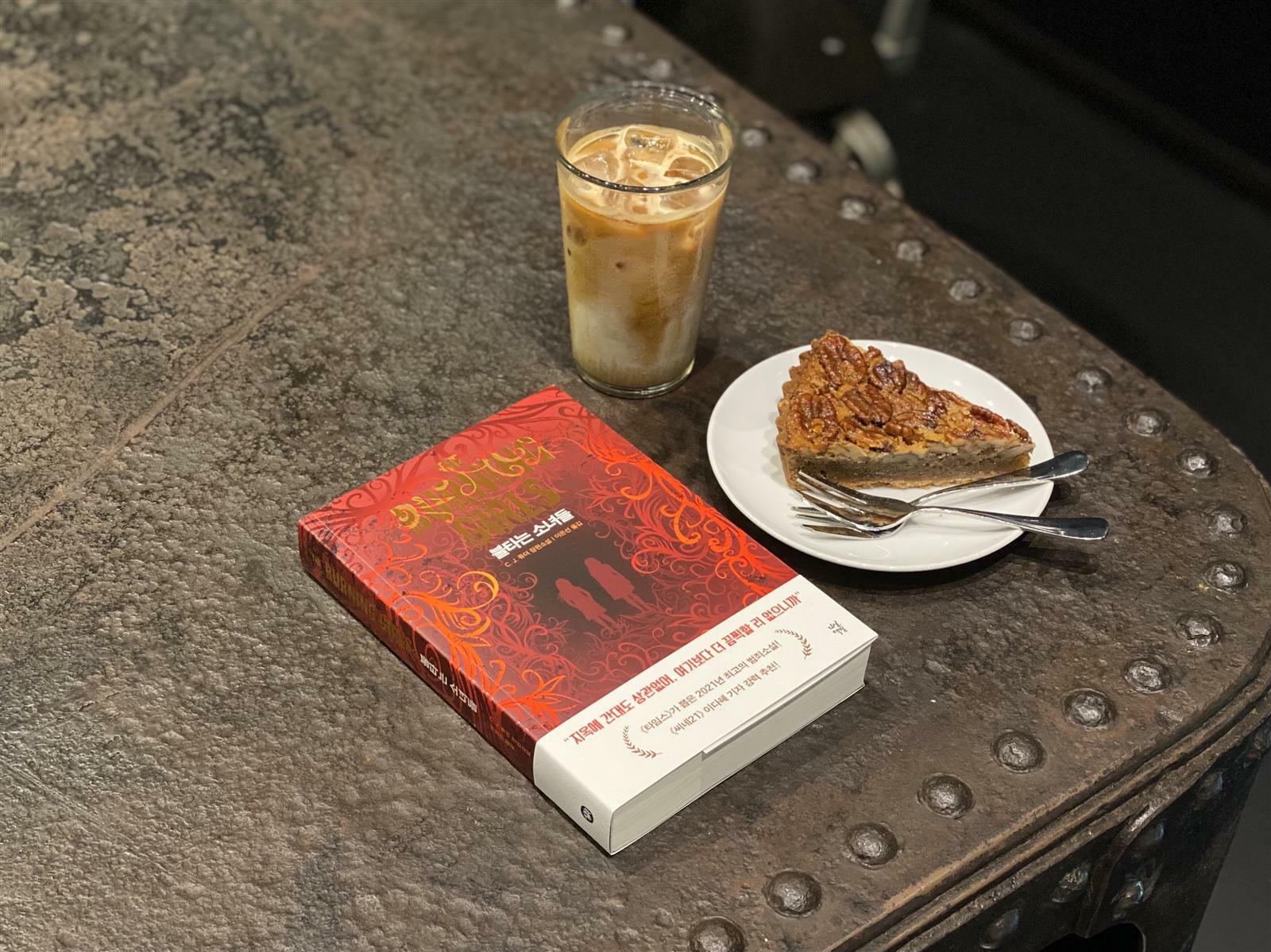
이걸 빤히 쳐다보는데, 갑자기 슬퍼진다. 그냥 평범한 목록이다. 하지만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교구 신도가 그녀를 무너뜨린 건 장례식이나 경야나 남편이 죽었다는 전갈이 아니라 그가 아마존에 사전 주문한 책들이 배송됐을 때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미래를 위해 소소한 투자를 한다. 콘서트 티켓, 저녁 예약, 휴가지 예약. 그날이 됐을 때 우리는 여기 없을지 모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임의의 사건이나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p.163
이상하게 나쁜 일이 계속 벌어지는 장소가 있다. 사고 다발 지점 같은 곳, 그냥 찝찝한 곳, 바로 여기 이 마을처럼 말이다. 500년 전, 채플 크로프트라는 서식스의 작은 마을에서 신교도 박해로 여덟 명의 주민이 화형당했다. 여덟 명의 순교자 가운데 두 명은 어린 여자아이였다. 해마다 사람들은 처형 추모일 행사 때 나뭇가지로 인형을 만들어 태웠고, 그것을 버닝 걸스라 불렀다. 그 인형이 복수심에 불타는 두 아이의 혼령을 쫓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30년 전, 열다섯 소녀 두 명이 실종되었다. 경찰은 단짝 친구였던 이들이 동반 가출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실종에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두 달 전, 순교자들의 화형과 버닝 걸스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마을의 역사를 파헤치던 교회 신부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는 조사를 하던 중 실종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진상이 뭐였는지 아주 심란해 하다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자살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라고 말한다.
자살한 신부의 후임으로 잭 브룩스가 열다섯 살짜리 딸과 함께 마을로 오게 된다. 마을로 이사한 첫날, 잭은 교회를 둘러보다 뭔가가 타는 냄새와 함께 어두침침한 햇빛을 받고 앉아 있는 시커먼 그림자를 보게 된다. 그리고 딸 플로는 암실로 개조할 별채에 갔다가 몇 미터 앞에 서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한다. 알몸으로 불길에 휩싸여 있는 아이에게는 양쪽 팔과 머리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화형당한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출몰한다고, 화형당한 아이들이 보이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실제 그들 모녀 주변에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익명의 누군가 정체불명의 상자를 보내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어두운 밤 교회에서 불빛의 움직임이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곳 마을에는 뭔가 숨겨야 할 비밀이 있었고, 낯선 외부인이 진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잭의 피하고 싶은 과거도 자꾸만 그녀의 발목을 잡는다. 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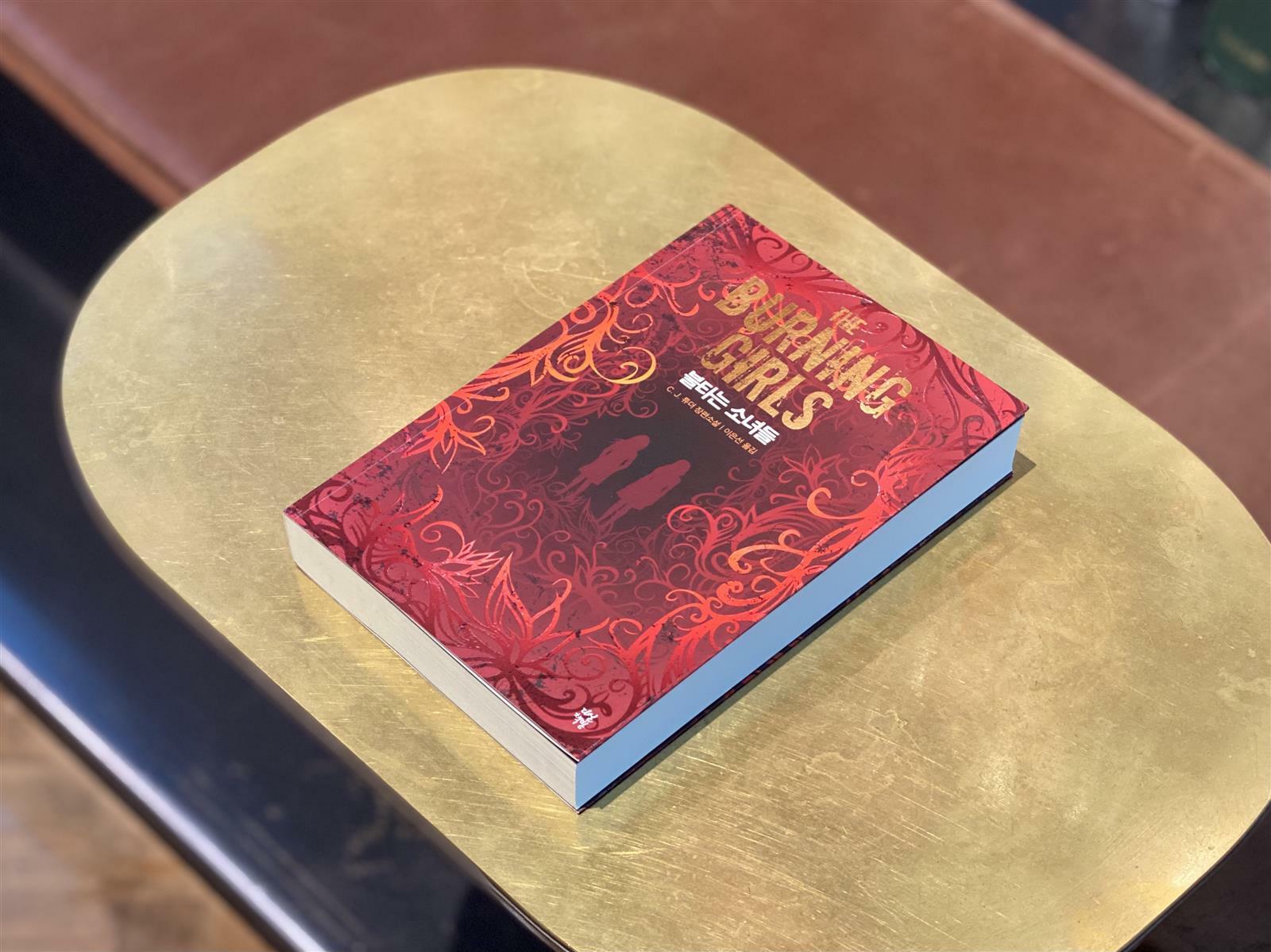
“나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과 나쁜 사람인 건 별개라고 생각해. 인간은 누구나 나쁜 짓, 사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가 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면, 용서와 회개를 간구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인간은 누구나 달라질 기회를 부여받아야 해.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아빠를 죽인 사람도요?" p.362
C. J. 튜더의 <초크맨>은 데뷔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탄탄한 구성, 예리한 문장과 독창적인 플롯이 너무도 훌륭한 작품이었다. 두 번째 작품인 <애니가 돌아왔다> 역시 굉장히 치밀하고 긴장감 넘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후속작 징크스 따윈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 번째 작품 <디 아더 피플>도 강렬한 도입부와 탄탄한 구성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게 만드는 페이지 터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바로 올해 출간된 <불타는 소녀들>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와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미스터리로 무장하고 나타났다. C. J. 튜더가 영국의 여자 스티븐 킹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고스란히 작품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를 서늘하게 만들어 주는 재미를 선사한다.
현실적인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도,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그려지는 이야기도 C. J. 튜더가 만들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다. 재미와 공포 면에서 감히 스티븐 킹의 작품과 비교해도 좋을 만큼 머리칼이 쭈뼛서게 만드는 이야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서 매번 신작이 나올 때마다 기대하게 되는 것 같다. 인간의 집착, 욕망, 폭력이 교차하고, 우정과 상실 등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시종일관 오싹하고 으스스한 몰입감을 보여주는 작품이 흔한 것은 아니니깐. 무더운 여름 날씨를 잊어 버릴 만한 이야기를 찾고 있다면 이 작품을 만나 보자. 무덤처럼 깊고 어두운 과거를 품고 있는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숨죽이고 지켜보는 동안 더위가 싹 사라질테니 말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