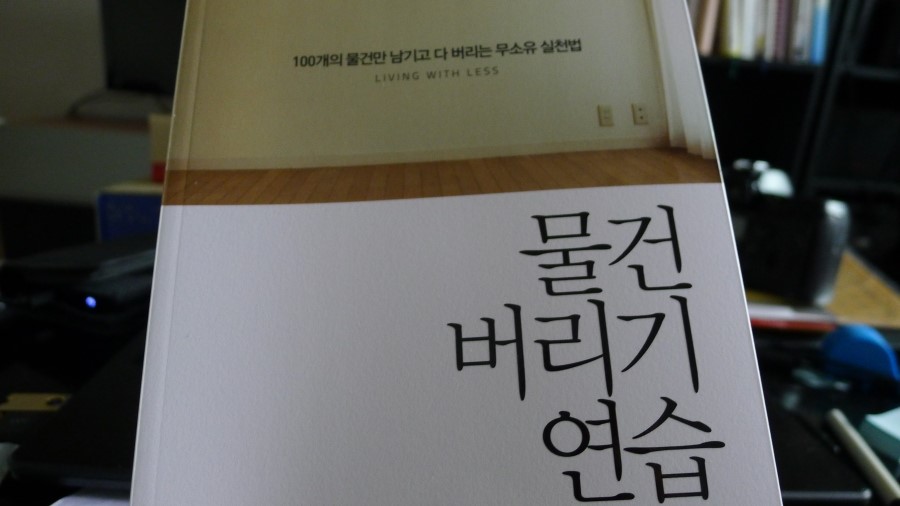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영국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이자 풍수지리 전문가인 메리 램버트이다.
서양에 무슨 풍수지리전문가? 하고 내심 관심있게 보게된 책이다.
저자는 모든 물건에는 고유의 기(氣)가 존재한다고 이야기 하며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물건에는
좋지 않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어지르는 것은 쉽지만 정리정돈은 어렵다.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안 버릴 것인가?정리를 잘하려면 버리는 것을 잘 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추억이 담긴 물건, 나중에 쓸 일이 생길 것 같은 물건, 잘 쓰지 않긴 하지만 버리면 아쉬운 물건 등등.
당장 나를 보아도 몇 번 버릴까 망설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로 옷, 책, 안 쓰는 물건들이다. 정말 큰마음 먹고 그 물건들을 처분했을 때는 정말 속이 후련하고 상쾌한 기분까지 느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천은 어렵고 힘든 것일까?
잡동사니는 우리의 감정과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일을 미루는 습성, 이것도 잡동사니 증후군이다.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무조건 치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책은 100개의 물건만 남기고 다 버리는 무소유 실천법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다.
잡동사니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나아가 삶을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쓸모 없는 물건을 '버려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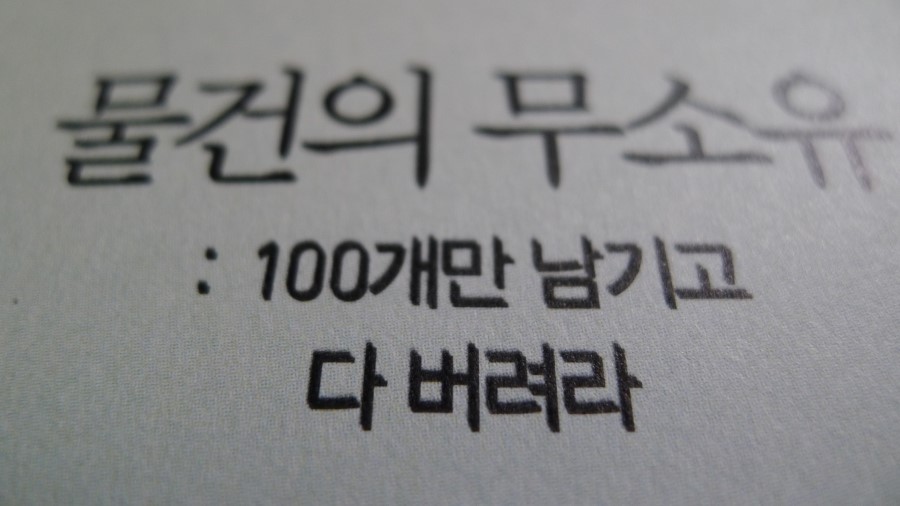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더 많이를 외치며 다시 가게로 발길을 돌리고 소비주의는
어서 가게로 달려가 최고 중의 최고를 사라고 우리를 부추긴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격이다. 실망은 예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리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바로 비우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일단 가지고 나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심리도 이를 부추기게되며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
없는 물건들을 미친 듯이 모으고, 누가 실수로 버리거나 손대기라도 하면 격렬하게 화를 내고,
그러면서 또 모은 물건들을 뭔가에 써먹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저 쌓아두기만 하는 증세를 이른바 '저장 강박(hoarding)'이라 한다.
이런 충동이 점점 커져서 집안을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들에게도 불편을 줄 정도가 된다면
명백한 정신장애라 할 수 있다. 저장 강박의 경계는 명확한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많은 잡동사니는 저장강박증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이는 고통과 장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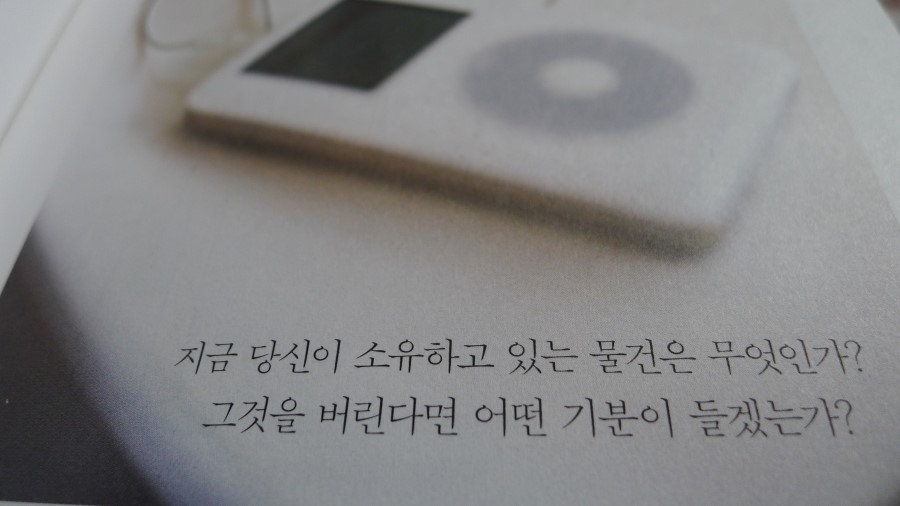
내 소유의 물건에게 나의 결정권을 발휘하지 못하면 물건에 휘둘리게 된다고 몇달전 그때도 스스로 느낀 적이 있다 .
책에서는 마음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외부에서 찾는 보상심리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었던 듯 했지만, 책을 보는 내내 몇달 전의 나의 대청소 경험 속에서 책을 읽어서인지 물건에 대한 통제력, 주
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되뇌었다.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통제력도 재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버리기를 마음먹은 사람들이나 결심을 했는데도 버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꼭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