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살로메 작가는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첫번째 책인 <라요하네의 우산>은 소설이었고, 신간인 두번째 책 <미스 마플이 울던 새벽>은 에세이입니다. 일천 글자 미니 에세이,라는 부제가 잘 어울리는 짧고 간결한 글이 실려있습니다.
오늘은 <미스 마플이 울던 새벽>에서 "문체미학의 경제성" 이라는 글을 손글씨로 써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문체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에 좋아했던 것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간결한 글은 읽기 편하지만, 쓰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간결하고 읽기 좋은 글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정의 과정이 반복되었을지, 읽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바느질의 흔적이 남지 않은 매끈한 글을 읽으면서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한편의 글이 남기까지 불 위에서 오랜 시간 졸여지는 과정을 떠올립니다. 뺄 수 없을 것 같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줄이는 과정을.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드는 표현도 과감히 지우는 과정을. 그렇게 남은 것들이 작아질 때까지 계속되는 시간을. 조금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글씨를 그렇게 잘 쓰지는 못했지만, 다시 써도 비슷해서 그냥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래 원문의 내용을 타이핑해서 올리니까, 그 부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오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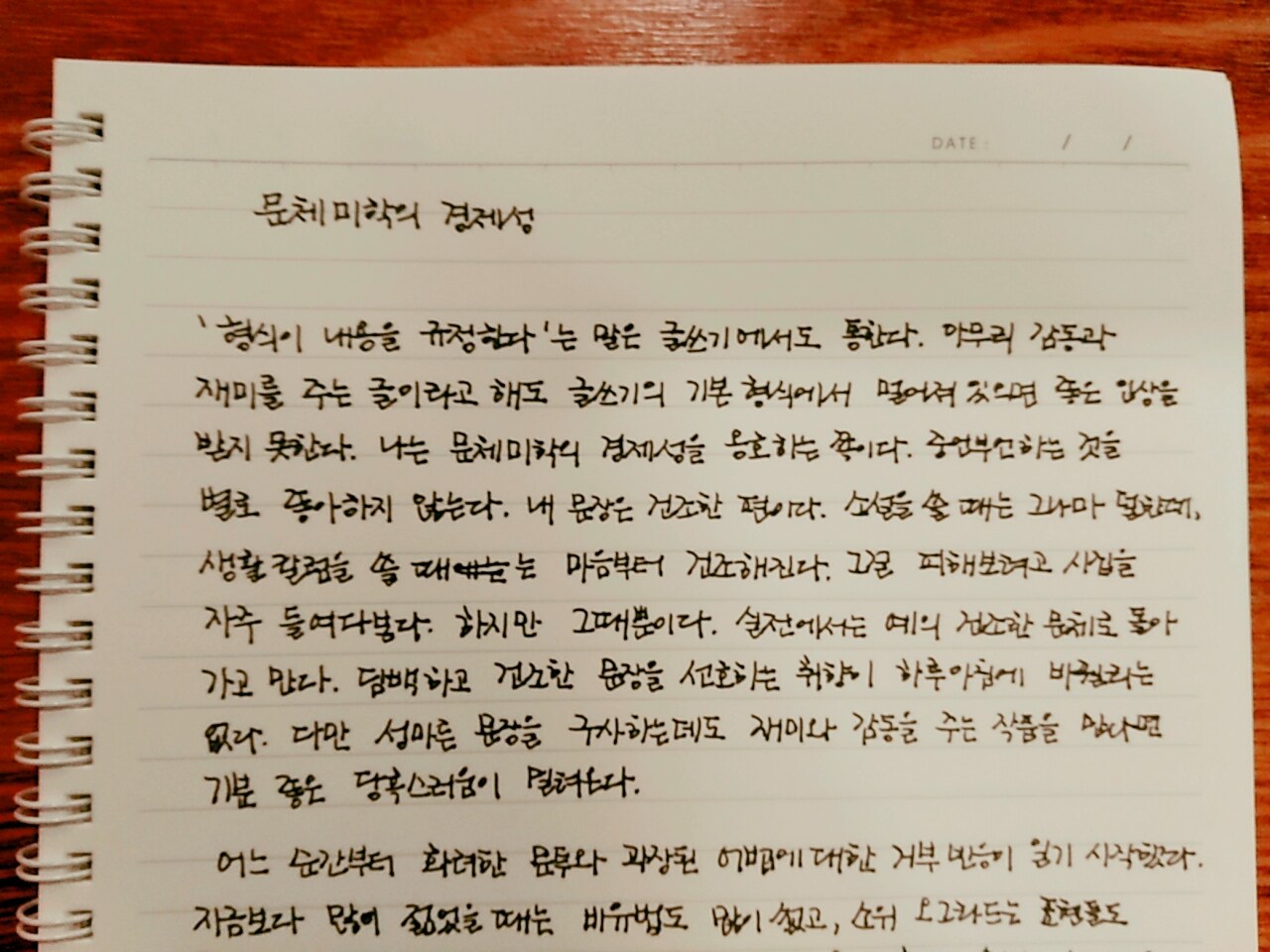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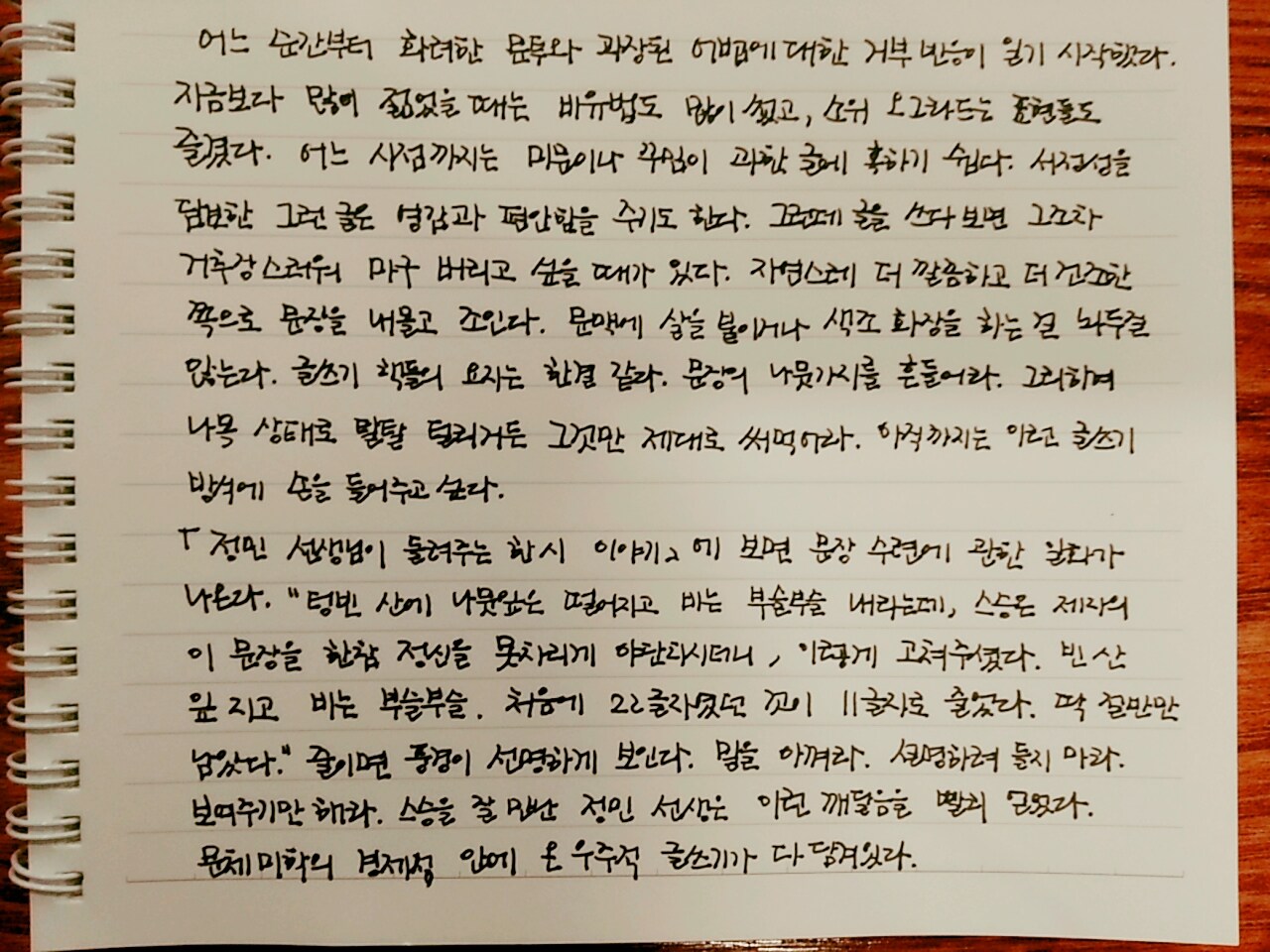


문체미학의 경제성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말은 글쓰기에서도 통한다. 아무리 감동과 재미를 주는 글이라 해도 글쓰기의 기본 형식에서 멀어져 있으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다. 나는 문체미학의 경제성을 옹호하는 쪽이다. 중언부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 문장은 건조한 편이다. 소설을 쓸 때는 그나마 덜한데, 생활 칼럼을 쓸 때는 마음부터 건조해진다. 그걸 피해보려고 시집을 자주 들여다본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실전에서는 예의 건조한 문체로 돌아가고 만다. 담백하고 건조한 문장을 선호하는 취향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다. 다만 성마른 문장을 구사하는데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나 면 기분 좋은 당혹스러움이 밀려온다.
어느 순간부터 화려한 문투와 과장된 어법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기 시작했다.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는 비유법도 많이 썼고, 소위 오그라드는 표현들도 즐겼다. 어느 시점까지는 미문이나 꾸밈이 과한 글에 혹하기 쉽다. 서정성을 담보한 그런 글은 영감과 편안함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그조차 거추장스러워 마구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자연스레 더 깔끔하고 더 건조한 쪽으로 문장을 내몰고 조인다. 문맥에 살을 붙이거나 색조 화장을 하는 걸 놔두질 않는다. 글쓰기 책들의 요지는 한결 같다. 문장의 나뭇가지를 흔들어라. 그리하여 나목 상태로 탈탈 털리거든 그것만 제대로 써먹어라. 아직까지는 이런 글쓰기 방식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에 보면 문장 수련에 관한 일화가 나온다. "텅 빈 산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스승은 제자의 이 문장을 한참 정신을 못차리게 야단치시더니, 이렇게 고쳐주셨다. 빈 산 앞 지고 비는 부슬부슬. 처음에 22글자였던 것이 11글자로 줄었다. 딱 절반만 남았다." 줄이면 풍경이 선명하게 보인다. 말을 아껴라. 설명하려 들지 마라. 보여주기만 해라. 스승을 잘 만난 정민 선생은 이런 깨달음을 빨리 얻었다. 문체미학의 경제성 안에 온 우주적 글쓰기가 다 담겨 있다.
- <미스 마플이 울던 새벽>, 김살로메, 2018, (주)아시아, p. 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