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른의 반격 - 2017년 제5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수상작
손원평 지음 / 은행나무 / 2017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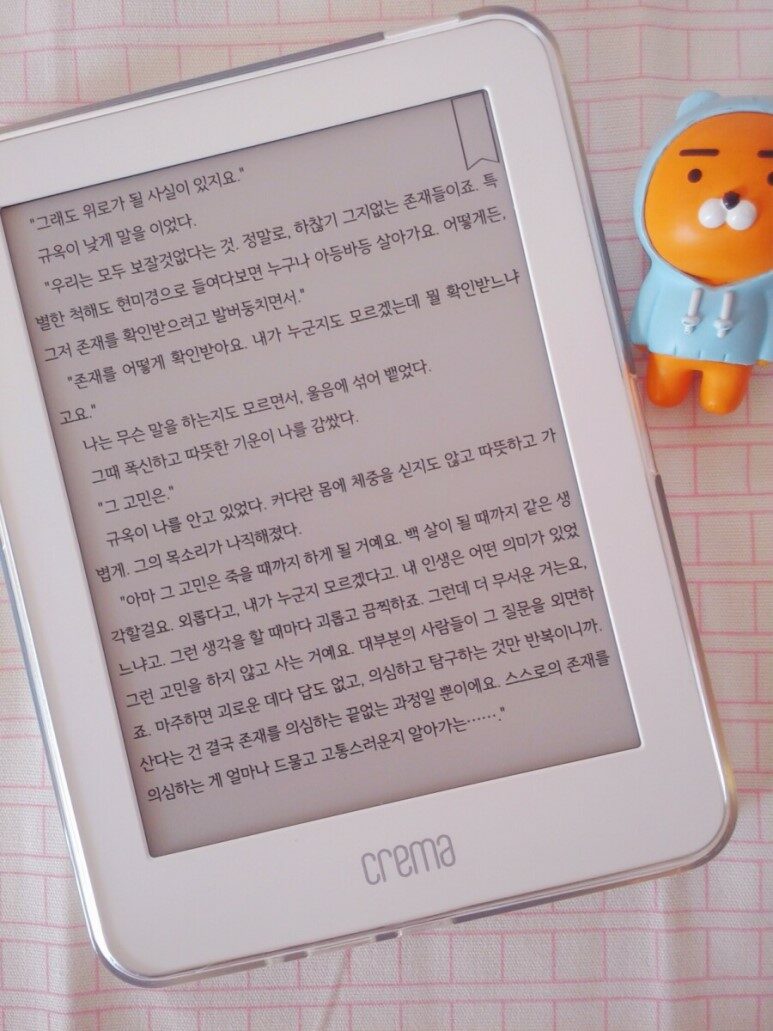
이름, 김지혜. 태어난 해, 1988년. 그 해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은, 서울 올림픽. 손원평의 소설 <서른의 반격>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간단 프로필이다. 한 반에 두 명 심지어는 다섯 명까지 있을 정도로 흔한 이름을 가진 주인공 지혜 씨는 올해(소설이 출간된 시점으로) 서른이다. 이북에서 훈장을 하던 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지어 놓은 이름은 추봉(秋峰)이다. 가을의 정점, 화려함의 극치 따위라는 뜻인데 어머니는 끝까지 그 이름을 반대하셨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데다가 배말숙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산 터라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자 한 소망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위로랍시고 성이 고씨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했다. 고씨였으면 고추봉.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의 백 미터 경기가 시작될 때 진통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이틀 동안 진통을 겪었다.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각서를 쓰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딸아이의 이름으로 추봉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각서를 썼고 어머니는 밤을 새워 옥편을 뒤져'88올림픽을 즈음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 중 가장 흔한 이름인 김지혜'로 '나'의 이름을 지었다. 그 후에 지혜 씨는 이름보다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로 더 많이 불리게 되었다.
국내 굴지의 그룹 DM에서 문화 사업의 하나로 만든 곳이 다이망 아카데미이다. 지혜 씨는 DM 그룹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 채용에선 떨어졌지만 다이망 아카데미에서 일하다 보면 경력을 인정받아 본사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는 꿍꿍이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문화센터와는 달리 수준 높은 강좌를 들으러 사람들은 아카데미로 온다. 인문학과 철학, 초급 라틴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그곳에서 지혜 씨는 종일 구식 복사기와 싸운다.
복사기와 싸우는 것도 모자라 강사가 두고 간 휴대폰까지도 가져다주는 심부름도 한다. (나중에 지혜 씨는 철천지원수 고등학교 동창의 커피 셔틀도 한다. 종이컵은 안되고 동창이 먹는 텀블러에 담아서 특정 브랜드의 커피를 갖다 바쳐야 한다.) 강사는 예전엔 교수였지만 성 추문으로 잘리고 지금은 성과 철학으로 포장된 인문학 강의를 하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핸드폰을 주려던 찰나 그에게 향하는 날선 비판의 말을 듣는다. 거인 같은 남자가 외친 그 말은 강사가 남자가 쓴 책으로 출판을 하고 알바비까지 떼어먹었다는 것이다.
핸드폰을 주고 돌아온 지하철에서 다시 만난 그 남자는 십자말풀이를 하고 구인란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혜 씨는 몰랐다. 그후에 그 남자와 다시 만날 줄을. 지혜 씨는 인턴으로 근무한지 9개월이 되었고 정직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인턴을 한 명 더 뽑는 걸로 결론이 났다. 인턴으로 들어온 사람은 강사에게 소리를 친 그 남자였다. 이규옥.
인턴에게 주는 혜택이란 아카데미에서 하는 강좌 하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료라고 하지만 월급에서 그만큼의 돈을 제하는 이상한 시스템이다. 지혜 씨는 규옥 씨의 제안으로 우쿨렐레 강좌를 수강한다. 서른 살, 인턴, 반지하 방. 지혜 씨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며 서서히 반격을 시도한다. 인상 좋고 착하고 성실한 규옥 씨와 함께. 우쿨렐레 강좌를 들으면서 알게 된 무인과 남은 아저씨와도 함께.
노력하면 된다. 쥐구멍에도 해 뜰 날 있다, 이런 식의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자. 지혜 씨는 이름만큼이나 평범하고 소소한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평범한 꿈을 이루기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둡고 막막함으로 버티고 서 있을 뿐이다. 지하와 지상에 걸친 어중간한 방이 아닌 햇빛이 드는 방. 오드리 헵번이 창가에 앉아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듯 지혜 씨도 창가에 앉아 우쿨렐레를 켜고 싶다. 핀잔과 일을 몰아주는 까탈스러운 상사와 점심을 먹으며 수저를 챙기는 게 아니라 목에 사원증을 걸고 카페에 앉아 마음 맞는 동료들과 휴일 계획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혜 씨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지. 있지도 않은 친구를 만들어 아파트 단지 공터에 앉아 편의점 음식을 먹는 지혜 씨가 바라는 건 평범함이다. 과일 농사를 하는 부모님은 지혜 씨가 반 지하방에 사는 걸 모른다. 자신을 보통 사람이라고 칭하며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 부르짖었던 보통 사람은 2018년에 가장되기 힘든 사람이 되었다. 민주주의도 꽃이 피었는데 직접 선거를 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청춘들의 살아가기는 한 발 나아가는데 더디고 출구조차 찾기 힘들다.
지혜 씨는 말한다. 치열하게 살라는 말이 제일 지겹다고. 서른이 되도록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만 좀 치열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로 청춘들을 환자로 내 모는 시대. 아프면 환자지 왜 청춘이냐는 말을 듣고 웃는 우리. 지혜 씨와 규옥, 무인과 남은이 세상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며 보통 사람이 되어 살고 싶다는 외침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 바위를 칠 수 없으면 바위를 더럽히는 계란이라도 되자는 소설에서 보통 사람 지혜 씨의 내일을 응원한다. 바보 같기만 했던 나의 오늘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한 반격의 날이었다고 위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