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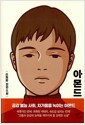
-
아몬드 (양장) -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년 3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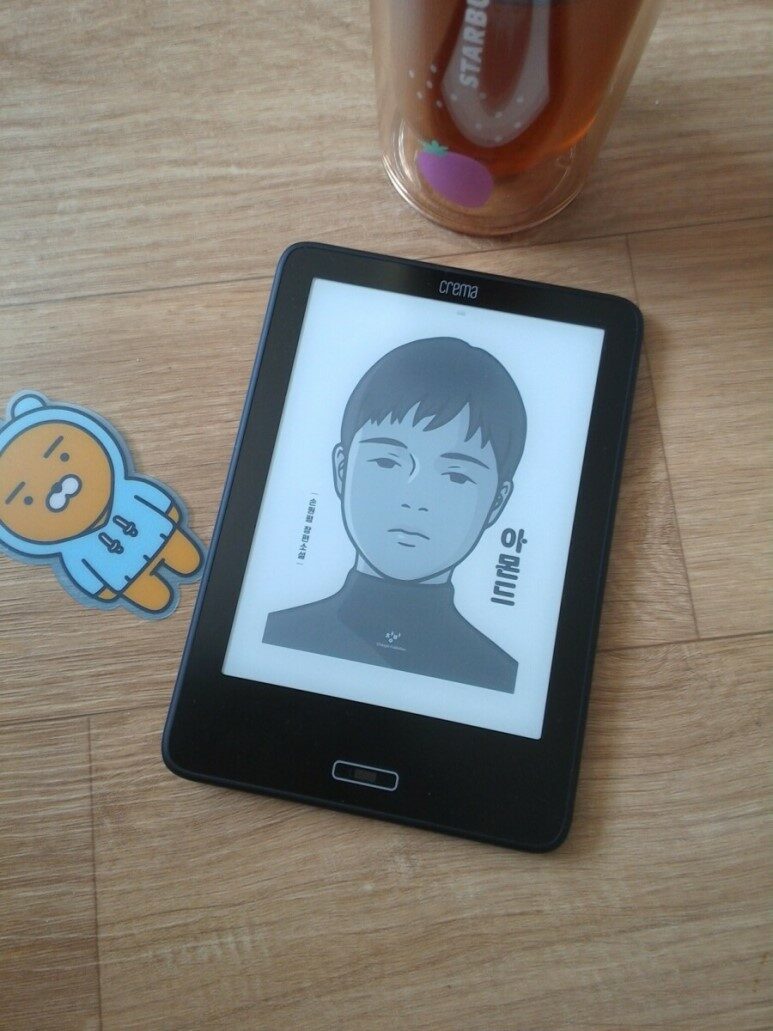
한때는 친구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이름을 물었다. 집이 비슷한 방향이면 학교가 끝나고 손잡고 인도를 점령하며 걸어갔다. 무슨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엄청 웃고 크게 말했던 건 사실이다. 조잘조잘, 재잘재잘. 했던 말들을 반복하고 확인하고 웃었다. 시끄럽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텅 빈 집으로 들어와 한동안 그것들을 간직하기 위해 애썼다.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바꿔 입는 사이에 달아나긴 했지만.
빈 방에 혼자 앉아 천천히 숙제를 하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누워 있기도 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어나갔다. 작은 스탠드 하나를 켜놓고 책장을 넘겼다. 누워서 책 한 권을 다 읽기도 했다. 일요일 아침이면 일찍 눈을 떠 그대로 누워 오전 시간을 보냈다. 한 권을 다 읽었다는 뿌듯함과 남은 시간을 또 뭘로 보내지 섭섭함이 남았다.
책을 읽을수록 애들이랑 시시덕거리는 게 시시해졌다. 쉬는 시간이면 읽던 책을 다시 꺼내 자리에 앉아 읽었다. 집에도 혼자 가는 날들이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애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과 다르다는 게 확인되면 멀어진다. 책 안에는 이상한 세상이 펼쳐 있기도 하고 이상한 세상을 내가 닫을 수도 펼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웠다.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덮을 수도 있는 나만의 세상.
책은 달랐다. 책에는 빈 공간이 많이 때문이다. 단어 사이도 비어 있고 줄과 줄 사이도 비어 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앉거나 걷거나 내 생각을 적을 수도 있다. 의미를 몰라도 상관없다. 아무 페이지나 펼치면 일단 반쯤 성공이다.
소설 『아몬드』의 주인공 선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을 가진,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감정의 이름들을 헷갈'려 하는 소년이다.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 아몬드같이 생긴 그곳에 문제가 있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두려움이나 공포가 그에 해당한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나누는 감정의 공유를 할 수 없다. 엄마와 할멈의 도움으로 학습된 감정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고 일상을 유지해 나간다.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 학습된 감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윤재가 선택한 세상과의 충돌은 책 읽기이다. 어렸을 적 꿈이 작가이기도 한 엄마가 꾸려가는 헌책방 안에서 윤재는 책을 읽어 나간다.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겪지 못하는 감정들이 담긴 책을 읽으면서 자신에게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야기의 결말이 희극이든 비극이든 작가가 결말을 내렸든 내리지 않았든 독자로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있다. 이야기가 끝나면 인물들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그것으로 끝일까,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이어지고 있을까. 『아몬드』의 세계는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 다만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윤재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괴물이 아니라 끝없이 세상과 만나고 경험하고 싶어 한 평범한 아이라는 것이다.
단단한 아몬드 안에 갇힌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고 싶어 했던 아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가진 친구를 발견해 내는 아이. 그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에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세계를 파괴하는 아이. 윤재는 세상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고도 느끼지 않은 척 행동하는 모순된 세계 안에서 걸어 나왔다.
책을 덮는다. 이 세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내가 선택하고 뛰어든 세계, 그 안에서 나는 괴물과 만나 괴물이 된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잘못하면 사람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