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 한 사람
최진영 지음 / 한겨레출판 / 2023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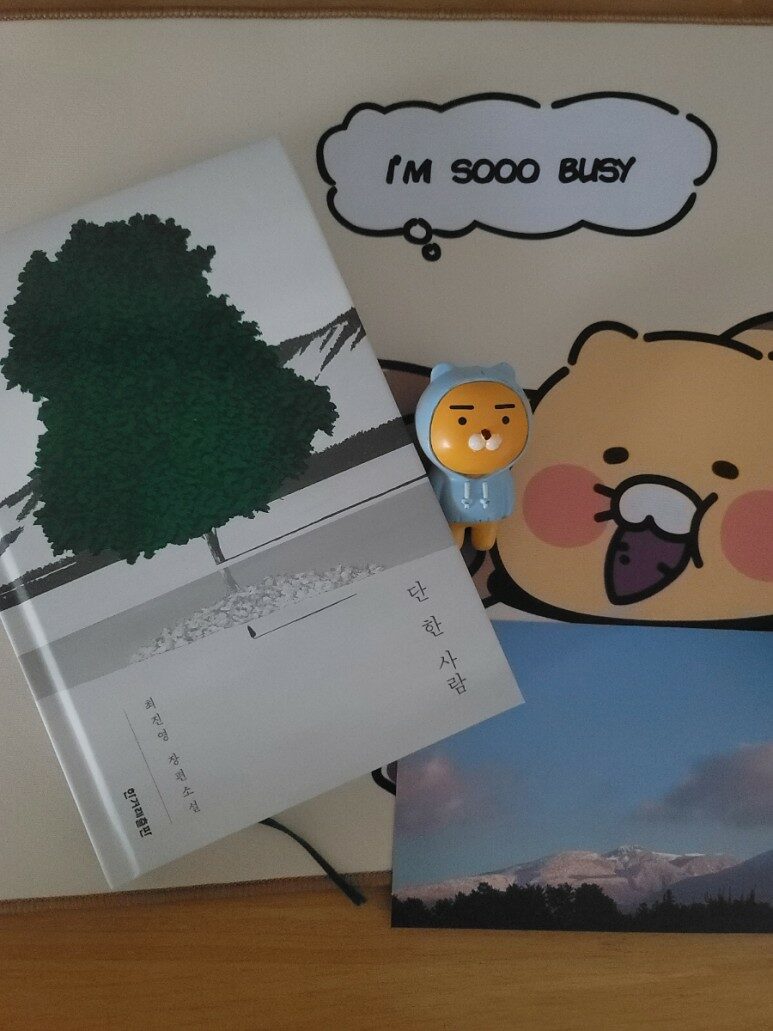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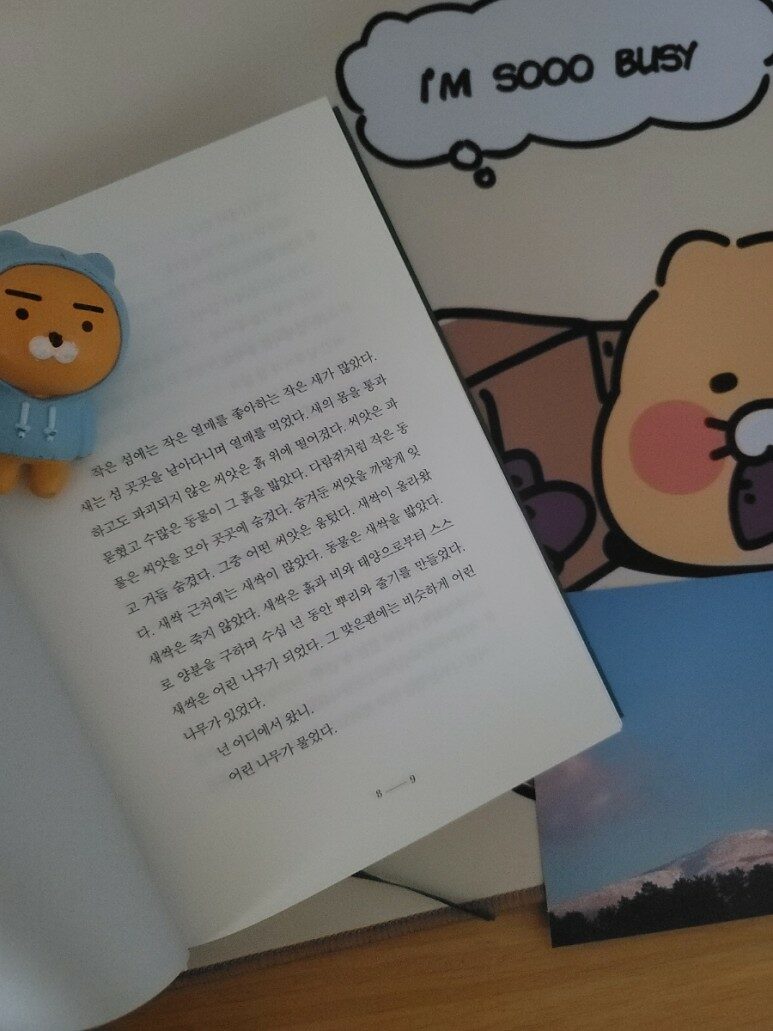

꼭 내일이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 내일도 모레도 그다음 날도 내게 찾아오리라는 터무니없는 믿음이 있던 시간이었다. 그야말로 아등바등의 형태로. 하나의 죽음을 목도하고 더 이상 삶은 유한하지 않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야 깨닫는다. 내일은 없다. 오늘만이 유효할 뿐. 오늘을 살아내자. 단순한 문장만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 역시.
지나친 걱정의 끝에는 피로와 불안이 있을 따름이다. 최진영의 장편소설 『단 한 사람』은 오늘을 살아내는 일의 의미를 곱씹게 만드는 소설이다. 삶과 죽음은 따로 있지도 멀리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내가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자가 그토록 원하던 시간임을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모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은 살아 있음에 안도를 느껴야 한다.
소설은 작은 섬에 두 그루의 나무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 태초에 나무가 있었고 시간을 견뎠고 뿌리를 나눠 가졌고 사람들이 찾아왔다. 나무가 자라면 베어졌다. 남아 있는 나무는 인간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다음 장은 장미수와 신복일의 다섯 남매의 서사로 넘어간다. 일화, 월화, 금화, 목화와 목수. 나무의 시간처럼 다섯 남매는 서서히 자란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쌍둥이 목화와 목수를 데리고 금화는 산으로 간다. 일요일이었고 언니 월화가 다른 데로 가서 놀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언니 월화는 진짜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동생들은 일요일의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 산에 올랐다. 그들은 깊은 곳으로 갔고 커다란 나무가 휘청거리면서 금화의 몸 위로 쓰러졌다. 목화는 어른들을 부르기 위해 산으로 내려갔다.
울면서 어른들을 데려왔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깔린 사람은 금화였지만 금화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목수가 있었다. 목수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렇게 금화는 사라졌다. 목화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건 열여섯 살의 봄이었다.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꿈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목화는 사람들이 죽지 말라고 기도했지만 누군가 말을 걸었다. 떨어지는 사람을 받으라는 음성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목화는 사람을 구했다.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구했다. 죽어가는 이들 중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을 구해야 했다. 왜 단 한 사람인가. 목화에게 사람을 구하라고 말하는 이의 정체는 무엇인가. 목화는 끔찍한 자신의 운명을 처음에는 비관했다가 나중에는 그 일을 중개라 부르며 단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의 의미를 찾아 나간다.
어떤 운명의 신이 혹은 운명의 장난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인가. 오늘 살아 있는 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가 『단 한 사람』은 의문한다. 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인가의 물음.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자연재해나 인간의 힘에 의해 베어지지 않는 이상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나무의 힘 때문이 아닐까. 나무의 명령을 받은 누군가들이 지켜낸 단 한 사람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 살아가야 한다. 소중한 단 한 사람의 운명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