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비심장
김숨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21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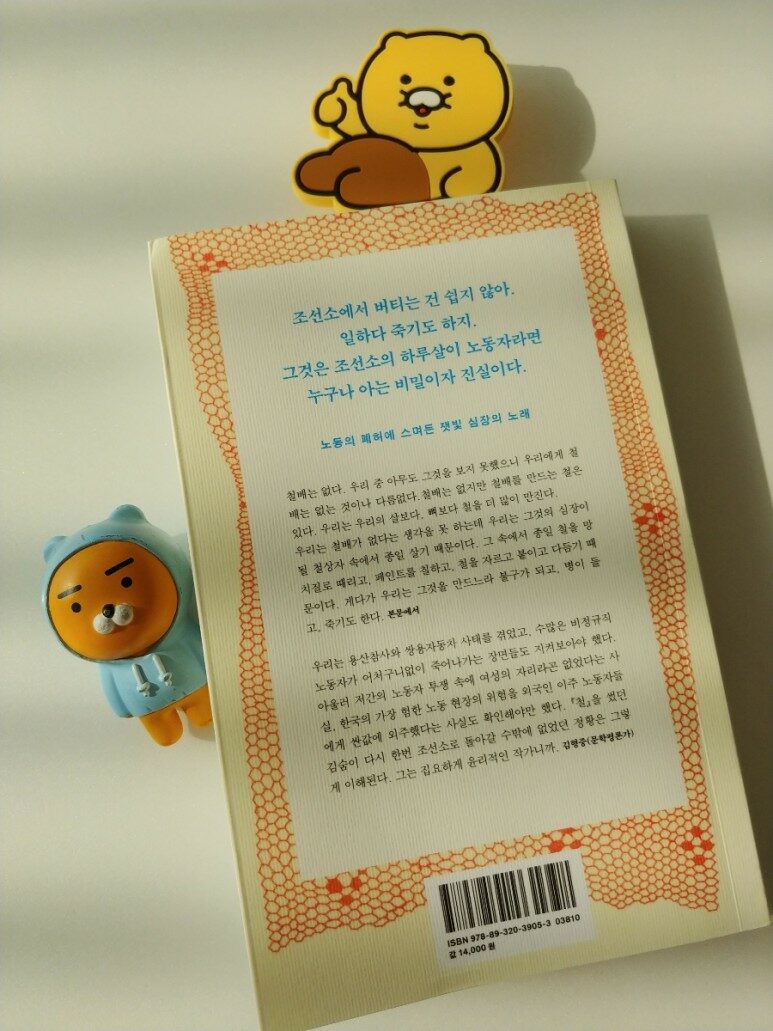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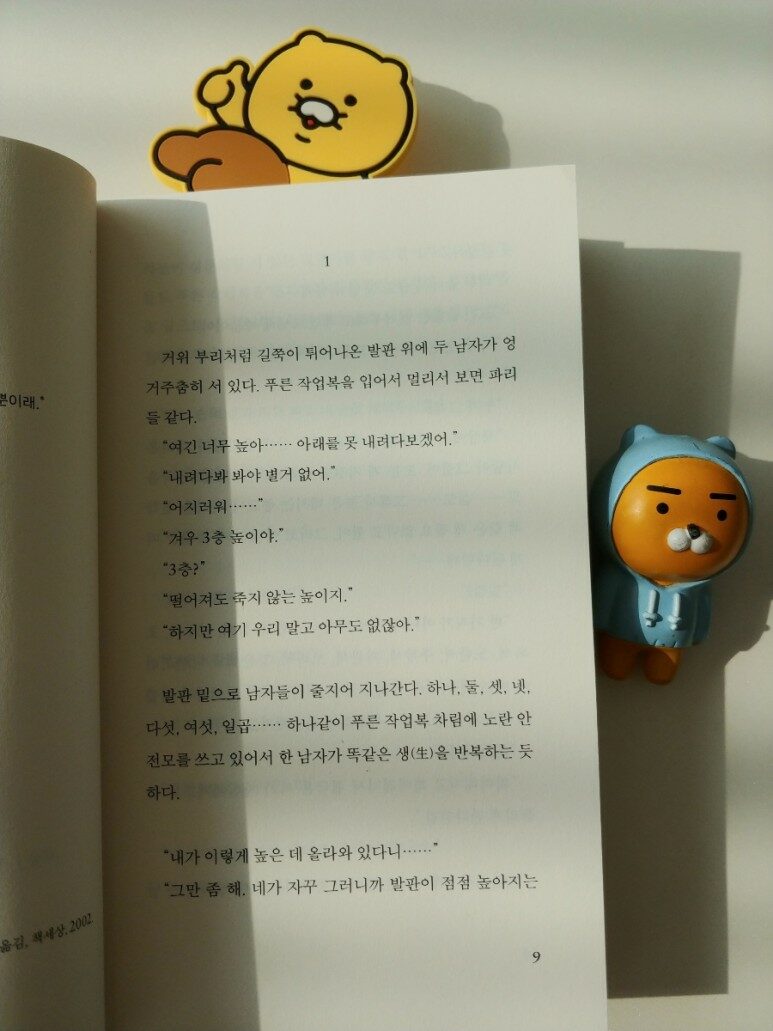

내가 읽는 김숨의 『제비심장』은 시일까 소설일까, 노래일까. 마구 헷갈리는 그런 밤이었다. 걸어서 집에 오고 씻고 정리하고 어제 한 드라마를 뒤늦게야 보고 방에 들어가 책을 펼쳤다. 마음 같아서는 책을 다 읽고 싶었다. 하루하루의 성취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시간 앞에서 완독이라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였다. 내가 하는 일은 어설프고 하찮아서. 그건 그것대로 저녁 여섯시에 놔두고 온다.
그러고서 하는 일. 책을 읽는데. 그것도 어렵다. 많이 있는데 내게 없는 것 중에 체력도 없다. 어쩌다 태어나서 좋고 감사하고 슬프다. 어쩌다 태어났는데 자존감, 체력, 강한 정신력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조선소 노동자 그것도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쓴 소설 『제비심장』은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혼재되어 있다. 장편소설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소설을 읽는 자세로 읽었다.
소설이라고 하니까. 그러다 어, 어. 서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선소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깔아 놓고 문장은 뒤섞인다. 인물의 대화는 일방적이다.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말만 한다. 그래도 소설은 흘러간다. 어느 시점부터(김숨이 사회 참여적인 소설을 쓸 때부터) 김숨의 소설은 소설이 아니게 된다. 소설로 읽으려고 했던 밤은 실패했다.
낮의 패배와 무력감이 밤으로까지 달려왔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 사상공, 포일공, 도장공, 발판공, 용접공, 불 감시자. 그들이 철상자 안에서 고군분투한다. 거대한 철상자 안에서 길을 잃는다. 안전은 무시되기 일쑤다. 쇳가루가 날리고 독한 페인트 냄새가 공기처럼 떠도는 곳. 하루살이 노동자들은 일당을 받기 위해 하루를 온전히 바친다. 어제와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다.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산다. 내일은 살 수 없다.
소설로 읽기를 포기하고 책을 덮었다. 조선소 노동자와 달리 나는 내일이 있고 싶었다.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는 미약한 내일을 위해. 내일은 오늘이 되었다. 오늘은 시로 읽었다. 『제비심장』은 시로 읽힌다. 시의 호흡으로 읽어간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었던가. 세상 물정을 책으로만 배우고 알았기에 나는 그걸 몰랐다. 겨우 김진숙을 알뿐이었다.
하루 일당이 얼만데.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고 남편과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인다. 다시 눕고 싶지만 그들은 생각하고 말한다. 하루 일당이 얼만데. 일 년에 한 번 지급되는 작업복과 작업화. 그마저도 하루살이 노동자에게는 남이 입던 걸 준다.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없다. 한 시간의 점심시간이 있지만 구내식당까지 왕복 30분이 걸린다. 40도가 넘어가는 철상자 안에서 철판을 자르고 조립한다. 높은 곳에서는 불꽃이 떨어진다. 잘못 맞으면 눈이 실명된다.
『제비심장』은 노래로 읽힌다. 그 다음날에는. 내일을 생각하기보다 눈을 뜰 수 있는 날이라고 친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눈을 뜨고 일을 하러 간다. 하루 일당이 얼만데 하는 생각은 들지 않고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게 아닌데. 꾸역꾸역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걸 직시하고 포기해도 나는 나인데. 『제비심장』을 노래로 읽는 밤에는 내가 내가 되고 싶었다. 먼지와 쇳가루와 불씨가 있는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 돌아와 일을 하는 노동자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일을 하고 돌아와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다. 시와 소설, 노래가 섞인 책을. 문장을 따라가다가 한숨을 쉰다. 숨을 쉬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못된 마음이 든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내 인생을 방기하는 태도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쩌면 선택이라는 건 강요가 아니었을까. 너는 이렇게 해야 하는 식으로 말이다.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고 나를 고통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 참담하다.
시가 있을까.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다.
시가 없는 내일 대신 시가 있는 오늘만.
한 편의 소설에는 시와 노래가 있었다. 소설로 시로 노래로 읽는 밤이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노래는 끝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