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들 ㅣ 오늘의 젊은 작가 32
이혁진 지음 / 민음사 / 2021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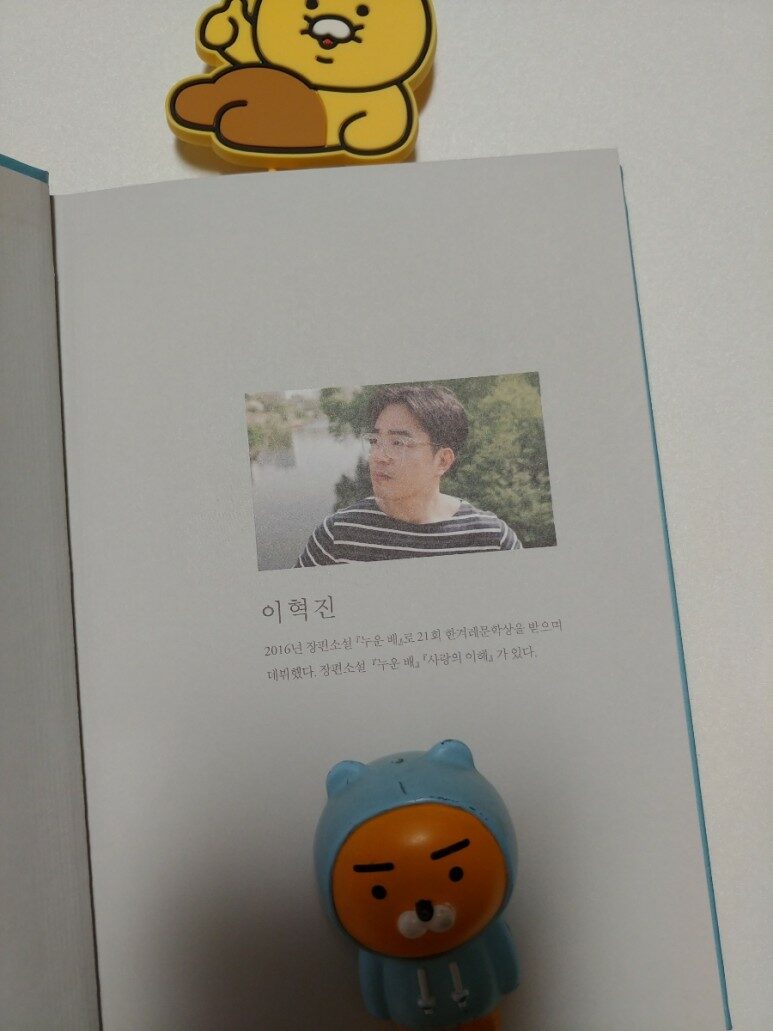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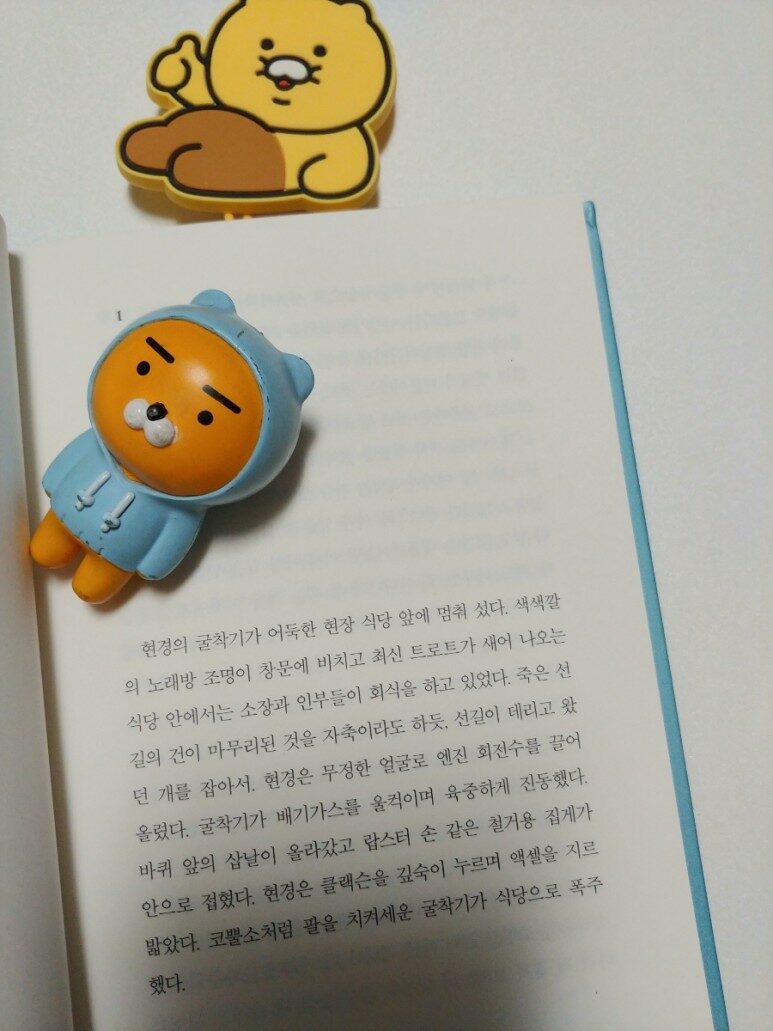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걱정과 두려움 없이 오늘을 즐기며 살고 싶다. 나만 이런가. 모두들 그렇지 않을까. 내일 따위는 없다는 듯, 거침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아마 이렇게 살다가는 인성 쓰레기라는 말을 듣지 싶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격과 성향의 문제가 있다. 타고난 게 이 모양인데. 누가 침묵하고 있으면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믿기지 않겠지만 내내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았다.
오늘도 당황해서 죄송합니다를 말했고 사실 그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는데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뭐가 죄송한데? 모르겠다, 나도. 실력을 키우고 돈을 벌어서 지금의 위치보다 높은 곳에 가겠다는 열망을 품지 않는 건 그 자리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책임감. 하여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나 하나 돌보지 못하는데 반 전체를 어떻게 통솔하고 책임 지나. 내내 뒷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숙제를 했다.
이혁진의 장편소설 『관리자들』은 책임감을 정의한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현경이 굴착기를 현장 식당 앞으로 몰고 온다. 식당 안에서는 소장과 인부들이 회식을 하고 있다. 거침없이 현경은 굴착기의 액셀을 밟는다. 장면이 바뀌고 식당에서 현경은 목 씨에게 선길이 멧돼지 보초병으로 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웬 멧돼지? 공사 밥이 부실하다는 인부들의 원성을 듣자 식당 주인은 난장판이 된 부식 비닐하우스를 보여준다. 멧돼지가 내려와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밥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국도 옆 관을 매립하는 공사를 하는 현장이 『관리자들』의 배경이다. 소장을 비롯한 인부들은 공기(공사기간)를 맞추기 위해 겨울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관리자로 대표되는 소장은 소설에서 비열하게 그려진다. 멧돼지는 없었다. 식당 주인과 짜고 공사비를 뒷돈으로 만들기 위해 부린 수작이었다. 일에 적응하지 못하는 선길은 소장에게 잘 보이고 싶은 반장의 술수로 심야에 공사 현장에서 보초를 서게 된다. 있지도 않은 멧돼지를 잡기 위해.
소설은 일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을 다양한 인물을 통해 보여준다. 일의 절차와 순서, 원칙은 상관이 없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을 빨리 끝내고 그 사이에 자리를 지키고 빼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없으면 만들어 내서라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다. 주먹구구식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놀란다지 않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에. 하루 종일 전화를 돌리다 보면 아는 게 있다. 궁금해서 물어보면 정작 당사자도 잘 알지 못해 전화기를 돌린다.
혹은 이것도 모르냐는 식의 말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침묵. 그래 나 몰라. 몰라서 전화하는데 왜 그걸 모르냐는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 건데. 『관리자들』을 읽어가다 보면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다. 소장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거지 같은데 그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다는 것에. 개소리를 길고도 성의 있게 한다. 읽다 보면 그렇지, 세상 일이라는 게 책임감을 갖는 게 아닌 책임감에서 멀어질수록 이득이 되는 거지. 수긍하게 되는 나를 발견한다.
소설은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뜨린다. 현경이 굴착기를 밀고 들어가는 소설의 시작은 끝부분으로 이어진다. 왜 회식하는 인부들이 있는 식당으로 굴착기를 몰고 갈 수밖에 없는지 『관리자들』은 점진적으로 이야기한다. 소위 관리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보고 들었다. 경험도 했으리라. 교묘하게 책임감을 지우는 자들, 관리자들. 사람들 모이는 곳에 권력이 생기고 정치질이 시작된다.
그게 싫어서 진저리 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까지 천천히 걸어와서 씻고 눕는다. 천변을 걷다 보면 금목서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앞에 가는 어떤 이가 향기를 맡기 위해 마스크를 잠깐 벗었다. 모습이 아름다워 울컥했다. 전염병이 돌고 있어도 사람들이 아파도 꽃은 피고 향기를 퍼뜨린다. 여름 지나 가을.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잠시 서서 숨을 들이켠다. 살아 있어서 맡을 수 있는 향기에 감사하며. 다시 마스크를 쓰고 밤길을 걸어가더라. 나 역시 그렇게 했다.
『관리자들』의 마지막은 얇실한 희망을 피어 올린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 함께 일하고 밥 먹는 이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착하고 순수하다는 말은 나쁜 뜻이란다. 좋은 말이 아니라고. 멍청하고 바보 같다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문학은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피하고 도망가고 자꾸 숨는 나를. 너만은 나를 이해해 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