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정세랑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1년 6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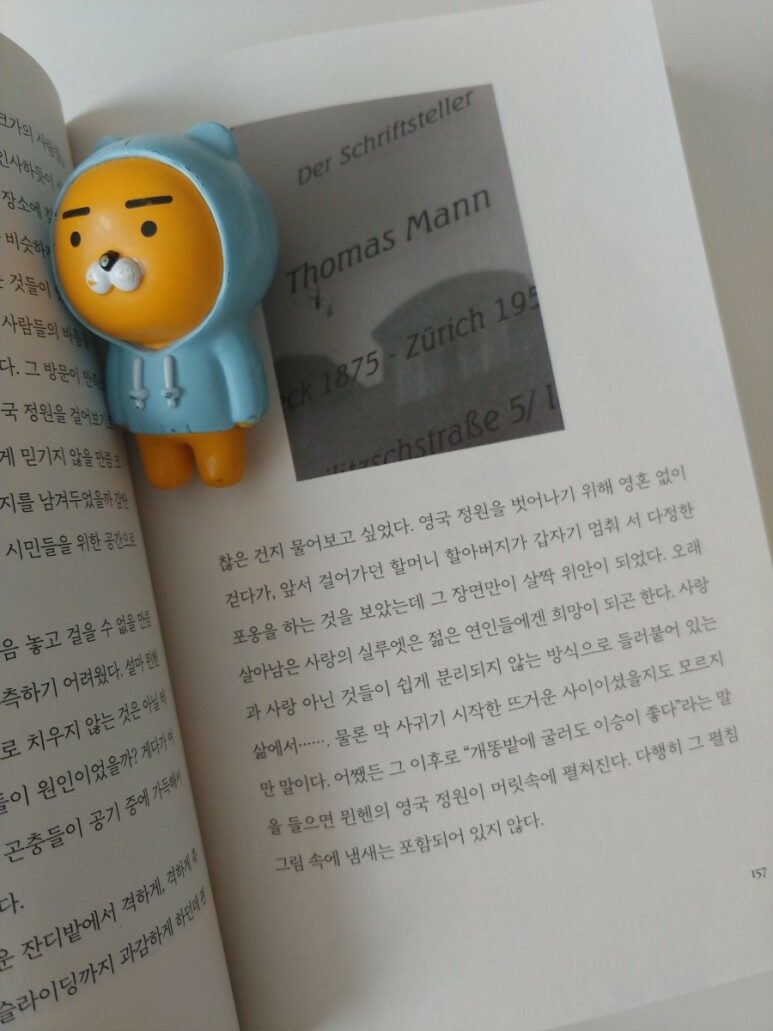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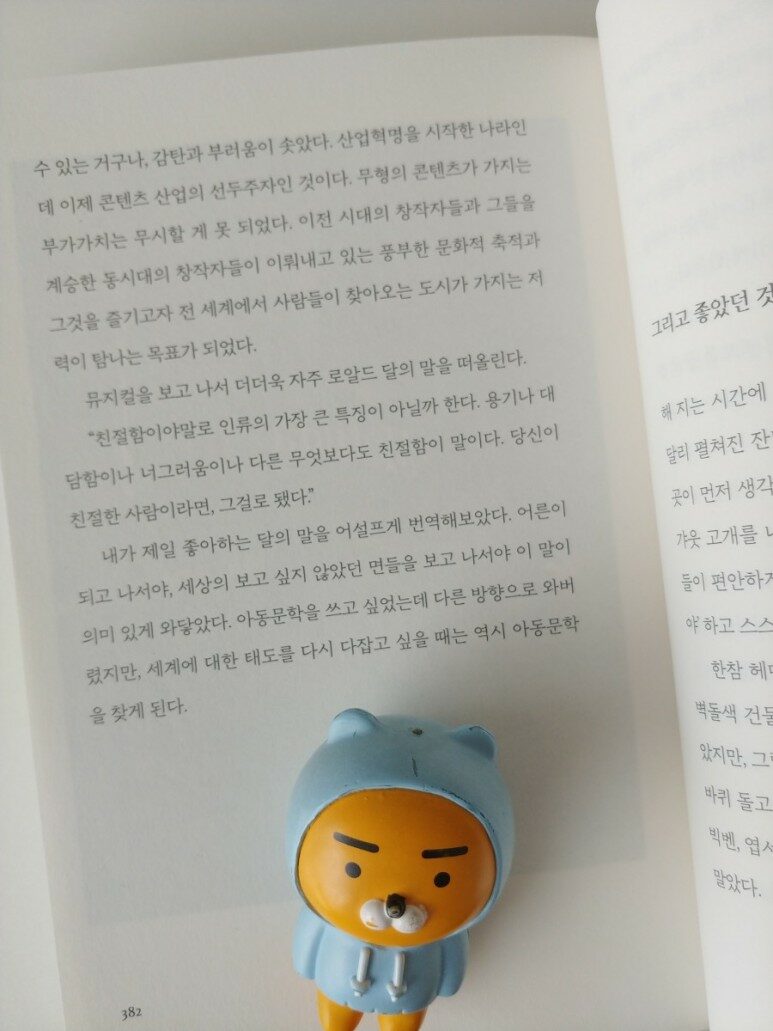
딱히 불편하진 않다. 달라진 건 없다. 좀이 쑤시지도 않는다. 울적하거나 우울해하지도 않는다. 여행 이야기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워진 산업은 여행 업계이다. 공항이 닫히고 비행기는 발이 묶여 있다. 수시로 여행을 떠나던 그 많던 여행가들은 무얼 하며 지낼까. 자신이 도착한 도시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추억하고 있으려나. 아니면 얼른 이 사태가 끝나고 가게 될 여행지의 루트를 짜고 있을까.
여행을 글로 배웠다. 도서관에 가면 여행 서적 코너에 서성였다. 론리 플래닛도 뒤적이고 그걸 사기도 했다. 언젠가는 가겠지. 미래의 나는 떠날 준비를 하며 설레고 있을 거야. 상상했지만 상상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귀찮고 귀찮았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들 부지런히 정보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가방에 들어갈 짐을 꾸릴까. 대단해. 존경해 마지않는다.
가끔 보는 카카오톡의 누군가들의 프로필에는 그래도 여행지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 열명 남짓의 카톡 친구들. 이로써 빈약한 인간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를 많이 가던데. 제주도 역시 글로 배웠다. 신청만 하면 무료로 나눠준다는 말에 제주도 지도를 받아 놓고 책상에 펼쳐 놓고 어디를 가볼까 고민만 했다. 그 지도 어디 있는지 난 몰라.
오랜만에 쉬게 된 토요일에도 일어나서 책을 읽었더랬다. 주중에는 몇 페이지 펼쳐보지 못해 아쉬운 책을. 아침 6시에 일어나 읽었다. 정세랑의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를. 여행을 선호하진 않지만 다정한 친구들의 권유에 이끌려 떠난 뉴욕, 아헨, 오사카. 타이베이, 런던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체력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탓에 여행을 즐기진 않았다고 한다. 소설에 전념하기 위해 정규직인 편집자 생활을 청산하고 여행을 떠난다.
정규직 직장을 그만둔다. 떠난다. 여행자의 신분으로 낯선 도시에서 잠시 산다. 이런 서사는 얼마나 황홀한가. 내 이야기는 못 되지만 남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법. 내 고통은 바로 보지 못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라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맥락과 비슷하려나. 요즘엔 논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 논리라는 게 있기나 있었나.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가 끝나기는커녕 코로나와 일상을 공유하게 된다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이라는 가정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암담한 예상.
어른들 말 하나도 틀린 법이 없지. 젊었을 때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말. 100세 시대니까 나는 아직 청년을 살고 있다고 자위한다. 아직은 청년이니까 돌아다녀 볼까 했는데 코로나.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없어도 집에서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면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는 저입니다. 더워서 땀을 질질 흘리면서 깨고 일어날 준비를 하기 위해 또 누워 있지요.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는 다정한 사람들을 만난 기록이다. 부지런히 세운 계획으로 떠난 여행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즉흥성으로 시작한 여행에서 정세랑은 시절 인연을 쌓아간다. 마지막에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별로라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럴 일이 아닌 사진이 실린 책은 피곤한 하루를 보듬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할 여행지에서의 흥분과 열기와 두근거림의 감정이 활자를 타고 넘어온다.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말에 빵 터지고야 말았다. 자꾸 그 유머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적. 10년 넘게 야행성으로 살았는데 일찍 끝나야 밤 열시여서 새벽 한 시, 두 시에 자서 정오에 일어나는 삶이었다. 그걸 한 번에 바꾸려니 쪼까 힘들다.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를 읽으려고 전날 계획했지만 늘 실패한 한 주였다. 다행히 토요일이 있어서 (왜 아침 6시에 눈 뜬 건데) 완독할 수 있었다. 한 달에 열 권 이상은 읽었는데. 7월에는 다섯 권 읽었네. 오늘은 8월 7일. 한 권 읽었다. 숫자에 집착하는 병을 고쳐야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책 리뷰니까, 감동받은 구절을 옮겨본다.
뮤지컬을 보고 나서 더더욱 자주 로알드 달의 말을 떠올린다.
"친절함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한다. 용기나 대담함이나 너그러움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친절함이 말이다.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됐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의 말을 어설프게 번역해보았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세상의 보고 싶지 않았던 면들을 보고 나서야 이 말이 의미 있게 와닿았다. 아동문학을 쓰고 싶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와버렸지만, 세계에 대한 태도를 다시 다잡고 싶을 때는 역시 아동문학을 찾게 된다.
(정세랑,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中에서)
소설을 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떠났던 여행지에서 정세랑은 친절함이라는 가장 따뜻한 감정을 온몸으로 받고 돌아온다. 간혹 이상한 인간들도 만났지만 뜻밖의 인연과 맺은 기억은 정세랑이 아닌 소설가 정세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좋았던 것들'의 목록을 적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건 부당한데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하고 발끈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에 붙들리고 싶지 않다는 것.
두서없는 사고 끝에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미 좋은 사람을 만났고 좋은 사람을 만날 예정이므로 괜찮을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용기를 준다. 이해는 하는 것이 아닌 되는 것. 이해한다는 가짜고 이해된다가 진짜 같다고 나이가 드니까 이해라는 개념을 무식하게 정의해 버리게 된다. 이해되지 않는 건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넘어가자고 슬퍼하는 나를 달랜다. 간혹 우리 사는 이곳에 외계인이 아닐까 고민하게 만드는 종족을 만나곤 하는데 그땐 사랑스러운 인류애로 가득한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를 읽었다는 기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