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별의 김포공항 ㅣ 쏜살 문고
박완서 지음 / 민음사 / 2019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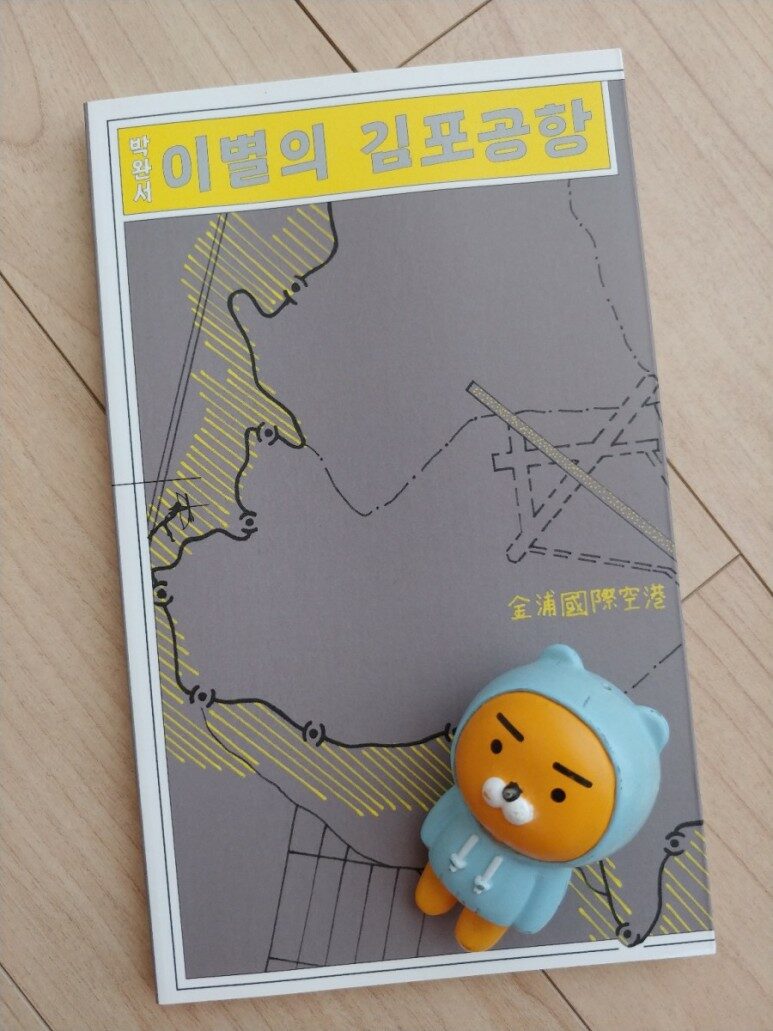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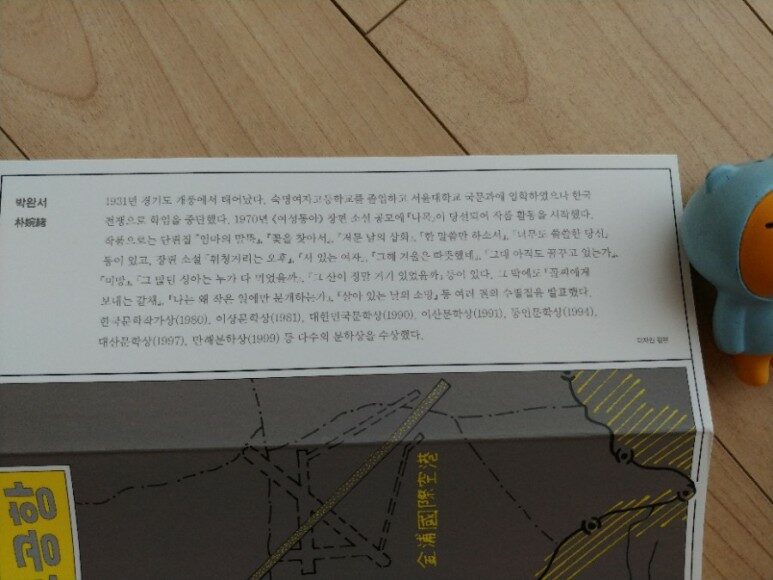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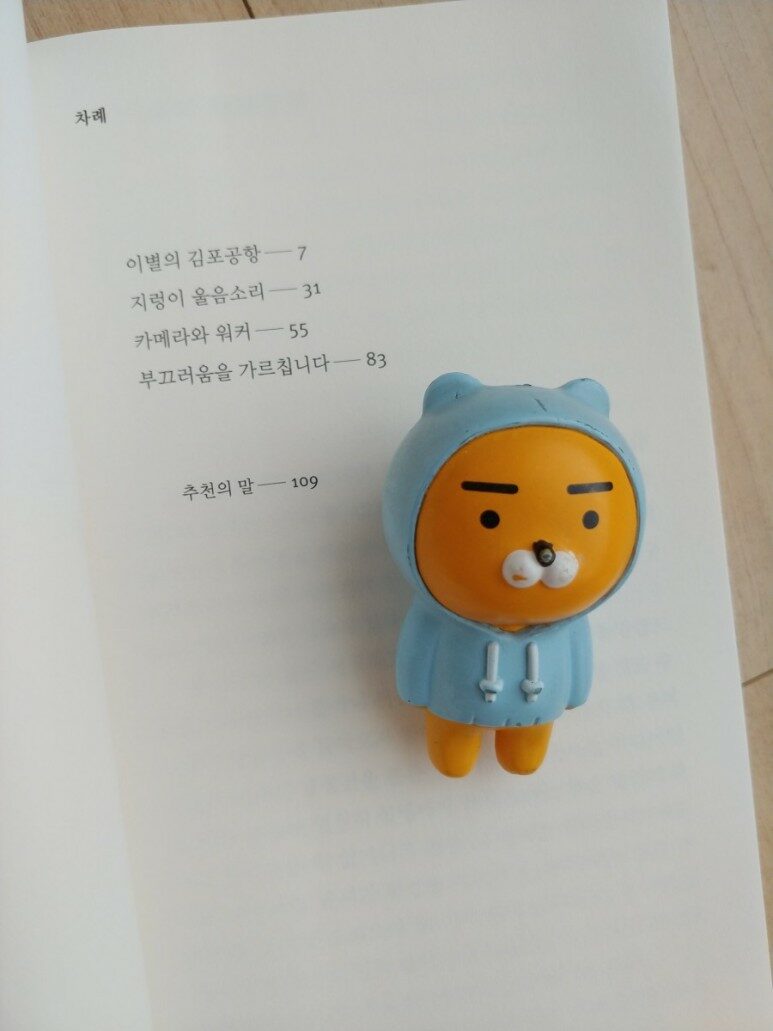

좀 괜찮은 인간이 되고 싶어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다.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머리맡에 시계를 두고 잔다. 알람은 듣기 싫어 맞춰 놓지 않은 채 눈이 떠지면 틈틈이 시간을 확인한다. 긴장 상태에서 자서 며칠은 피곤했는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괜찮아졌다. 새벽 네시에서 다섯 시 사이 눈을 떠 시간을 확인, 안심하고 다시 잔다. 한두 시간은 더 잘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정확하게 여섯 시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즈음에 일어난다. 1월이니까. 1월에는 뭐든 계획을 한 번씩 세워 보고 실천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그래도 열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박완서의 네 편의 소설이 실린 『이별의 김포공항』을 오전 시간에 읽었다. 브이로그 보면 오전에 일어나 공부를 하거나 요가를 하던데. 작고 귀여운 판형의 쏜살 문고 시리즈라 읽고 있으면 시간이 정말 쏜살처럼 흐른다(이 거지 같은 비유). 사는 게 시시하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지칠 때. 시간이 많은데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을 때. 젊은 작가의 소설이라더니 나이를 보면 그다지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판사에서 미는 작가인 것 같아 책을 사서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나는 몰라 내가 왜 이걸 샀을까. 마케팅에 놀아난 것일까. 자책하는 나에게 박완서의 소설을 건네준다.
얼마 전에 읽은, 차마 제목을 밝힐 수 없는 소설을 읽고 나서 나는 이제 글렀구나. 한국 문학의 첨단에서 멀어졌구나 했다. 첨단에서 멀어지면 다시 그리운 시간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사람 사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곳으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꿰뚫는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야기꾼의 품에 안겨본다. 『이별의 김포공항』은 박완서 소설의 정수만을 모아 놓았다. 박완서의 세계에 입문하려는 자가 있다면 이 책을 자신 있게 건넨다.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다는 박완서 소설.
먼저 표제작인 「이별의 김포공항」은 외국병 그것도 미국병에 걸린 자식들의 사연을 가진 노파가 등장한다. 전쟁이 끝나고 어찌어찌 미군 부대에 빌어서 살아가는 자식들은 하나같이 미국에 가지 못해 안달이다. 한바탕 난리굿을 친 끝에 그들은 각자 미국은 못 가고 브라질, 괌, 서독으로 탈출하듯 이 나라를 떠난다. 그 소동을 기억하는 노파의 손녀. 노파는 딸의 초청으로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손녀는 떠나기 전 할머니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 추억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
「지렁이 울음소리」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는 안온한 생활에 드리운 불안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남들이 봤을 때 괜찮게 살아가는 두 여자. 「지렁이 울음소리」의 여자는 작은 일탈을 감행하지만 실패로 끝난다. 권태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님을 보여준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속 여자는 세 번 결혼을 한다. 감행한다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허풍 앞에서 여자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싶다고 느낀다.
「카메라와 워커」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조카를 키운 여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다 너 좋으라고 내 뜻이 네 뜻이 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지만 실패한 여자의 허무를 그려내는 소설이다. 네 편의 소설에 등장한 여자들의 서사는 과거를 날아와 현재에 도착한다. 흘러간 몇 십 년 전의 과거가 아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반복되고 있는 허무요, 슬픔이다. 나는 비뚤어진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는 소설이 좋다.
올바르고 괜찮은 척 점잔을 떠는 소설을 읽고 있노라면 전부 집어치워 소리고 지르고 싶어진다. 박완서의 소설은 그런 게 없다. 인간이 가진 속물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꼬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꺼내서 해체하듯 보여준다. 인간의 속이 이렇게 시꺼멓다고. 아울러 악랄한 모습도 숨기고 있다고. 나, 당신, 우리가 위선을 떨고 위악을 부리며 살아간다. 말해준다.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볼까. 새벽에 일어나 이것저것 하는 척하는데. 이 짓도 얼마 안 갈지 모른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일찍이 글렀는데. 다만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우는 「이별의 김포공항」 속 노파는 자신의 삶을 뿌리가 뽑혔다고 생각한다. 뿌리가 뽑힌들 어떠랴.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단단한 땅이 있으면 내 자리인 척 비비는 것도 좋을 터이다. 각자의 자리는 없다. 자리가 있다고 믿으며 살아갈 뿐이다. 더 나아지리라는 믿음 대신 더는 나빠질 수 없다는 오기로 버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