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잊기 좋은 이름
김애란 지음 / 열림원 / 2019년 7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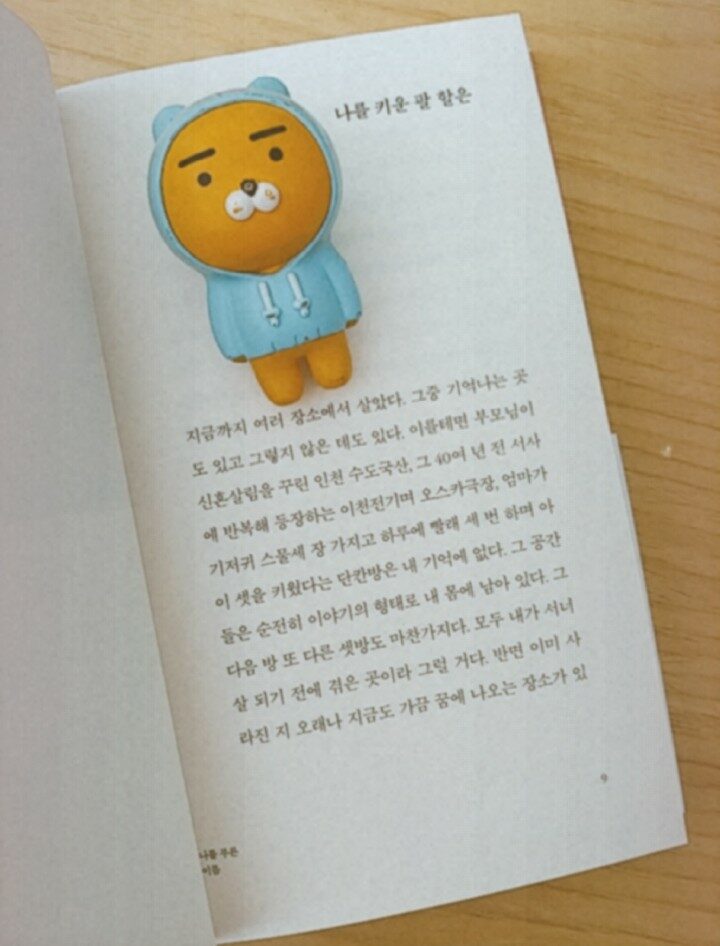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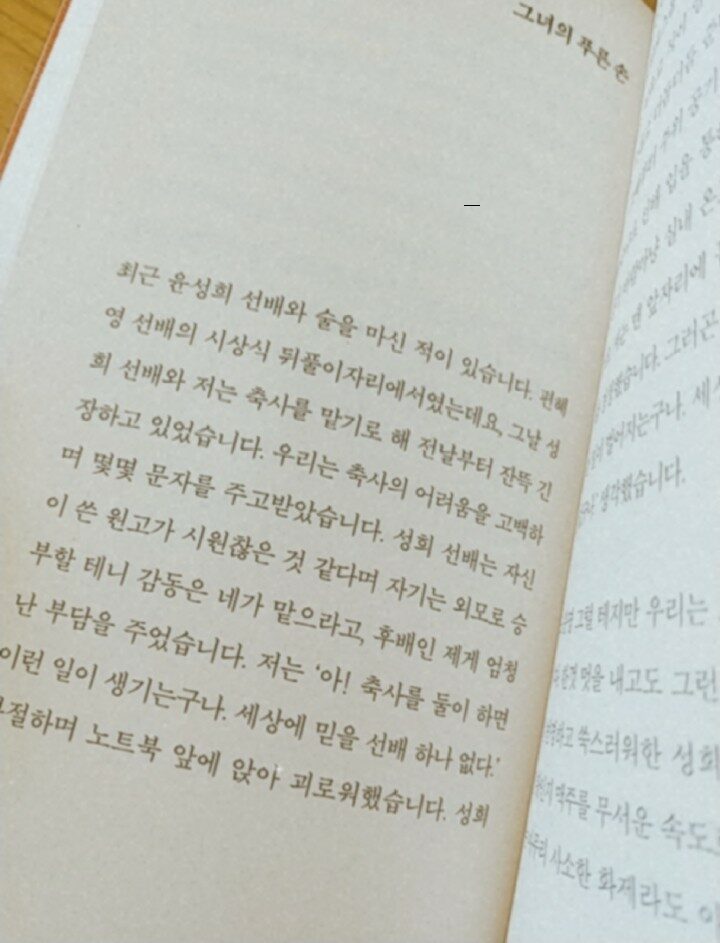
무더웠던 여름도 슬그머니 물러날 기세를 보이고 어느덧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가을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산책도 수월해지고 있다. 풀벌레 우는소리에 자동차 굴러가는 소리가 묻히고 먼 곳의 불빛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걷는 중에 우리 집 보이나 안 보이나를 물으며. 다가오는 불빛에 마음이 편안하다. 배불리 저녁을 먹은 밤에 걷는 길의 배경이 이제는 가을이어서 안심이 된다. 편의점에 들러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돌아온다. 읽다가 남겨 두었던 책을 펼친다.
김애란의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에 담긴 풍경에 나의 시간을 밀어 넣어본다. 소설가가 담아내는 일상과 내면의 모습이 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계절을 그리는 섬세한 문장과 유년의 기억을 환기하는 진솔한 마음이 책 안에 담겨 있다. 부사를 최대한 쓰지 않길 바라면서 부사를 있는 힘껏 끌어모아 쓰는 소설가. 진지하게 과거를 회상해서 내가 아는 그 김애란이 맞나, 의심이 들 때쯤 튀어나오는 유머까지. 『잊기 좋은 이름』에는 상상으로 쓰인 글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진실하게 바라본 관찰의 기록이 있다.
어린 시절과 그의 부모의 사랑을 회상한 글을 시작으로 문단에서 만난 문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본 글을 읽으며 웃음이 났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소설가. 김연수, 편혜영, 윤성희. 그중에서 가장 의외로 웃겼던 소설가는 윤성희였다. 편혜영의 시상식 자리에서 축사를 맡았는데 윤성희 자신은 외모를 김애란은 감동을 맡으라고 했던 부분 때문이었다. 윤성희 소설에서도 그런 이상하게 웃기는 부분들이 감지되었는데 소설가 자신도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자신의 기억과 주변 사람들과의 일화 뒤에는 그가 읽었던 소설의 풍경이 나온다. 소설을 쓰는 그가 문학의 쓸모와 의무를 생각하면서 읽은 책의 기억. 책을 읽을 때 연필로 밑줄을 긋고 급전이 필요해 책에 그은 밑줄을 지우는 소설가. 꾸미지도 과장하지도 않은 우울과 쓸쓸함이 더욱 애틋했다.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화제가 되어 괴물 신인으로 떠오른 김애란의 소설을 읽었던 기억과 더불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연대까지.
『잊기 좋은 이름』을 읽으며 가을의 바람, 문학을 향한 열정, 소설을 쓰겠다는 마음가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비슷한 문학적 취향을 가졌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전부를 알 수는 없으나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 독서라는 이 외롭고 고독한 행위에서 취할 수 있는 건 우리라는 확인이었다. 같은 꿈을 가지고 다른 시간을 살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밖에 만날 수 없다는 것. 실제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무한의 밤의 시간에 써 놓은 글을 읽으며 나는 살아갈 수 있었다. 편지를 보내보는 것.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 기울어진 배 안에서 학생이 남긴 의문이 잊히질 않는다고 썼다. 무수히 많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만 정작 불러야 할 이름에는 침묵하며 살고 있다. 진지한 척 어른인 척 굴었지만 사실 우리는 미성숙한 자라지 않은 오스카인 채로 살아왔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는다. 문학은 살아가는데 별 의미도 없고 쓸모도 효용도 없는 자리만 차지한 채 먼지만 먹는 낡은 곰인형 같지만 그럼에도. 귀여운 구석이 있어 지나가다 쓸어 보는 안타까움 같은 것이라 생각해보는 것.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고 연필로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어갈 우리들이 있기에 슬픔은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