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랑대문 ㅣ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 16
최윤 지음 / 현대문학 / 2019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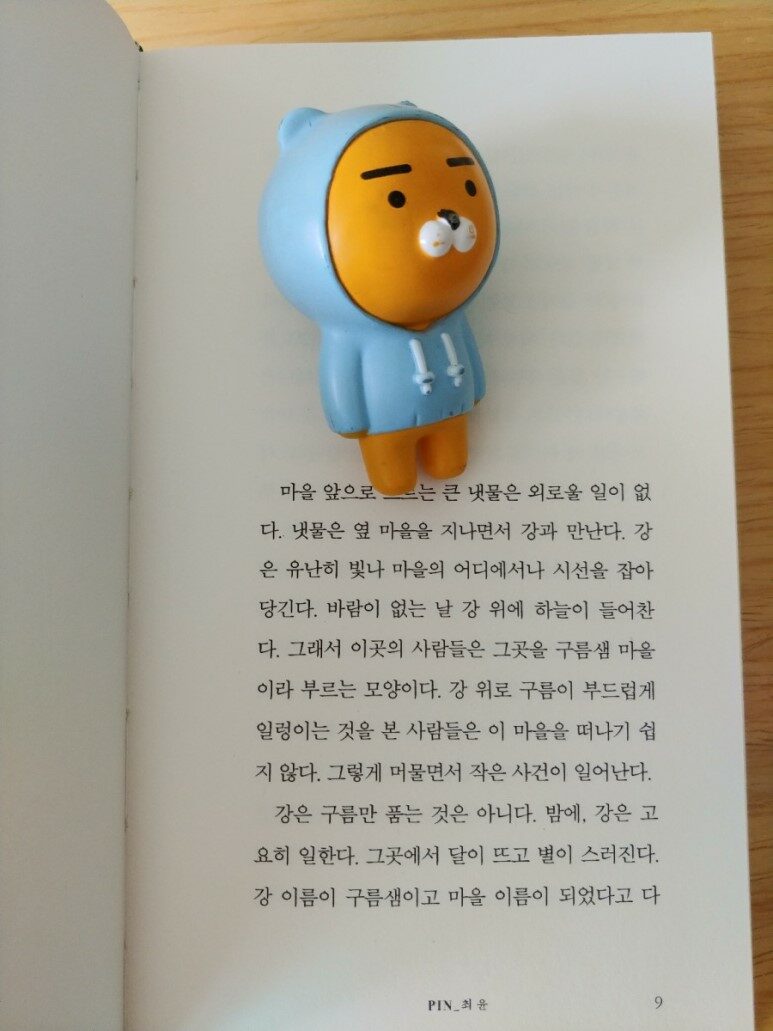
최윤의 『파랑대문』을 읽기 시작한 건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일요일 새벽은 그렇듯 무력하고 자책으로 들어차 있었다. 다가오는 월요일이라는 시간의 부담감과 내일은 활기 없음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조금만 읽다 잠들어야지. 곧 잠이 몰려올 거라는 안일한 예감으로 책을 읽어나갔다. 예상은 빗나갔고 나는 새벽 세시가 넘을 때까지 『파랑대문』을 읽었다. 다 읽었고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월요일이 무슨 상관이야. 소설의 시간 앞에서 월요일이라는 시련은 가뿐히 넘길 수 있었다.
구름샘 마을의 정경으로 『파랑대문』은 시작한다.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으로 데리고 간다. 소녀의 뒤로 누군가 다가와 얼굴을 가리며 자신이 누군인지를 맞춰 보라는 고요한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로 돌아와 소녀로 추정되는 그녀는 병원에 누워 있다. 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얼른 배에 손을 갖다 댄다. 아기가 있었다. 3개월 된 아기가. 자신이 왜 병원에 누워 있는지를 기억하려고 애쓰지만 다시 그녀는 정신을 잃는다.
장면이 바뀌고 그녀의 남편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출장지에서 닥쳐온 불길한 예감.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 집에 도착해 마주한 모습에서 그는 이제는 생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틀려 버렸다는 의혹에 휩싸인다. 잘 정리하고 정돈한 삶이라고 여겼는데. 침대 곁에 쓰러진 아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침입자의 흔적을 모았다. 경찰에 알리지 않은 건 그와 그녀 사이에 있었던 S 때문이었다. 소설이 끝나도 S의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들이 그토록 S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이유는 과거 때문이었다. 『파랑대문』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현재의 불운을 그린다. 최윤의 문체는 막힘이 없고 이 작가가 결코 힘들게 문장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조금만 읽어야지 했다가 새벽이 지나도록 전부 읽어 버린 건 서사의 강렬함도 있겠지만 순전히 문체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고 절묘하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솜씨. 최윤은 최고의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였다. 그걸 잊고 있다가 『파랑대문』을 읽으며 깨달은 것이다.
삶에 닥쳐오는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파랑대문』은 묻는다. 이해하고 긍정할 힘을 얻기까지 자신의 내면을 집요하게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돌아갈 곳이나 위로의 말을 해줄 이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겨내야 한다. 말과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 침묵이 끼어드는 순간을 응시해야 한다. 침묵을 이겨낸 자만이 아득한 과거에 존재하는 '파랑대문'으로 걸어들어 갈 수 있다. 불시에 찾아오는 절망 앞에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다.
소설은 나약함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파랑대문』은 소설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방편으로 쓰였다. 말할 수 없음에서 말할 수 있음으로 나아가기까지의 여정을 담아낸다. 잘못과 용서를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 살아가야 함을 배운다. 과거는 침묵 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걸 『파랑대문』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