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절일기 - 우리가 함께 지나온 밤
김연수 지음 / 레제 / 2019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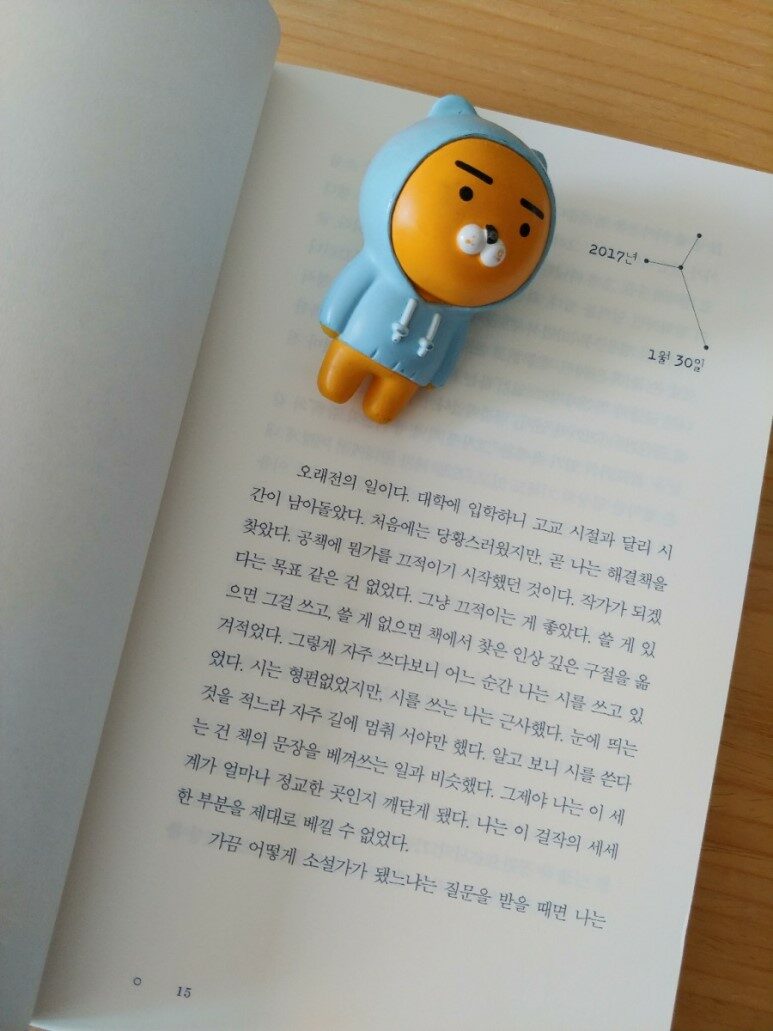

김연수의 『시절일기』를 읽는 시절은 시끄럽고 먹먹하다. 확인되지 않은 말이 떠돌고 공인되지 않은 사실을 수긍하는 시절이다. 이제는 왜 살아가야 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물어야 할 때인 것이다. 김연수의 시절은 소설을 쓰고 읽고 그 안에서 삶의 이유를 외롭게 찾아가는 것이었다. 『시절일기』에는 그가 탐독하고 의미를 찾아냈던 책과 영화, 음악의 이야기가 촘촘한 문장으로 실려 있다. 읽으며 그가 아끼는 책의 목록을 들여다보며 나의 시절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물었다.
문학이 위로가 될까를 김연수는 의문한다. 소설가 김연수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의 나뉘는 듯하다. 그만이 그럴 것이 아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시간에 빚을 지고 빚을 갚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이 패배감이 삶의 원동력이라니, 믿을 수 없지만 믿어야 한다. 『시절일기』 안에 소설가의 자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 시절에 대한 단상이 있어서 좋았다. 여전히 나는 그가 이야기하는 책의 절반도 읽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충분했다.
『시절일기』에는 소설가란 어떤 사람인가를 묻기도 한다. 한 사람이 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문득 감당할 수 없는 생의 슬픔이 밀려온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며 책상에 앉는다. 연필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소설가의 시간이 펼쳐진다. 지금 쓰고 있는 사람. 김연수는 소설가를 이렇게 설명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불타오른다. 첫 번째 소설은 그렇게 쓰인다. 나의 슬픔과 번민, 고독을 말할 수 없을 때 쓴다. 처음은 그렇게 쓰고 이내 불은 꺼진다.
불이 꺼진 자리를 매만지고 재를 바라보는 일. 두 번째 소설을 시작할 때 소설가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열정은 사그라들고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을 길러 문장을 써야 한다. 그렇게 소설가가 된다. 그렇게 문학을 하는 자의 시절로 살아간다. 문학이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 『시절일기』는 그렇게 물어오는 책이다. 자신의 언어로 세계를 창조해 내고 비밀을 만들어 갈 때 불의와 불합리, 적폐와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순간에는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럴 때. 미처 하지 못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온기를 담아 말로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믿는다. 문학이 위로가 되고 문학이 쓸모가 될 수 있음을. 『시절일기』 안에는 어른으로 소설가로 사람으로 다하지 못한 위로의 말이 있다. 위로는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랑이 없으면 위로도 없다. 문학을 읽는 이유는 상처받은 자들에게 사랑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시절일기』를 읽으며 깨닫는다. 어디에도 사랑은 없었다. 그 순간에는. 배가 기울어질 때.
이제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내가 문학이라는 세계로 나의 한 시절을 밀어 넣은 이유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라는 쓸모를 찾기 위해서. 문학 안에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는 단 하나의 가치는 사랑이었다. 여전히 이 세계는 잘못을 반복하고 시끄럽지만. 그래도. 문학이 있다. 잠시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 주는 책과 영화, 음악이 있다. 『시절일기』는 우리가 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말을 읽고 쓰고 보고 듣는 행위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절일기』에는 김연수가 읽은 책의 목록이 실려 있다. 소설가의 시절을 따라가는 일이 수월해진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말하는 『시절일기』. 우리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만 사랑인 것이다. 보내지 못한 편지 안에 담긴 추신의 말은 '사랑해'였다. 삶이 지속되는 한 사랑은 유효하며 사랑의 기한 따위는 없음을 이제 나도 당신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