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제는 봄 ㅣ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 12
최은미 지음 / 현대문학 / 2019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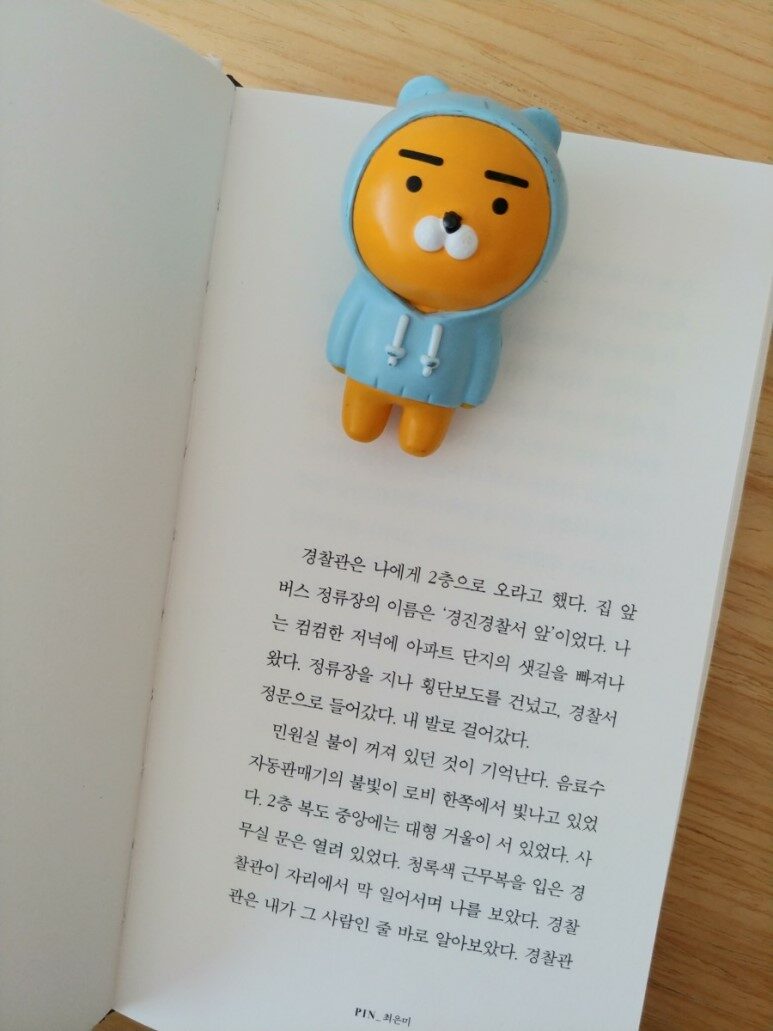
창문을 열어 놓으면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들어온다. 바닥에 쌓여 있는 노란 먼지를 응시한다. 개나리가 피었다가 지고 목련이 그 뒤를 잇고 철쭉이다. 벌들은 바쁘고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는 변덕 심한 날씨는 기어이 감기를 주고 낄낄댄다. 좋은 날은 모두 집어넣고 마음껏 기뻐하라고 하는 듯한 5월에 콧구멍에 휴지를 끼어 놓고 최은미의 『어제는 봄』을 읽었다. 우연하게도 (나는 우연이라는 걸 믿는 편이다) 소설과 현실의 시간이 일치한다. 『어제는 봄』의 주인공 정수진이 지내고 있는 시간도 봄이다.
수진은 10년 전 신춘문예로 등장한 소설가다. 글을 쓰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문에 보낼 사진을 찍어주던 남편도 이제는 수진이 글을 쓰는 걸 지겨워한다. 식탁 위에 앉아 모니터의 커서를 바라보고 있는 수진에게 차라리 일을 하라고 소리친다. 그럼에도 수진은 딸 소은을 학교에 보내놓고 카페에 들어가 글을 쓴다. 10년간 청탁 한 번 받지 못했다.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소설을 써 내려간다. 장편 응모에 보낼 소설을 쓰려고 취재차 만난 경찰관 이선우를 만나 묘한 시간들을 마주한다.
소설은 수진의 시점에 따라 그녀가 보내는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며 보여준다. 딸과 남편을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며 객관적인 시선을 취하려 한다. 누구의 엄마와 아내가 아닌 자신의 글을 쓰는 한 사람으로서 서기 위한 외침으로 말이다. 수진의 친정 엄마가 가지고 있는 비밀과 그로 인해 수진이 견뎌야 했던 불안과 분노는 『어제는 봄』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정서로 작용한다. 수진이 왜 그토록 글을 쓰려 하고 딸 윤소은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한 번씩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는지 소설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
『어제는 봄』은 전부를 말하면 안 되는 소설이다. 혹은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 쓴 소설처럼 친절한 서사를 보여주지 않는다. 수진의 과거에 잠들어 있는 비밀은 수진의 현재에게까지 찾아와 그녀를 미치게 만든다. 우리는 상상해야 한다. 수진의 세계에 갇혀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니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제는 봄』에서 최은미는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야기의 혼란을 독서의 즐거움으로 느끼게 만들어 준다. 소설을 쓰는 사이에 육아 카페에 들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글에 댓글을 달아 스트레스를 풀고 윤소은의 반에서 열리는 학부모 총회에 참여해 폴리스 맘 활동을 하기도 한다.
생활은 이어져야 하는데 수진은 가위로 일상을 자르고 싶다. 그 와중에 만난 이선우와의 시간을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다. 이야기의 전부를 보고 싶었지만 『어제는 봄』은 한쪽 면의 반도 보여주지 않은 채 끝난다. 이 소설은 누군가를 향한 익명의 러브 레터로도 읽을 수 있다. 이쪽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랑을 고백하는 소설 『어제는 봄』의 주인공 수진의 시간이 '오늘도 봄'이 됨을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