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10주년 특별판 - 수상 작가들이 뽑은 베스트 7
편혜영 외 지음 / 문학동네 / 2019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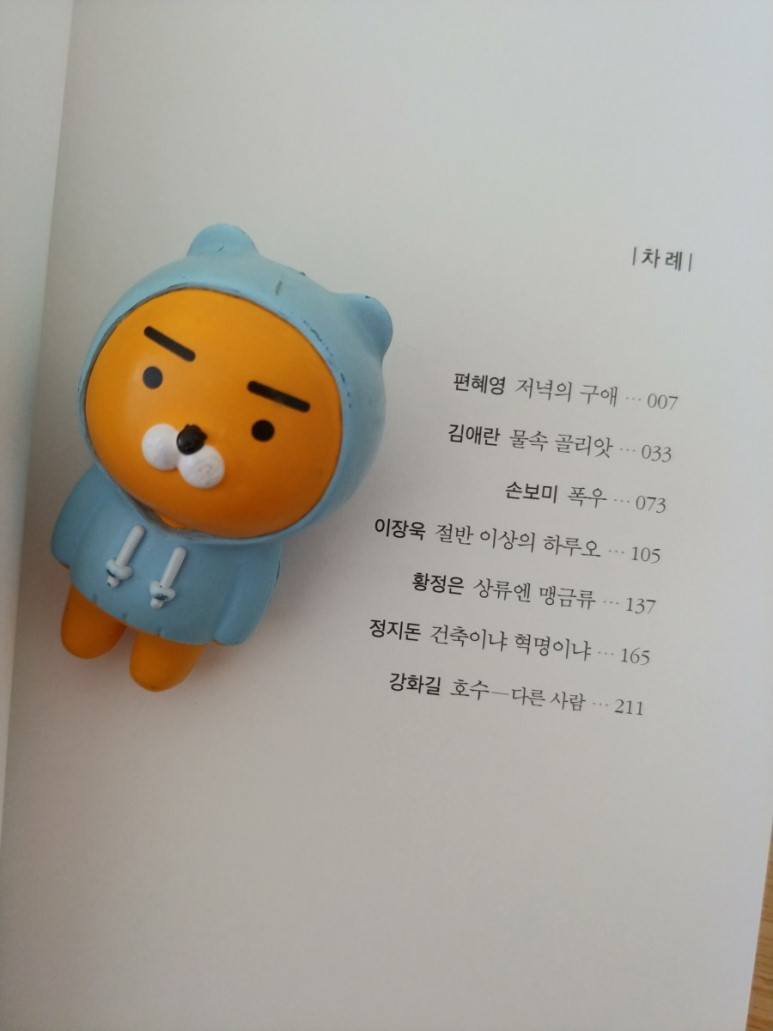


그 일이 전까지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여할 이유도 없었다. 삶은 나의 의지와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책 없는 낙관으로 나는 죽음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았다. 자신감이 넘치거나 당당한 삶의 태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편혜영의 단편 「저녁의 구애」를 처음으로 읽을 무렵에는 소설의 분위기에 빠져 인물이 느끼는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십 년 전에 알고 지낸 어른이 임종 직전이라는 친구의 전화를 받는 김에 대해 연민을 느끼지 못했다. 김은 대체 친구가 어떻게 자신의 꽃집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근조 화환을 청할 생각을 했는지만이 궁금하다. 다가온 죽음이 황망한 것보다 전화를 걸어온 이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만이 가득한 주인공이었다.
「저녁의 구애」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한다. 꽃집을 운영하는 김은 다양한 일로 꽃의 주문을 받는다. 그중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배달은 근조 화한을 보내야 할 때이다. 친밀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자신을 비방하는 서신을 보내온 사람에게서 걸려온 전화. 회사를 옮길 때 도움을 준 어른이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미리 화한을 보내달라고 한다. 김이 사는 곳에서 남쪽으로 삼백 킬로미터를 가야 하는 곳이었다. 김은 오랜만의 전화에서 안부를 묻거나 자신의 꽃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싶지만 모든 말들이 침묵으로 돌아 나온다. 화한을 싣고 도시로 들어가자 보이는 장례식장에서 한 번 더 전화가 걸려온다.
어른이 아직이니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으로 와달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며 김은 도시를 돌아다닌다. 유예의 시간을 견디며 지진이 일어난 도시에서 선물 받은 어묵 통조림을 찾기도 하고 상조 회사에서 나온 이와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내내 김의 마음속 불안을 건드리는 것은 여자의 존재였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잘 웃지도 않고 농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여자. 번번이 여자와 만남이 뒤로 미뤄지고 있었다. 친구의 전화가 아니면 지금쯤 여자와 만나서 닿지 않을 말을 주고받거나 어색한 웃음을 나눌 것이었다. 어른이 임종을 맞으면 화한을 건네주고 돌아올 수 있지만 어른의 시간은 아직 이곳에 머물러 있다.
트럭이 불타고 멀리 장례식장이 보이는 국도변에 서서 김은 불현듯 여자에게 전화를 건다. 방금 전 이별을 고한 자신이었다. 도처에 죽음이 널려 있는 걸 목격한 뒤 삶이 다른 곳으로 흔들리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지진이 잦은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재난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곧 죽음의 땅으로 건너가야 할 누군가가 누워 있는 곳. 김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여자에게 구애의 말을 전하기 시작한다.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랑만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의 몸짓으로 말이다. 여자가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을 무시하면서 때론 귀찮아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듯 달려오는 마라토너의 몸짓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애도하는 듯 빛나는 트럭의 불타오르는 모습이 조등弔燈으로 보이는 환영을 보면서 김은 처음으로 삶의 기민한 의욕을 느낀다.
김이 그 저녁 여자에게 보이는 관심은 삶을 향한 구애의 신호이다. 살아 있으니 산 인생이었다. 의미와 긍지를 찾을 여유는 없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죽음처럼 삶의 열의도 난데없이 발화한다. 「저녁의 구애」를 두 번째 읽은 시점에서 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은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재난의 현장처럼 멀고 낯선 것이었다. 내게까지 도착할 명분이 없는 것이었다. 이제 조금은 느낄 수 있다. 김이 국도에 서서 여자에게 길고 긴 낯선 구애의 말을 하기까지의 암담함과 불안의 이유를. 마라토너의 포기하지 않는 완주와 트럭에서 솟구치는 불길은 희망은 동시에 절망이기도 하다는 것을 편혜영은 물기 없는 건조한 시선으로 그려낸다. 소설가라 하더라도 인물의 절망 앞에서 그 어떠한 감정도 내보이지 않겠다는 듯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운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상의 모든 것을 재로 소멸시켜 버린다. 무로 변해버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인간만을 남긴다. 살아야 하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기까지 죽음의 고통 앞에서 오래도록 버틸 수밖에 없다. 예민한 눈으로 죽음과 삶의 공동을 그린 「저녁의 구애」를 읽으며 이제는 삶을 버틴다는 것보다 죽음으로 서서히 건너간다는 기분으로 살아가야지 생각하는 것이다. 삶의 태도를 당당히 가지지 못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비겁해지는 것을 깨닫는다. 삶에 아부하는 것과 죽음에게 구애의 말을 펼치는 것. 고양이가 우는 깊은 밤 친밀해진 죽음의 곁을 쓰다듬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