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를 뺀 세상의 전부 - 김소연 산문집
김소연 지음 / 마음의숲 / 2019년 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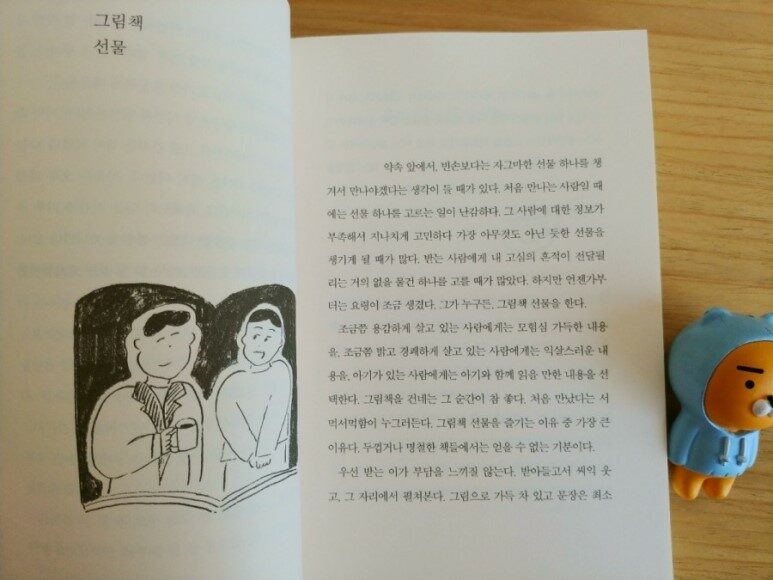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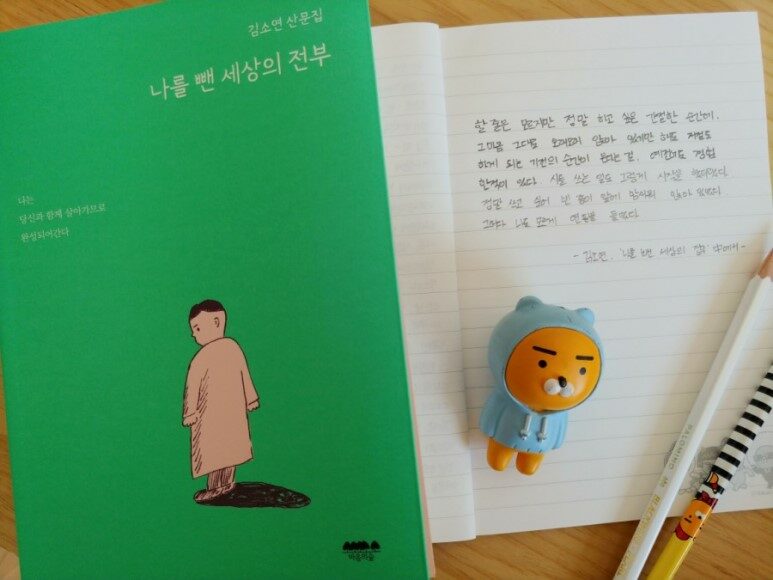
할 줄은 모르지만 정말 하고 싶은 간절한 순간에, 그 마음 그대로 오래오래 앉아 있기만 해도 저절로 하게 되는 기적의 순간이 온다는걸, 예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다. 시를 쓰는 일도 그렇게 시작을 했더랬다. 정말 쓰고 싶어 빈 종이 앞에 밤새워 앉아 있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연필을 들었다.
(김소연, 『나를 뺀 세상의 전부』中에서)
김소연의 산문집 『나를 뺀 세상의 전부』 겨울 이야기 첫 편은 '간절한 순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기타가 가지고 싶다는 시인의 말에 다정한 친구는 집에 남는 기타를 선물로 주었다. 그 기타를 들고 아는 코드 몇 개로 노래를 지어 부른다. 노래가 되다가 노래가 안 되다가. 시인의 겨울은 기타를 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타를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기타를 쳐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불러내어 가장자리를 쓰다듬는다. 나의 꿈이 바래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낸다.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순간을 지워 버린다.
시인에게도 시 쓰기는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정말 쓰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채.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쯤 제목을 쓰고 하나의 단어를 종이에 옮기는 순간 시의 운명이 찾아온다. 『나를 뺀 세상의 전부』는 시인보다는 시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김소연의 하루의 아침과 저녁 그리고 보통의 날을 보여준다. 겨울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봄, 여름,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에서 끝난다. 보통의 날들. 계절에서 만나는 일상의 장면을 소곤소곤 말해준다.
시 쓰는 사람의 자의식보다는 생활인 김소연의 내면을 풍부하게 그린다. 나를 뺀 세상의 전부에서 만나는 모습은 놀랄 만큼 다양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는데 내 이야기를 덜어내자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행지에서 만난 부부. 혼자 외국 여행을 하는 할머니. 해녀들에게 욕 먹은 이야기. '해야 돼'라는 말에서 느껴졌던 자유분방함.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담근 첫 김장. 이야기 안에는 '나'가 있지만 풍경으로 보자면 구석에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심에 있었더라면 몰랐을 사유를 포착해 낸다.
내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불 켜진 문구점을 지나치지 못하고 들어가 연필과 공책을 들여다보던 시간이. 표지가 예쁘고 줄이 없다는 이유로 공책을 사고 캐릭터가 있어서 같은 종류의 샤프를 샀다. 물건을 사서 기뻐야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아두고 내일은 써야지 다짐했던 지난날.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헛소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해야 한다. 마주한 공책을 보며 연필을 들고 써야 한다. 손가락을 움직여야 한다. 그럴 때 내 마음속 나는 나에게 해도 돼가 아닌 '해야 해'라고 외친다.
김소연 시인은 산문도 시처럼 쓴다. 산문집의 마지막 '다시 겨울 이야기'는 소곤소곤하던 시인의 목소리가 조곤조곤으로 바뀌는 부분이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일이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어른은 이제 필요 없다. 시 쓰는 어른으로서 그녀는 세상에 외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가서야 들려준다.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군가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근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점 주인이 될 수 없다면 일일 직원으로 사전만 파는 가게를 꿈꾸는 것으로 살아가는 일. 선물을 주기가 힘들 때 그림책을 골라 주는 요령도 하나 배워간다.
낭비한 인생이었다고 말해도 괜찮다. 실수도 내가 해봐야 실수라는 것을 안다. 곧장 달려가 해보는 것도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한 건 하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