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령 ㅣ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 7
정용준 지음 / 현대문학 / 2018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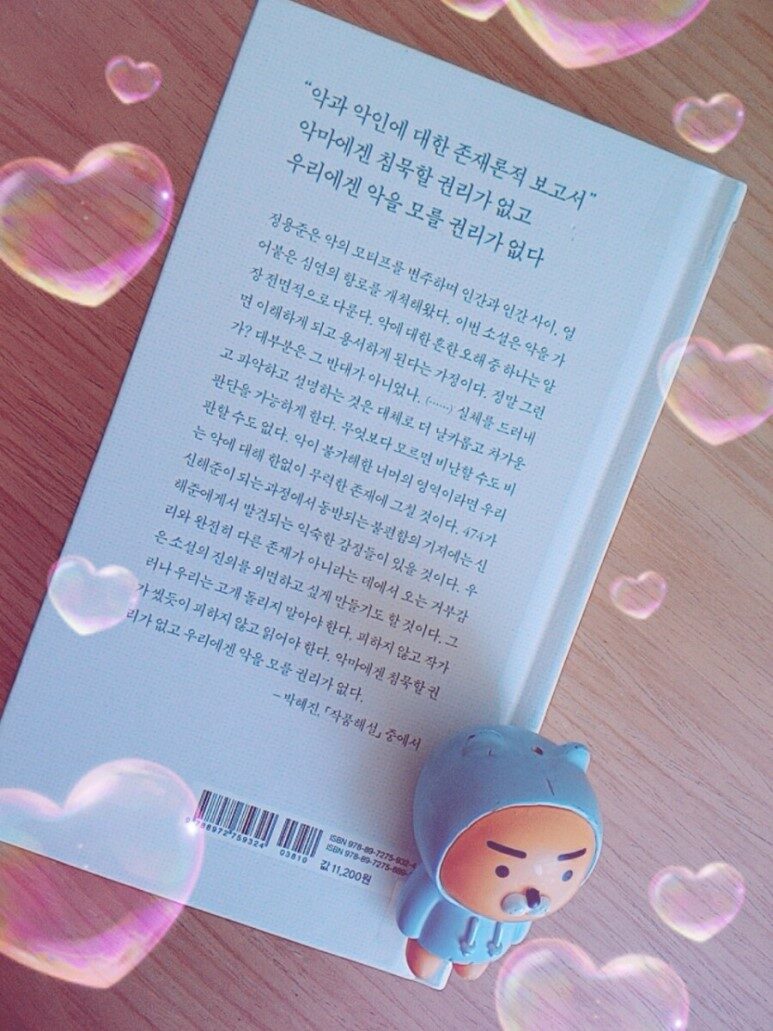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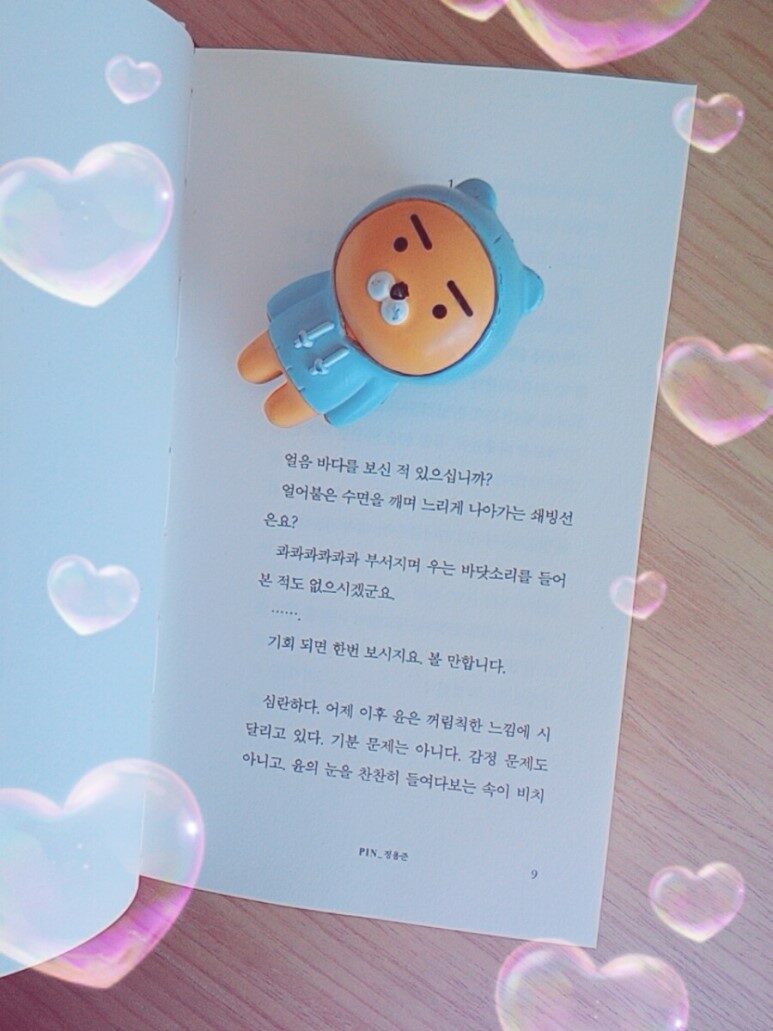
어떤 소설은 인상으로 남는다. 정용준의 소설 『유령』은 그의 단편 「474번」이 원작이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는데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를 홍보하는 작은 책자가 딸려 왔었다. 책자는 소설집에 실린 첫 번째 단편 「474번」을 실어 놓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다. 흥미로운 소재였다. 사람을 무참하게 죽인 사형수의 이야기였다. 사형 집행 전에 그는 꽃게찜을 부탁하여 먹는다. 그가 꽃게 살을 발라 먹는 장면에서는 침이 고였다. 음, 괜찮은데 하고는 책을 주문해야지 했지만 잊어버렸다. 사는 게 뭐 다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
쉽지 않은 일이다. 소설을 읽어간다는 일이. 드라마 한 편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기사를 보고 다음 내용을 짐작하고 만다. 거짓말과 이미 일어난 일을 다루는 일을 지켜본다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소설을 읽어나간다. 묵묵한 마음이 되어. 내가 읽어주지 않으면 누가 읽어줄까. 매일같이 신간 소설이 나온다. 이 세계의 소설가들은 지치지도 않나 보다. 혹은 지쳤지만 나 같은 독자를 위해 아니면 그 자신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소설을 쓰고 있는가 보다.
정보 없이 첫 문단을 읽어 나갔다. 어라, 이거 어디서 읽은 소설인데 하고 보니 소설의 마지막에 ‘이 소설은 단편 「474번」을 개작한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실려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나의 기억력은 아직은 쓸만하다니까 하며 순식간에 읽어 나갔다. 『유령』은 사람을 열두 명이나 죽이고도 좀처럼 살해 이유를 말하지 않은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보다 더 한 속을 알 수 없어 무서운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형수로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보내는 그를 담당 교도관 윤은 호기심을 숨겨가며 관찰한다.
다가오면 죽인다. 자신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자는 전부 죽였다고 말하는 474. 그와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까지도 탐할 것 같은 눈동자를 보고도 윤은 질문과 호기심을 숨기지 않는다.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474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끝없는 의문이 보일 뿐이다. 474는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가족도 없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존재한다. 스스로를 ‘유령’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한 여자가 접견 신청을 해온다. 누나.
『유령』은 악을 저지르며 악의 화신이라 자인하는 자에게 구원의 방법은 있는가를 묻는 소설이다. 그가 혹은 그들이 악을 행하기까지의 과정을 건조하게 나열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자는 존재하는가 역시도 묻고 있다. 신이 있다면 474의 의문대로 왜 목소리조차 들려주지 않는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정의와 화해, 신념, 양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오랜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당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니체의 말을 빌려올 것도 없이 『유령』은 스스로를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이 벌이는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폭력과 이해 없는 의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474. 소설의 후반부에 474는 수감 번호 대신 신해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그의 누나라고 하는 신해경으로부터. ‘유령’으로 살아가고 죽고자 했던 474는 해경의 등장으로 이름을 부여받고 괴물이 된 자신을 들여다보며 세계를 등진다. 괴물의 탄생과 죽음의 연대기를 그린 『유령』에서 나는 또 한 번 살아 있음의 증명인 식욕의 카니발 장면을 만난다. 괴물에게도 허기는 있고 간직해야 할 맛의 기억이 있다. 괴물의 소멸 앞에 인간은 한 끼의 밥을 마련해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