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원한 외출
마스다 미리 지음, 권남희 옮김 / 이봄 / 2018년 12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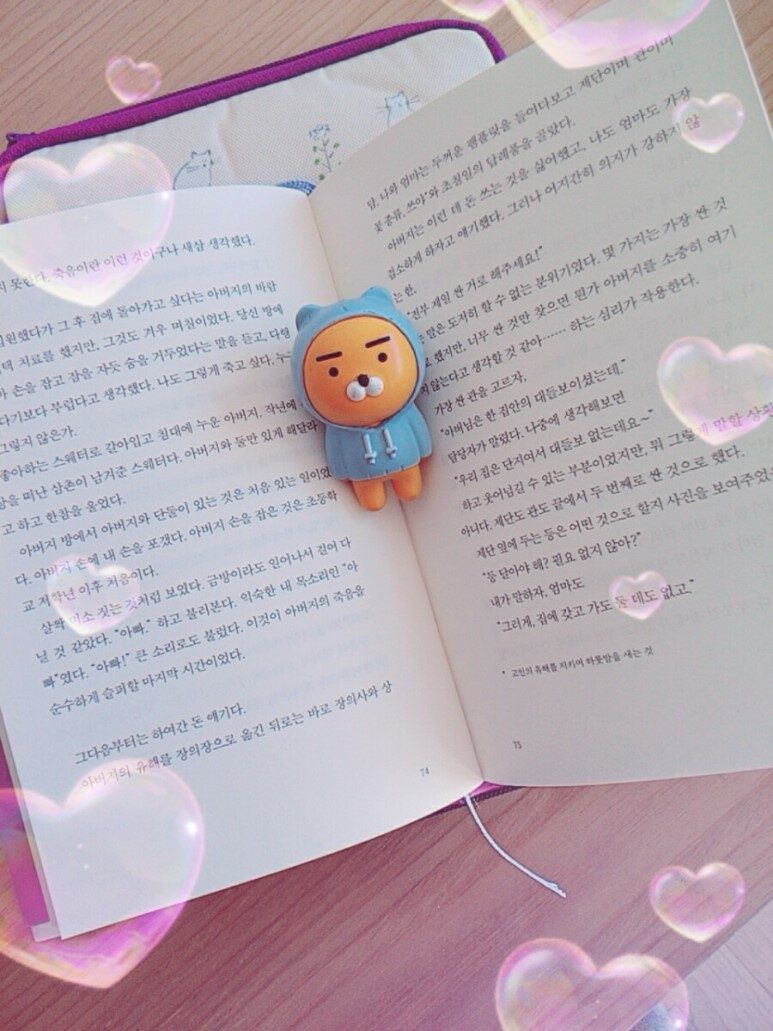

엄마가 떠나고 남은 일은 많았다.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집을 치우는 일이었다. 냉장고 문을 먼저 열었다. 그 안에는 초코빵, 김치, 고춧가루, 각종 장류, 어묵, 생선들이 그득그득했다. 겨울이 오면 김장을 하려고 방앗간에 가서 고춧가루를 한가득 빻아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해 겨울 엄마는 김장을 하지 못했다. 한 번 떠나면 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렸다. 상한 음식은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건 챙겨왔다. 그중에는 미숫가루도 있었다. 몸에 좋은 건 전부 넣었다며 추석 때 나에게 주고도 남은 것이었다. 엄마와 같이 산 동생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가 바로 해주었다고 한다. 더운 여름 호박죽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는 늙은 호박을 사서 자르고 끓여 주었다고 한다. 질투가 나고 서러웠다. 호박죽. 좋아하지도 않은 음식인데도 샘이 났다.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는데, 어른들 말은 틀린 것이 없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 쪽이 아리고 시리다. 엄마를 떠올리면. 울지 않으려고 한다. 우는 건 쉬운 일이므로. 대신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오랫동안 기억이나 추억을 붙들고 있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잊혔던 그리움과 기쁨이 생각 나면서 서글픈 마음은 사라진다. 엄마는 찹쌀떡을 좋아하고 이가 튼튼해 마른 오징어를 즐겨 먹었다. 돈이 생기면 옷 사러 가는 걸 신나했고 쓰지도 않을 거면서 살림살이를 사서 모았다. 주말이 되면 전화를 걸어와 잘 있느냐고 물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마음껏 좋아해 주었을 것이다.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즐거운 얼굴로 지내고 있으니까.
마스다 미리의 『영원한 외출』은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난 뒤를 기록한 책이다. 자식이 없는 삼촌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떠났고 암 진단을 받은 그녀의 아버지가 별들의 나라로 갔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의 일은 모른다. 마스다 미리는 차분한 그녀의 언어로 죽음이 남긴 허무를 어루만진다. 가족 중 누군가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슬퍼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럼에도 배는 고프고 아름다운 풍경에 눈을 빼앗긴다. 삶의 곁에는 죽음. 죽음 곁에는 삶. 두 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한다. 한 작가의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것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인데도 슬픔에는 눈물을 흘리고 기쁨에는 기꺼이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한다. 마스다 미리의 책을 전부 읽은 나에게 있어서는.
마스다 미리를 좋아해서 그녀의 책이 나오면 바로 산다. 『영원한 외출』이 나온 지는 알고 있었다. 선뜻 사지 못했던 건 책의 소개를 미리 읽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에세이와 만화에 등장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무뚝뚝하지만 딸들을 위해 만들기를 해주고 성질이 불같아서 외식이라고 할라치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그대로 돌아와 버리는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록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한국의 독자인 나는 국경을 넘어 일본 가정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영원한 외출을 했다니. 책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럼에도 마스다 미리가 받아들인 슬픔의 무게를 함께 이기고 싶었다.
책을 받아들고 소중한 마음으로 읽어 나갔다. 스무 편의 이야기에서 나는 감동과 기쁨과 슬픔을 느꼈다. 공감까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일은 돈 얘기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고개를 마구 끄덕였다. 돈과 서류 이야기. 절차와 기다림.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들. 눈물을 흘리고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건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의 일이다. 모든 절차와 서류 작업이 끝나고 빈 벽에 기대어 잠이 들 때 한없이 밀려온다, 서글픔의 시간은. 엄마는 두 대의 냉장고를 가지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밥통도 열 개나 되었다. 전기 프라이팬은 왜 그리 좋아했는지. 식구도 우리 셋뿐이었는데.
나는 그의 작품전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언제였던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해준 얘기를 떠올렸다.
그 사람은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때, 흰나비 한 마리가 계속 뒤를 따라왔다고 한다. "이별 인사를 하러 와주었네." 생각했단다. 멋진 얘기구나,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까지 팔랑팔랑 춤추는 봄 나비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야기가 사람을 강하게 한다.
(마스다 미리, 『영원한 외출』中에서)
『영원한 외출』을 읽는 동안 슬프지 않았다.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엄마를 떠올리고 추억할 수 있었다. 잘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책만 읽는 걸 한심해 하지 않았다. 어렸을 땐 돈도 없었을 텐데 할부로 백과사전을 사주기도 했다. 슬픔은 나중의 일이다. 죽음이 슬프지 않은 건 누군가 자주 그 사람을 떠올려 주는 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미숫가루를 타 먹으며 찌개에 고춧가루를 넣으며 엄마가 외출에서 돌아온 뒤 잘했어라고 말해줄 시간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