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룸
김의경 지음 / 민음사 / 2018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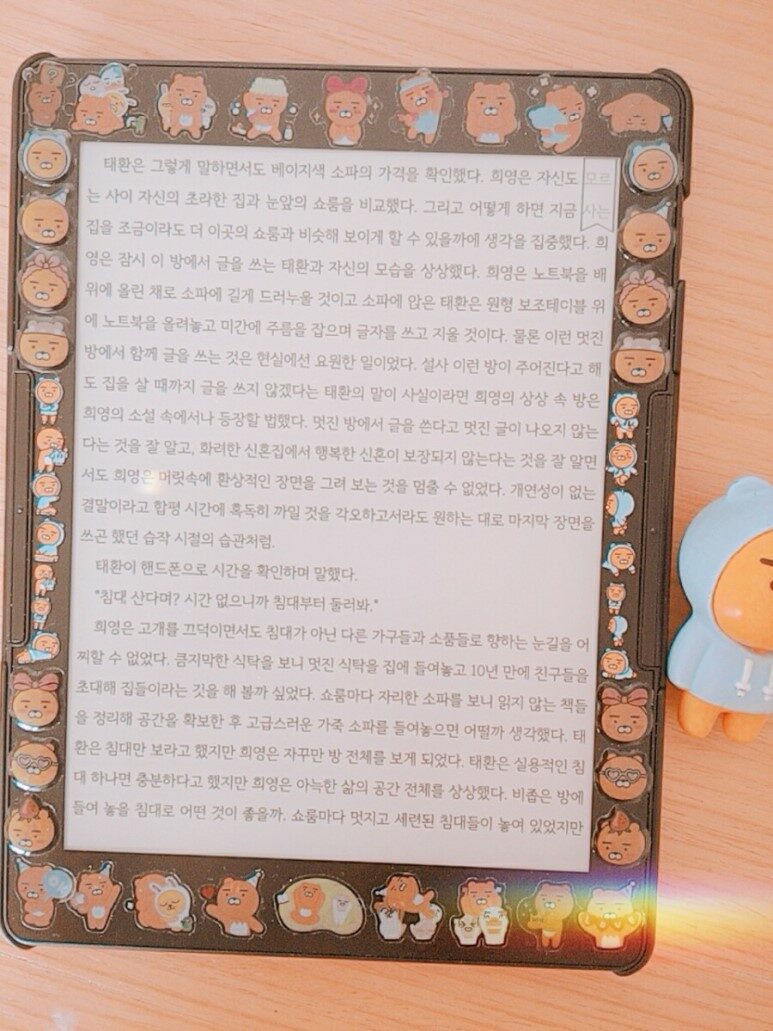

아프니까 청춘이다고 울고 싶은데 뺨 때리던 시기가 있었다.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그게 다 젊어서 그래, 청춘인데 무슨 엄살이 심해라며.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을 사다 주지는 못할망정. 아프면 청춘이 아닌 환자다. 보살피고 걱정해 주어야 한다. 김의경의 소설집 『쇼룸』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한다. 전작 『청춘 파산』에서 빚 갚느라 봉고차에 실려 전단지 돌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청춘을 담았던 김의경은 『쇼룸』에서 더 팍팍해진 청춘의 얼굴을 보여준다. 작가의 경험담을 살린 소설들은 현장감과 깊이가 더해져 읽을수록 짠하고 서글프다. 『쇼룸』에 실린 여덟 편의 소설들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화려한 '쇼룸'의 세계로 데려간다.
가구 공룡 이케아. 광명시에 생기고 고양시에도 생겼다는 이케아에 가본 적은 없다. 김의경은 소설을 쓰기 위해 여러 번 그곳에 다녀왔다.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는 가구들을 보면서 소설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처음부터 비싼 가구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이들이 2년에 한 번 꼴로 바꿀 생각으로 이케아에 간다. 조립도 해야 하고 물건도 직접 날라야 하는 불편을 돈으로 주고 사면서도 그들은 가구가 방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며 행복해한다. 이케아에 가는 이들은 적어도 방이 하나씩은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것들에게서 미세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 할 정도로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 아니 느껴야만 한다. 그래서 슬프다. 『쇼룸』에 실린 첫 번째 소설 「물건들」에서 '나'는 없는 게 없는 가장 비싼 물건값이 5000원인 다이소에 가는 것을 즐긴다. 1층부터 5층까지 물건으로 빽빽한 그곳에서 필요한 걸 산다. 필요하지 않아도 천 원, 이천 원인 물건들을 가책 없이 고른다. 많이 사도 이만 원이 넘지 않는다. 머그컵과 식기, 청소 도구, 애완용품을 고르며 월급날에 탕진잼을 만끽한다. 그곳에서 '나'는 애인도 만든다. 작지만을 빼고 다시 쓴다. 확실한 행복. 확실한 행복 앞에 붙은 '작지만'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더 작아진다.
「물건들」의 '나'는 다이소에서 사온 물건을 들여놓을 집이라도 있다. 「2층 여자들」의 여자들은 집이 없어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곳에서 의심과 불만을 숨기고 살아간다. 가난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잊게 만든다. 공용 부엌에 놓인 냉장고에서 누군가는 우유를 몰래 먹고 익명으로 게시판에 불만을 늘어놓는 등 소통의 창구마저도 닫아 놓고 살게 한다. 『쇼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편은 「쇼케이스」이다. 부부 작가인 그들은 생활에 치여 남편은 정육점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소설을 쓴다. 남편이 일하는 것을 모니터로 보면서 그가 가진 꿈의 크기가 오래되어 갈변한 고기의 빛깔처럼 변하지 않을까 아내는 걱정한다.
물론 이런 멋진 방에서 함께 글을 쓰는 것은 현실에선 요원한 일이었다. 설사 이런 방이 주어진다고 해도 집을 살 때까지 글을 쓰지 않겠다는 태환의 말이 사실이라면 희영의 상상 속 방은 희영의 소설에서나 등장할 법했다. 멋진 방에서 글을 쓴다고 멋진 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화려한 신혼집에서 행복한 신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희영은 머릿속에 환상적인 장면을 그려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개연성이 없는 결말이라고 합평 시간에 혹독히 까일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원하는 대로 마지막 장면을 쓰곤 했던 습작 시절의 습관처럼.
(김의경, 「쇼케이스」中에서)
「쇼케이스」의 희영은 침대를 사러 이케아에 남편과 간다. 남편은 겨우 시간을 냈고 이케아는 너무 넓다. 너무 물건이 많다. 희영은 옷장에 숨어 있다가 하루만 지내 보자고 한다. 멋지고 근사한 '쇼룸'에서. 남편은 말린다. 희영이 침대 대신 사서 들고 온 건 조명이었다. 환해진 집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자신이 일하는 정육점처럼 밝아서.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조명은 집 안의 때를 더 잘 보여줄 뿐이었다. 곰팡이와 거미줄, 잡동사니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다음날 희영은 조명을 중고 장터에 올린다.
내게는 가구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책장이 있었는데 처리했다. 책상 하나와 서랍장 하나가 남았다. 가구를 사지 않고 짐을 늘리지 않은 이유는 이곳이 정류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버스를 기다린다. 이곳은 잠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곳. 그러니 더 이상의 짐은 안 된다는 생각. 『쇼룸』의 인물들은 집이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이케아에 가서 쇼룸을 구경하고 예산에 맞춰 가구를 들여온다. 가구가 안되면 소품이라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도 그들에게는 필요하다. 천 원짜리 곰팡이 제거제를 사서 뿌리고 꽃과 잎사귀가 그려진 머그컵에 커피를 마신다. 쇼룸 전체를 사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며 조명을 사고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헤어진 전남친에게 배송을 부탁한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며 무소유가 곧 소유라는 프레임으로 청춘들의 희망을 파산 시키는 사회에서 소설가 김의경은 말한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반짝일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어야 하는 『쇼룸』이 아니라고. 알지 않는가. 『쇼룸』에는 가구들만 있을 뿐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최종 목표는 서랍장 하나를 없애는 것이다. 책상은. 책상은 필요하다.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