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흐르는 편지
김숨 지음 / 현대문학 / 2018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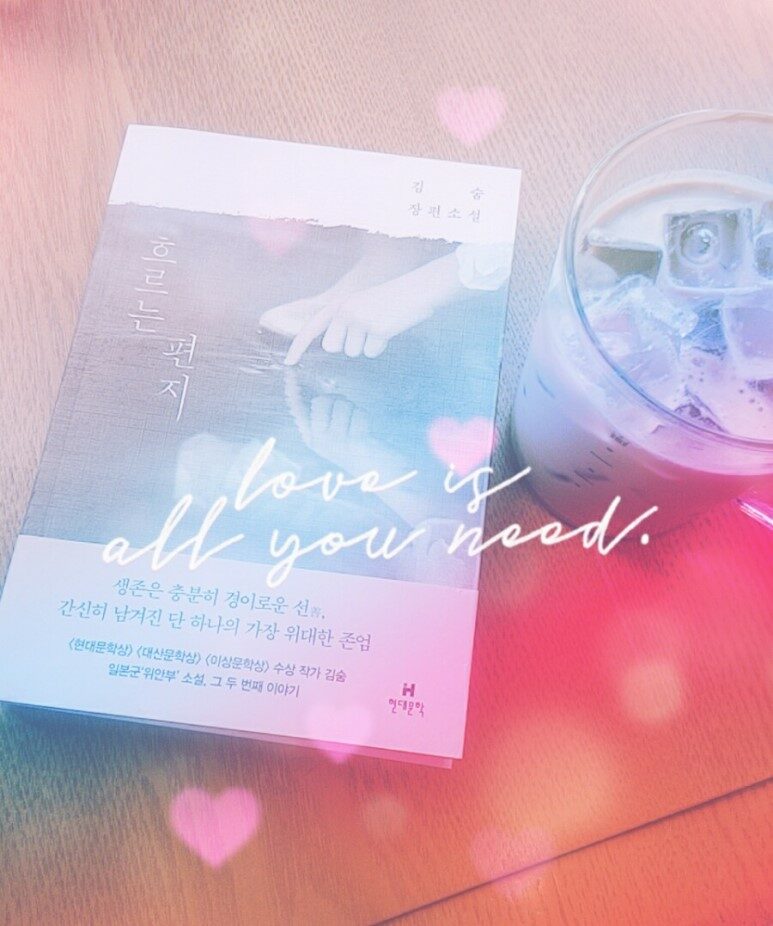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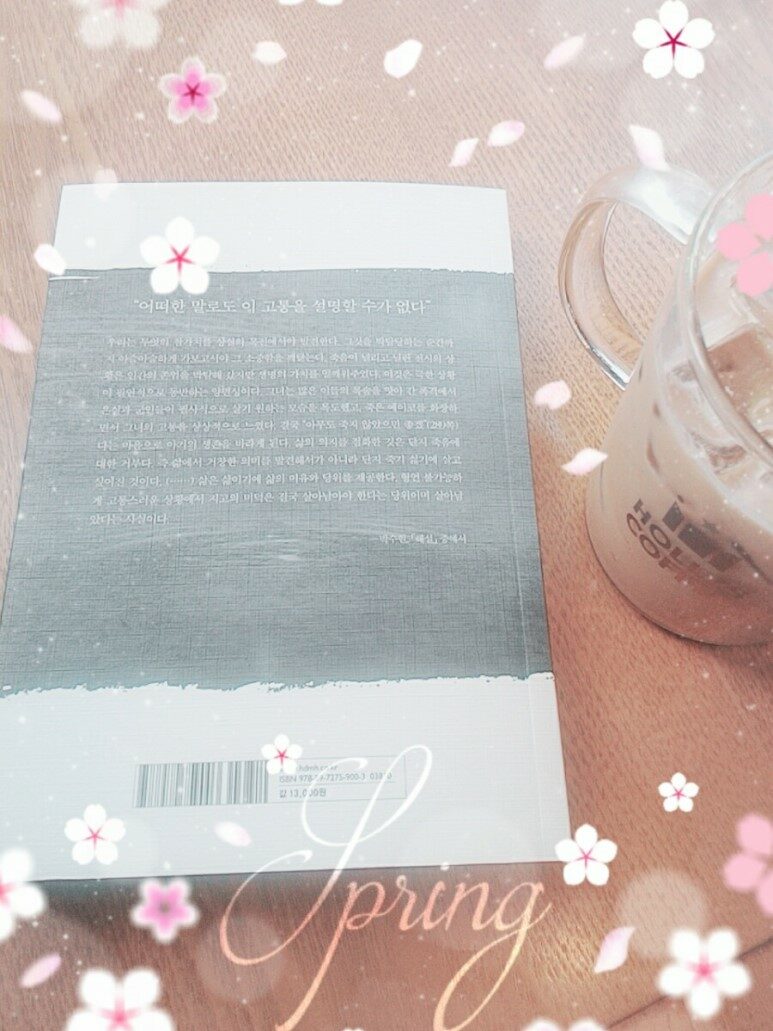
낙원위안소에 있는 금자는 글을 몰라 종이에 편지를 쓸 수 없다. 대신 강가에 나가 물 위에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적는다. 시골집에 있다가 공 씨가 비단 짜는 공장에 취직 시켜준다는 말에 따라갔다. 어머니는 아직 애기가 어딜 가냐고 말했지만 돈 벌어서 부쳐주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굶지 않을 것이라는 공 씨의 말에 따라나서기로 했다. 트럭에 올랐더니 맹순 언니도 와 있었다. 여자애들이 많았다. 대구역에서 기차를 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중국이었다. 열세 살 때의 일이었다.
금자는 위안소에서 후유코로 불린다. 군인이 지어주었다. 겨울 아이라는 뜻이었다. 아버지가 지어준 금자 대신에 그녀는 후유코, 도시코, 모모코, 후미코, 아에, 미쓰코, 요시코, 히후미, 유키코로 다양하게 불린다. 군인들은 그들의 정혼자나 아내의 이름을 붙여가며 밤마다 찾아온다. 김숨의 소설 『흐르는 편지』는 열다섯 소녀 금자의 공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일본은 대동아 전쟁 중이고 영문 모르고 위안소로 끌려온 소녀들이 있는 황폐한 그곳으로. 인간의 존엄은 무시되고 오직 전쟁과 추악한 욕망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김숨의 다른 소설 『한 명』에서는 위안부로 끌려간 노파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흐르는 편지』는 세계위안소를 거쳐 낙원위안소로 흘러온 소녀인 '나'의 상황을 그대로 들려준다. 전작에서는 노파의 회상에서 등장한 위안소의 모습은 『흐르는 편지』 안에서는 직접적인 배경으로 소환된다. 공장인 줄 알고 있는데 그곳은 군인을 받는 곳이었다. 위안소 주인 여자는 자신을 오카상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오카상의 뜻은 어머니. 금자는 말과 상황의 부조리함에서 의아함을 느낀다. 낙원위안소의 주인은 할아버지라는 뜻의 오지상으로 부른다. 오지상은 손녀뻘 되는 여자애들과 밤을 보낸다.
어머니, 나는 아기를 가졌어요.
오늘 새벽에는 초승달을 보며 아기가 죽어버리기를 빌고 빌었어요. 변소에 가려고 마당에 나왔다가요. 초승달에 낀 흰 달무리가 몽글몽글 떠오르는 순두부 같아 나도 모르게 입을 벙긋 벌렸어요. 그것을 먹으려고요.
어머니, 나는 아기가 죽어버리기를 빌어요.
눈동자가 생기기 전에······.
심장이 생기기 전에······.
(김숨, 『흐르는 편지』中에서)
금자는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아기를 가졌다.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는 아기가 죽기를 바란다. 악순 언니는 아기를 낳았다. 키울 수 없으니 중국 여자에게 보냈다. 악순 언니는 밤마다 헛소리를 한다. 누구라도 미칠 수 있는 곳이었다. 미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곳이었다. 위안소에서 그녀들은 허기와 밤마다 달려드는 군인과 냄새와 죽음의 공포와 싸운다. 위안소에서 일을 해 나갈수록 쌓이는 빚은 전쟁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강물 위로 쓰는 편지는 어머니가 있는 남쪽 나라로 흘러갈 수 있을까. 편지라기보다는 일기에 가까운 말들을 강물에 토해낸다. 배가 불러오면서 아기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과 아기가 태어나면 살 수 있을까 궁금함이 금자의 가슴을 후벼판다. 차라리 이것이 완전한 소설이 되기를 바란다. 『흐르는 편지』는 위안부로 끌려간 그녀들의 육성이 담겨 있다. 김숨은 할머니들 곁에서 이야기 듣기를 계속했다. 증언이 이야기로 탄생해 세상에 나왔다. 완벽한 허구는 없다. 허구 안에는 밝혀야 할 진실이 숨어 있다. 『흐르는 편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슬픈 역사를 가져온다.
편지는 흐르고 흘러 2018년에 도착한다. 굽은 산을 타고 계곡 아래를 흘러 도착한 편지에는 이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그녀들 스스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목소리가 들어 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세계위안소 23호 방에 시체처럼 누워, 2, 30분 간격으로 밀려드는 군인들을 받으며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왼팔 팔뚝에 '冬子(동자)'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동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먹물 묻힌 바늘이 살갗을 찔러올 때마다 손가락 하나도 내 게 아니라는걸.
(김숨, 『흐르는 편지』中에서)
이름을 지우고 산 세월이었다. 이름과 나이와 기억과 고향을 버리고 살았다. 10억 엔을 주며 잊어버리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을 향해 매주 수요일에 모여 외쳤다. 사과하라. 용서는 그다음이다. 아기를 가진 금자는 죽으면 끝이라는 언니들의 말을 애써 무시한다. 죽고 싶지 않다고 아기와 함께 지옥을 빠져나가 살고 싶다고 어머니께 편지를 쓴다. 삶의 존엄이 파괴되어도 생명은 피어난다. 죽음 곁에서 타오르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