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책] 아틀란티스야, 잘 가
허수경 지음 / 문학동네 / 2012년 8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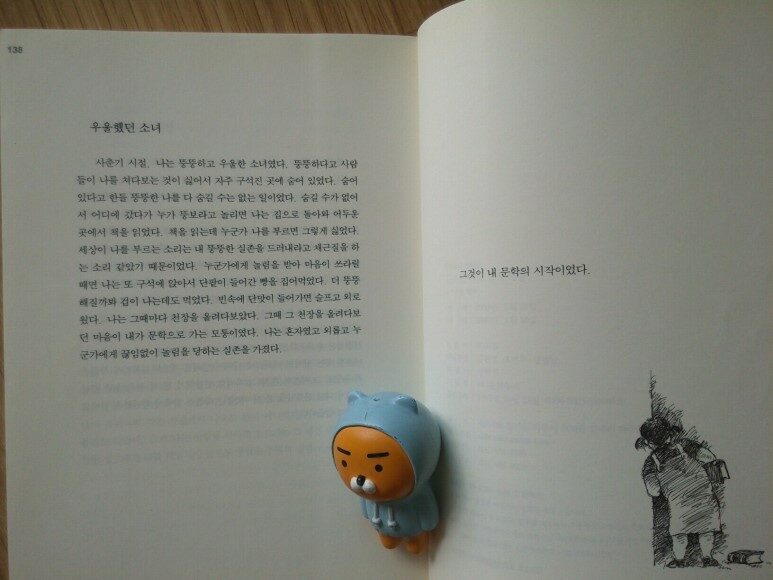
사춘기 시절, 나는 뚱뚱하고 우울한 소녀였다. 뚱뚱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싫어서 자주 구석진 곳에 숨어 있었다. 숨어 있다고 한들 뚱뚱한 나를 다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숨길 수가 없어서 어디에 갔다가 누가 뚱보라고 놀리면 나는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었다. 책을 읽는데 누군가 나를 부르면 그렇게 싫었다. 세상이 나를 부르는 소리는 내 뚱뚱한 실존을 드러내라고 채근질을 하는 소리 같았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아 마음이 쓰라릴 때면 나는 또 구석에 앉아서 단팥이 들어간 빵을 집어먹었다. 더 뚱뚱해질까봐 겁이 나는데도 먹었다. 빈속에 단맛이 들어가면 슬프고 외로웠다. 나는 그때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그 천장을 올려다보던 마음이 내가 문학으로 가는 모퉁이였다. 나는 혼자였고 외롭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놀림을 당하는 실존을 가졌다.
그것이 내 문학의 시작이었다.
(「우울했던 소녀」, 허수경 『길모퉁이의 중국식당』中에서)
아직도 그때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 열쇠가 달린 일기장을 사서 그날 일어난 일과 감정을 기록했다. 오늘은 엄마 집에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라든지 수학여행 가는 버스에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 갔던 일을 적었다. 엄마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빈 집을 서성이던 감정과 아무도 앉아주려 하지 않아 2박 3일 내내 선생님 옆에서 말없이 갔던 여행의 모욕감을. 이야기할 상대를 찾지 못한 나는 쓰고 또 썼다.
새 학기가 되면 애들은 짝꿍 만들기에 돌입했다. 그전 학년부터 친해진 애들끼리 패가 만들어지거나 번호대로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단짝이 되기도 했다. 나는 서툴고 어설펐다.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디 사니라고 물어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내지 못했다. 말이 없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집 사정을 훤히 알던 그 애들은 나를 무리에 끼어 주지 않았다.
겨우 짝꿍이랑 대화를 이어갈 때쯤 무리의 대장 아이가 짝꿍에게 눈짓을 했다. 복도로 함께 나가 소곤거렸다. 재랑 놀지마라고 말하는 입모양을 볼 수 있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우리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걸 곧바로 일러주는 것일까. 새 학기 첫날, 친구 사귀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분식집이 있었다. 그 집은 다른 집과는 다르게 닭을 팔았다. 조각낸 닭을 기름에 넣고 익는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천 원에 두 개를 살 수 있었다. 조금 더 몸집이 큰 닭 조각을 골라서 집으로 걸어갔다. 방금 튀긴 닭은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친구가 없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다.
여자는 하루에 이천 원을 주었다. 버스비와 군것질을 하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에 걸어갔고 집에 올 때도 버스를 타지 않았다. 버스비를 아껴 장판에 넣어 두었다. 나중에 엄마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줄 계획이었다. 남은 돈은 그렇게 학교에서 수군거림을 들을 때 속상한 마음이 허기로 돌변할 때 튀김집에 가서 닭을 사면서 썼다. 교복을 얼른 벗고 인간극장 같은 것을 보며 닭을 먹었다. 천천히. 오랫동안.
일기장에 경실이라는 이름 대신 미미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소녀와 텔레비전 불빛만이 밝은 세계라고 믿었던 중학교 2학년의 나는 만난다. 허수경은 산문집 『길모퉁이의 중국식당』에서 자신을 '우울했던 소녀'라고 밝혔다. 뚱뚱하고 우울해 자꾸 숨으려 하던 소녀. 뚱뚱해질까 봐 겁이 나는데도 단팥빵을 먹던 소녀는 『아틀란티스야, 잘 가』의 경실이로 찾아왔다. 시청 건설부 부국장 아버지와 예쁘고 날씬한 엄마를 가진 경실이는 뚱뚱하다. 경실이 말대로 겁나게 뚱뚱하다. 새 학기가 되어도 애들이 말을 걸어주지 않고 매해 교복을 새로 맞춰야 한다.
그런 경실이는 별을 바라보는 것과 만수 씨네 가게에 가서 찐빵 먹는 것을 좋아한다. 발레 하는 소녀가 그려진 일기장을 사서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써 나가는 경실이. 엄마는 계모임에 나가느라 저녁은 늘 경실이 혼자 먹는다. 엄마는 경실이가 중학교에 올라가자 도시락 싸는 걸 그만두었다. 경실이가 먹을 수 있는 건 김치나 오징어채. 그도 없으면 엄마는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으라며 돈을 주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외로워지는 경실이. 외로움이 경실이를 뚱뚱하게 만들었다. 잘 움직이지 않았고 살은 점점 불어나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게 싫어 방에만 있었다. 신체검사 날에는 저울에 올라서면서 울었다. 애들이 자꾸 몰려와 눈금을 보려 했다. 경실이 아버지는 공무원인데 돈을 받았다. 건축 허가를 내주고 받은 돈으로 건물을 샀다.
뚱뚱하고 못생긴 경실이는 남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자신의 말을 일기장에 쏟아 낸다. 친구가 별로 없다고 만수 씨네 찐빵 가게에 가서 숙제를 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아버지는 집안에서 손님처럼 군다고 써 내려간다. 이복 언니라고 밝힌 정우가 찾아와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에 사는 소녀 이야기를 짓자고 하면서 경실이는 새로운 이야기를 일기장에게 해준다. '아틀란티스에 살았던 멋진 소녀, 미미. 그 아이는 박경실, 바로 나.'
이야기의 주인이 되면서 경실이의 현재는 다르게 변해간다. 독서클럽에 가입하면서 미숙이와 용식이라는 친구를 만난다. 우리 모두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현실의 주인공이 될 순 없을지라도. 자신만의 낙원 아틀란티스를 만들어 가는 서술자는 될 수 있다. 그 시절 내가 쓴 일기에는 혼자 닭튀김을 먹고 장판 밑에 돈을 모으던 나와 언젠가는 작가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소망하는 다른 나가 존재했다. 닭튀김을 먹다 보니 교복이 작아졌고 체육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 있었다. 경실이 엄마처럼 매해 교복을 맞춰주는 엄마는 없었다. 알지도 못하는 선배의 교복을 물려 입고 학교에 간 첫날, 블라우스의 상표를 보여주며 어디 교복집에서 샀다며 자랑하는 아이들 곁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내가 처음에 이 집으로 올 때 나는 고마 숨어버리고 싶었제. 어디로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용기를 내서 들어와봤더니 니가 있더라. 니가 없었시모 내는 이 집을 아주 오래전에 나갔을 끼라."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 정우가 이 집에 머문 것이 나 때문이었다고?
"나 때문에?"
"니는 나처럼 외로운 아이 아이가. 척, 보고도 알아보겄더라. 안 그라모 별로 식탐도 없는 아가 와 그리 뚱뚱하겄노?"
(『아틀란티스야, 잘 가』中에서, 허수경)
국이 있다고 했는데 냉장고에 넣어 놓지 않아서 쉬어 있었다. 밥통에 밥은 오래 두어 노랗게 말라 있고 냉장고에는 쉰 김치가 전부였다. 닭튀김을 먹고 숙제를 했다. 꼭 내 숙제를 베끼는 아이가 있었다. 글씨를 잘 쓰고 마르고 얼굴이 하얀 그 애는 내게 공책을 달라고 할 때만 말을 걸었다. 그 순간을 위해 교과서를 보면서 문제를 만들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었다. 그때부터였다. 아름다운 세계는 소설 안에서만 만나기로 결심했다. 쉰 국과 김치가 있는 현실에서 난장이 가족이 살고 있는 허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
뚱뚱한 몸이 싫어서 혼자 우는 아이. 찐빵 다섯 개를 사서 혼자 먹는 아이. 경실이의 아틀란티스는 고대 전설로 남겠지만 나는 현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시인의 산문은 그게 사실이라서 가슴이 저린다. 시인의 소설은 고백이 허구가 되어서 마음이 애린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급하게 음식을 먹지 말라던 잔소리를 듣고서야 유년의 허기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여전히 밥을 먹을 때는 그 한 끼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말도 없이 먹는다.
얼마나 오래
이 안을 걸어 다녀야
이 흰빛의 마라톤을 무심히 지켜보아야
나는 없어지고
시인은 탄생하는가
(「눈」, 허수경)
뚱뚱한 실존을 가졌던 시인은 아프다. 겨우 눈 속을 헤치고 달려와 밤의 장막을 걷어내며 빛을 그러않았을 시인에게 오늘과 내일을 보낸다. 빛 안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남쪽 도시의 강물 소리를 담아 보낸다. 강 아래에서 밤새 시를 읽고 시로 살아가리라 다짐한 뚱뚱한 마음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