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은 잘 모르겠어 ㅣ 문학과지성 시인선 499
심보선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17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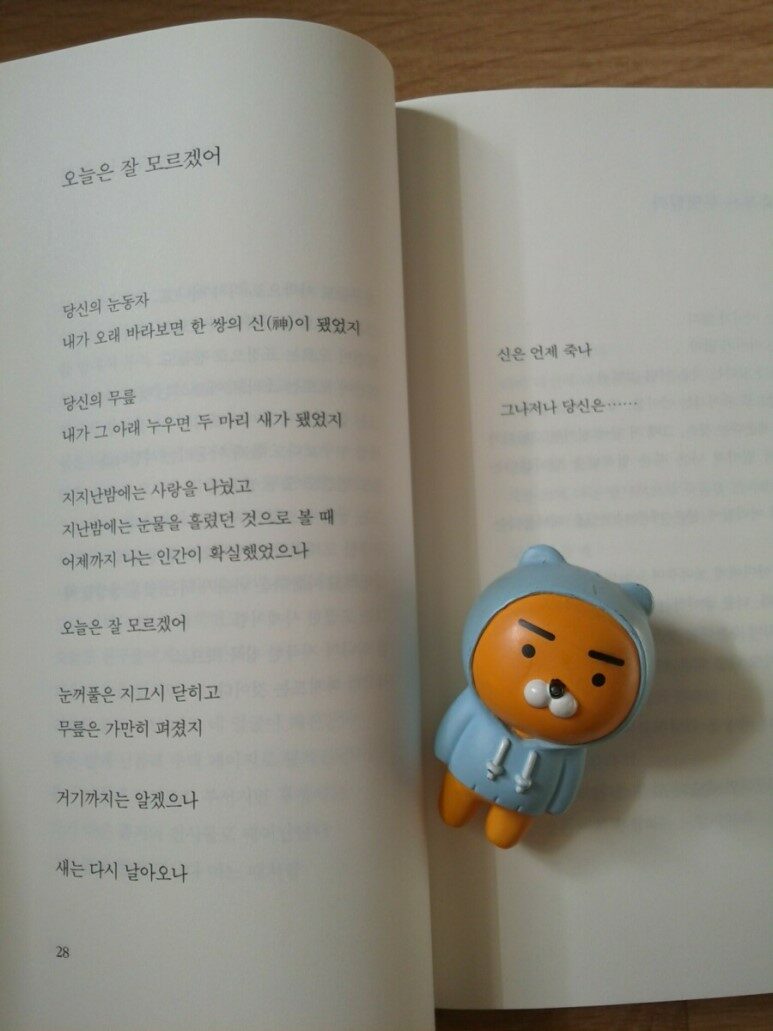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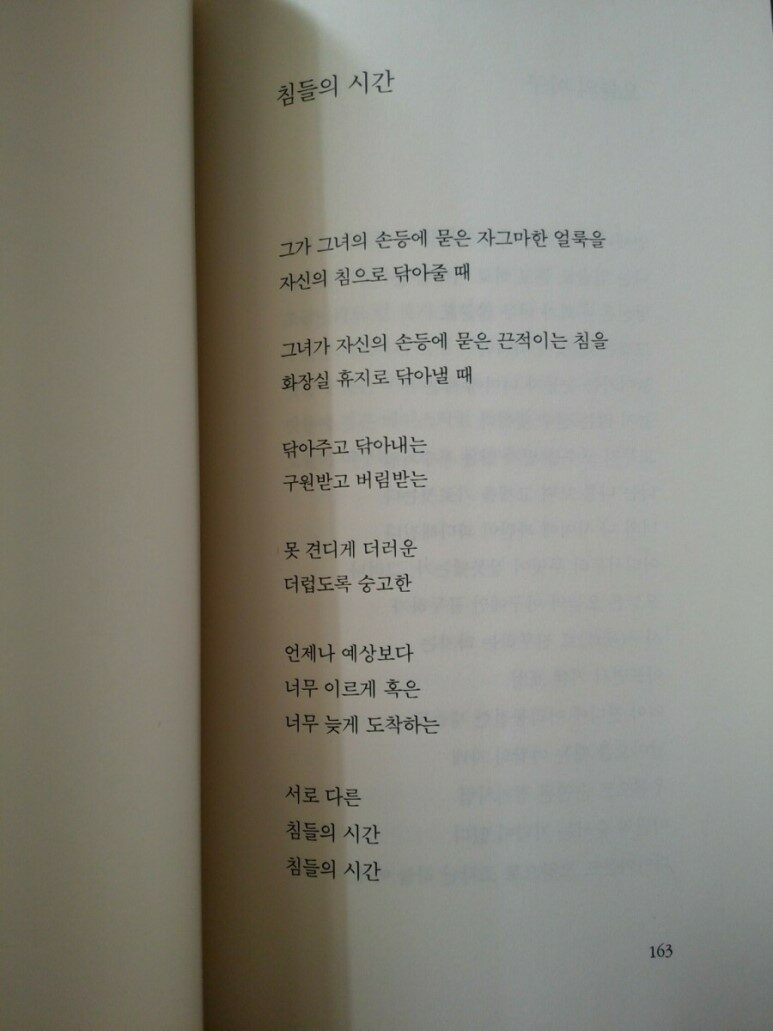
'오늘의 잘 모르겠어' 시집의 뒷면
-심보선
낯설고 아름다운 나라에 도착하면 늘 생각해.
이곳의 장례 전통은 어떠한가.
무덤 속 머리는 동서남북 중 어디를 향하나.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나를 기꺼이 맞이해준다면.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서 죽어도 될까요?
물어봐도 화들짝 놀라지 않고
열쇠와 필기구를 말없이 건네준다면.
객사의 원래 뜻은 손님으로 죽는 것.
가장 멀리 뻗은 길 따라 몸을 누이고
그때 밤하늘에 뜬 삐뚤빼뚤한 별자리 하나를
삐뚤빼뚤한 내 영혼에 딱 맞는 관으로 삼는 거지.
낯설고 아름다운 나라에 도착하면 늘 생각해.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얼마나 좋을까?
죽는 곳은 여럿이어도
태어나는 곳은 하나라면.
같은 세계에서 같은 사람들이랑
부디 단 한 번이라도
삶이 고단하지 않을 때까지
죽음이 서럽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문지 시집을 사는 날이면 버스에 앉아 시집의 앞면과 뒷면을 골똘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앞면에는 이제하 선생의 시인을 그린 그림이 있고 뒷면에는 시인의 말과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한을 건너가는 배 같은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의 섬으로 들어가기 전 배를 타고 건넙니다. 뒷면의 글을 읽으며 시들을 읽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낯설고 아름다운 나라에 도착하면 장례 전통을 먼저 생각하는 시인. 아름다운을 쓰려다가 앎이라고 쳤습니다. 오타에서 발견한 아름다운의 다른 이름은 앎일 수도 있구나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별자리 하나를 정해 그 속에 나의 영혼을 들여놓겠다는 시인의 말이 슬프고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앎을 시집의 뒷면을 읽으며 알아갑니다.
오늘은 잘 모르겠어
-심보선
당신의 눈동자
내가 오래 바라보면 한 쌍의 신(神)이 됐었지
당신의 무릎
내가 그 아래 누우면 두 마리 새가 됐었지
지지난밤에는 사랑을 나눴고
지난밤에는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볼 때
어제까지 나는 인간이 확실했었으나
오늘은 잘 모르겠어
눈꺼풀은 지그시 닫히고
무릎은 가만히 퍼졌지
거기까지는 알겠으나
새는 다시 날아오나
신은 언제 죽나
그나저나 당신은······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같은 것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햇빛을 먼저 방안에 들여주는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사람일까요. 어제는 나라는 사람이 이 세계에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오늘은 잘 모르겠네요. 당신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무릎 아래를 지그시 눌렀던 것 같은데 당신은 어제와 같은 당신일지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이기에 어제는 실수를 저지르고 슬픔에 빠져있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제와 같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르겠어가 아닌 오늘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시에서 오늘의 작은 가능성을 예상해 봅니다.
침들의 시간
-심보선
그가 그녀의 손등에 묻은 자그마한 얼룩을
자신의 침으로 닦아줄 때
그녀가 자신의 손등에 묻은 끈적이는 침을
화장실 휴지로 닦아낼 때
닦아주고 닦아내는
구원받고 버림받는
못 견디게 더러운
더럽도록 숭고한
언제나 예상보다
너무 이르게 혹은
너무 늦게 도착하는
서로 다른
침들의 시간
침들의 시간
여름날, 내 손등에 모기가 날아와 깨물었습니다. 마당에는 풀이 웃자라 있었고 비가 왔던 때라 모기는 극성이었습니다. 붉은 손등을 어쩌지 못하고 앉아 있을 때 당신이 다가와 열십자를 그려주고 침을 발라주었습니다. 더럽다 말했지만 나는 웃었고 당신의 얼굴도 환했습니다. 벌레에 물렸다고 말하면 재빠르게 달려와 침을 발라주고 그대로 약국으로 달려가던 당신의 뒷모습. 약보다는 당신의 두터운 손이 말간 침이 더 좋았지요. 우리가 침들을 나누어 가지던 시간, 우리가 서로의 몸에 십자가를 그려주는 순간, 세상은 고요하고 도착하지 않은 미래로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