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을 끝으로 저서계에서 은퇴했으니
책을 안쓴지 벌써 8년이 지났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쓴 책들을 평가하자면
"무슨 용기로 저런 책들을 냈을까?"라고 후회할만큼
과거에 쓴 책들이 부끄럽다.
물론 그 책들이 있었으니 오늘의 내가 있는 거겠지만,
누군가 내게 그 책들 얘기를 할 때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

얼마 전,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2004년에 내가 쓴 <대통령과 기생충>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약을 보내는 데 쓰였다는 것.
2쇄도 못찍고 절판된 게 그때는 아쉬웠지만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한 그 책이
2010년 1월, 100부 한정판으로 다시 나와 권당 2만원 (약지원금 포함)에 판매됐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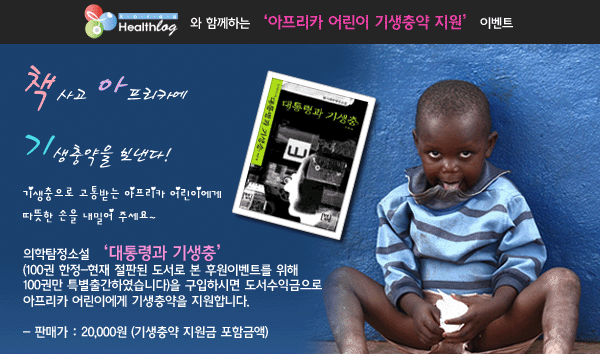
그때는 정준호의 명저 <기생충, 우리들의 동반자>가 나오기 전이고,
다른 기생충 대중서로 마땅한 게 없었으니 내 책이 선정되었을 텐데,
취지도 좋고 그렇게라도 내 책이 빛을 보는 게 고마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내 동의는 받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새로 찍는 것에 대한 저자의 인세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그때도 한푼도 못받았는지라...)
그 책이 새로 나와서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 읽힌다는 게 영 쑥스러우니까.
만일 내게 물었다면 "칼 짐머의 <기생충 제국>으로 하면 안될까요?"라고 우겨보다가
마지못해 수락하긴 했을 테지만,
그랬다면 어느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할 필요는 없었을 거다.
이 사태(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1) 책은 두고두고 남으니 쓸 때 잘 써야 한다.
2) 책이 절판됐다고 안심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