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애정에 마지않던 신형철 님이 품절남이 되는 날이란다.
이 글은 그러니까 축하하는 의미루다가 적는 리뷰가 되시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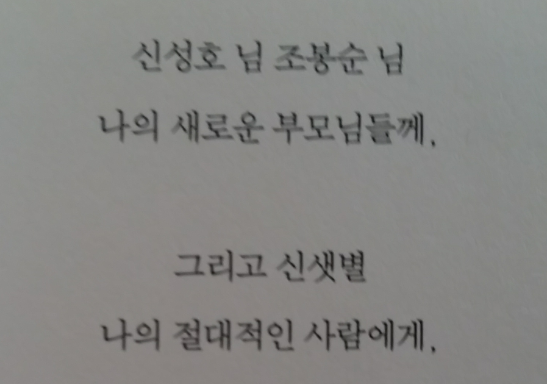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하고싶은 말이 좀 많지만 생략하고,
이들의 닭살돋는 애정행각에 눈 흘기고 흉보고 싶지만 그것도 생략하고,
결혼을 축하해주는 의미루다가 부조했다 생각하고 땡치려고 한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 이 책의 제목은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다.
2012년 여름부터 2014년 봄까지 영화주간지 <씨네21>에 연재된 글을 묶어서 낸 것이라는데,
연재당시, 문학평론가라는 추신을 늘 달았다고 엄살을 부린다.
"영화라는 매체의 문법을 잘 모르는 내가 감히 영화평론을 쓸 수는 없다. 영화를 일종의 활동서사로 간주하고 문학평론가로서 물을 수 있는 것만 겨우 물어보려 한다.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 하고."
내가 여기서 딴지를 거는 부분은 '제목'되시겠다.
실험이라는것은,
실제로 해보는 것이라는 얘기라고 해도 그렇고,
과학 실험이라고 해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방법이나 형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어도 그렇고,
해본다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정확해야 한다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고귀한 감정이기는 하지만,
항상 정확해야 하거나, 참이어야 하는 가치 명제는 아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했을때,
'변하니까 사랑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게 사람이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나의 견해일뿐이다.
사랑이 '참 또는 거짓', '맞다 또는 틀리다' 따위의 정오를 구분지을 수 있는 가치 명제가 아니기 때문이고,
'정확한'이나 '부정확한' 따위의 수식어로 수식을 하려 들면 안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
영민한 마케터의 돌출 효과를 노린 일종의 마케팅 전략인줄 알았다.
그런데 네개로 나눈 주제 중에서 한 꼭지 전체를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할 정도인걸 보면...
돌출효과나 마케팅 전략으로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겠다.
문학(글쓰기)의 근원적인 욕망 중 하나는 정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다. 그래서 훌륭한 작가들은 정확한 문장을 쓴다. 문법적으로 틀린 데가 없는 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문장으로 대체될 수 없는 문장을 말한다. 그러나 삶의 진실은 수학적 진리와는 달라서 100퍼센트 정확한 문장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문학은 언제나 '근사치'로만 존재하는 것이리라.('근사하다'라는 칭찬의 취지가 거기에 있다. '근사近似'는 꽤 비슷한 상태를 가리킨다.) 어떤 문장도 삶의 진실을 완전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도 상대방을 완전히 정확하게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진실은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을 느낀다."정확하게 사랑받고 싶었어." 이것은 장승리의 두 번째 시집 『무표정』(문예중앙,2012)에 수록돼 있는 시 「말」의 한 구절인데, 나는 이 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고통을 자주 생각한다. 최근에 본 두 편의 영화는 사랑받기 위해 삶과 타협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헌사처럼 보였다.(27쪽)
말
- 장 승 리 -
정확하게 말하고 싶었어
했던 말을 또 했어
채찍질
채찍질
꿈쩍 않는 말
말의 목에 팔을 두르고
니체는 울었어
혓바닥에서 혓바닥이 벗겨졌어
두 개의 혓바닥
하나는 울며
하나는 내리치며
정확하게 사랑받고 싶었어
부족한 알몸이 부끄러웠어
안을까 봐
안길까 봐
했던 말을 또 했어
꿈쩍 않는 말발굽 소리
정확한 죽음은
불가능한 선물 같았어
혓바닥에서 혓바닥이 벗겨졌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두 개의 혓바닥을 비벼가며
누구에게 잘못을 빌어야 하나
본문의 내용은 더 구체적이다.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제목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보았다.
장승리의 시 '말'의 전문도 옮겼다.
간혹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보통 더이상 더할 것이 없는 상태를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론 더이상 뺄 것이 없을 정도로 응축이키고 줄인 것을 '본질'이라고 봐야 하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결국, 더하거나 뺄게 없는, 군더더기가 없는 상태가 본질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람의 마음에 적용됐을땐 '본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장승리의 시와 저 상자안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확한'이 아니라,
본심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이면,
그 연꽃을 보고 부처를 향해 미소로 화답해 주는 누군가를 '아무나'가 아닌,
자기 입맛에 맞는 그(또는 그녀)로 골라갖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다.
책이야 공부하듯 볼 수도 있겠지만, 영화는 그냥 보고싶다는 거다.
영화를 공부하듯, 아트하듯, 내지는 평론하듯 볼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다.
내게 적어도 영화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보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보다가 쓰러져 잠이 들 수도 있고,
아무 것도 못 느끼고 잠이 들 수도 있다.
꼭 뭔가를 느껴야 영화를 제대로 못 것은 아니며,
더 더욱 영화에서 얘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과 정확하게 나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글로 적힌 책이 이런 기능이 제한적이라면,
영화는 글이 말로 변하고, 시각이 공감각으로 변하면서,
개인의 주관이 자유자재로 가감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밤하늘의 별만큼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화를 보고도 저마다 다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와 느낌이 일치하기도 쉽지 않지만,
일치했다고 하여, 그 누군가가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애기했듯 그 누군가마저도 '기준'이 되는 가치는 아니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어느 누구는 야한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군 남자의 찌질함을 잘 표현해 내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
어느 누군 삶의 본질을 파고들려는 영화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여,
이 영화가 다른 감독의 작품이겠는가?
아니면, 이들의 얘기 중에 영화를 잘못 본 오답 케이스가 있겠는가?
삶이란,
사랑이란,
어쩜 정확하게 실험 내지는 실행하는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삶 또는 사랑은,
몇마디 뭉뚱그린 말과 애매한 미소,
그리고 손짓, 몸짓의 성의 없는 허공에의 시도,
그 뒤에 오는 무수한 말줄임표(ㆍㆍㆍㆍㆍㆍ) 인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못갖춘 마디처럼,
생각지도 않았는데 문득 떠오른것마냥,
하지만 차오르는 것을,
슬픔 또는 눈물을 눌러삼키듯, 그렇게 꼭꼭 눌러삼켜야 할 날도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만큼이나,
각자 개개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껴가기도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하여,
진심이 오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진심이 오랫동안 오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방식대로의 사랑은,
말 그대로 자기방식대로의 사랑일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니까 말이다.
자기방식대로의 사랑을,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독선이다.
그리고 적어도 영화는 각자 취향껏 보고 싶은 영화를 보면 되는 것이다.
책을 취향껏 골라 보면 되는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적어도 독재국가 내지는 독재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눈멀고 귀먹어 결혼이라는 구렁텅이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선남선녀들은 예외로 하고 말이다, ㅋ~.
근데 정확한게 마냥 좋기만 한가?
내겐 어째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난 비어있다는 말이 좋다, 채워가질 수 있다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