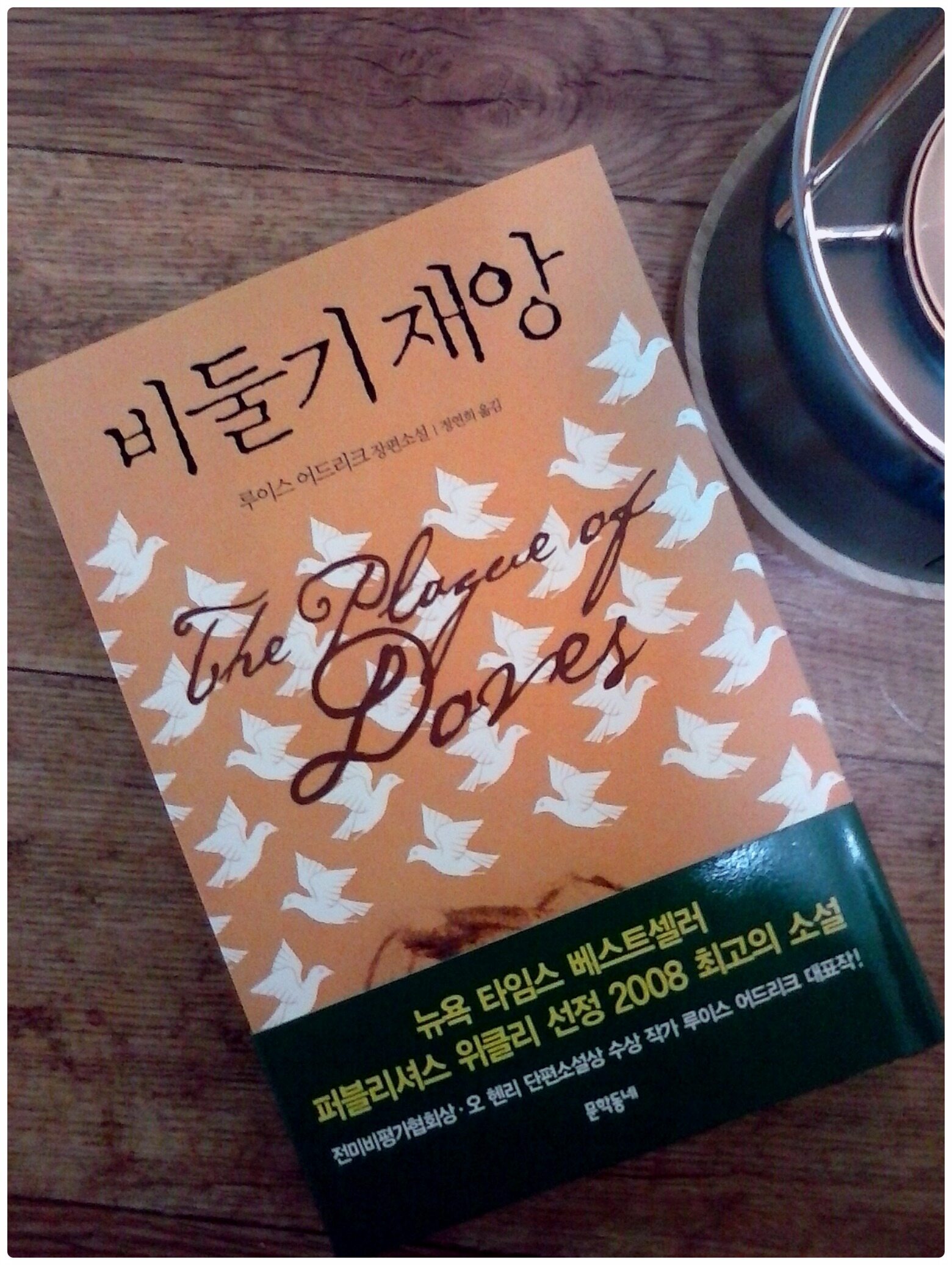-

-
비둘기 재앙
루이스 어드리크 지음, 정연희 옮김 / 문학동네 / 2010년 7월
평점 :



제목이 너무 무섭다, 조류공포증에 도시비둘기를 두려워하니 심장이 마구 두근거린다. 그냥 보아도 무섭고 푸득 날아오르는 조류 곁에 있다면 온갖 바이러스를 뒤집어쓰는 기분이 들어서 더 무섭다. 과장된 불안과 공포지만 강력하다.
<사랑의 묘약>에 이어(실제 이어진 내용이 아니라), 선주민의 삶을 다시 경험할 수 있어서 기쁘다. 오래 전 건조한 사회학/역사책으로 배운 북미대륙 선주민들의 삶이 이번에도 고달프다.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겼다니 더 귀하다. 논픽션처럼 읽지 않으려 애쓰며 읽었다.
법이 멀거나 없고 폭력은 가까운 시절, 일가족이 몰살당했다. 사적인 복수가 따랐다. 그래도 삶은 이어졌다. 운명이라 믿은 만남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도주도, 온 힘을 다한 애정도, 다른 이에게 끌리는 감정도 평범하고 현실적인 드라마 같다. 잔뜩 긴장한 기분이 잠시 풀린다.
역사의 어떤 내용은 지독하고 지겹게 반복된다. 누구를 무엇을 탓해야 할까. 오랜 마녀사냥의 역사와, 비난한 대상을 외부에서 지목하고 시선을 돌리고 잔혹하게 구는 집단 광기는 인간 집단 어디서라도 흔하디흔한 일일 뿐인지.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그들은 하얗게 칠한 상업용 운반기의 벗겨질 것 같은 표면을 보았고, 불에 탄 밀 아래로 녹색 풀밭을 보았고, 피를 빨아먹은 이처럼 다시 살이 차오른 버펄로를 보았고, 그 거대한 짐승의 무리가 무성히 자란 풀밭을 발굽으로 납작하게 짓이기며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고개를 들자 하늘은 새 떼로 뒤덮여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컴컴했다. 새들은 낮게 날았고, 천둥처럼 몰려왔다.”
소설이 반가운 이유는, 모든 비정한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고 밝히고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을 갈래갈래 풀어주는 듯한 문장을 따라 읽으며 사회시스템과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다.
인질극, 전쟁, 말 같지도 않은 신화 위에 세워진 사이비 신앙 공동체, 동조하고 찬양하는 이들. 20세기도 21세기도 한편에서는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끊임없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개발/활용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강력한 종교의 영향 아래 착취당하는 삶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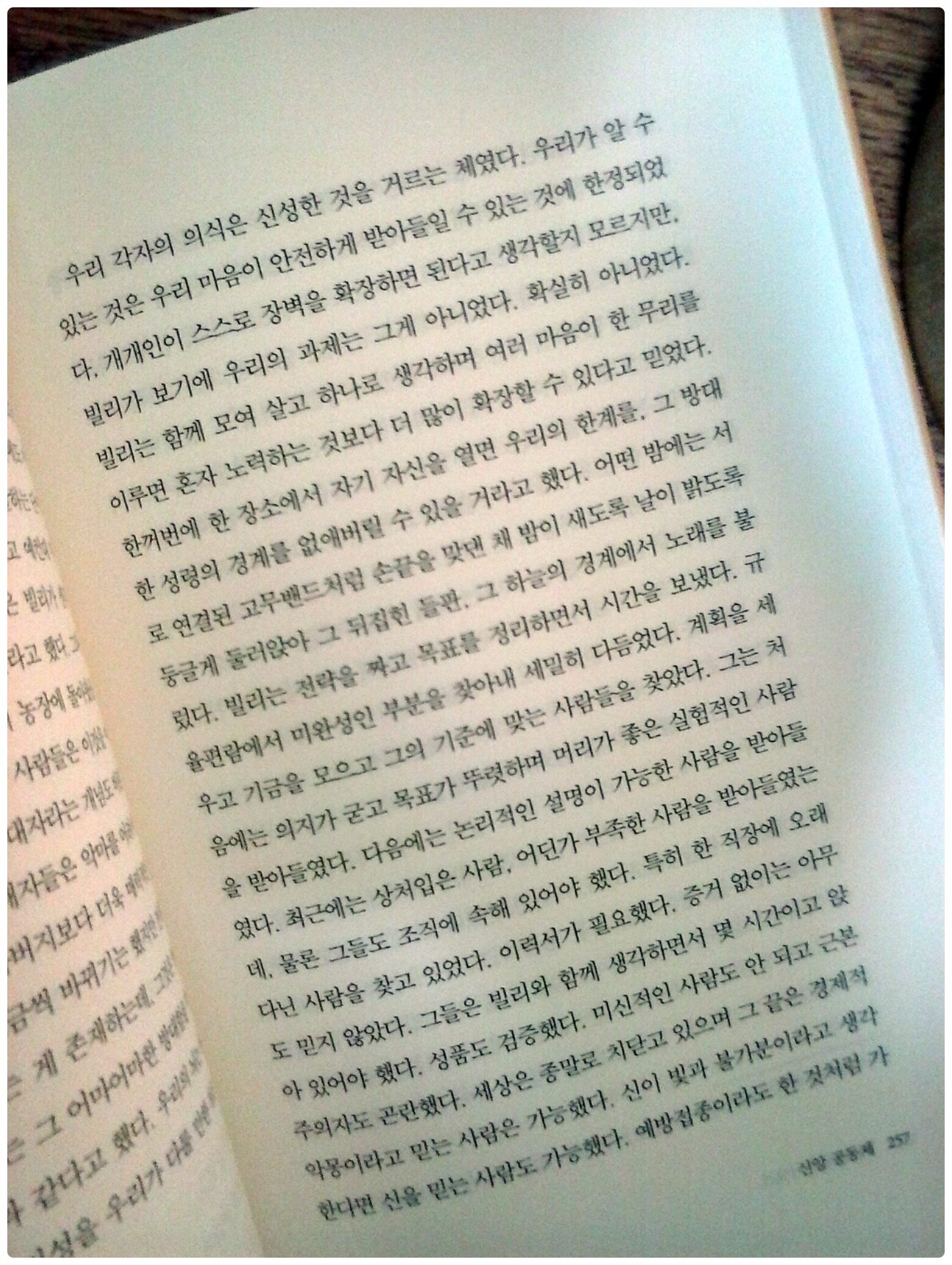
더 무겁고 어두울 지도 모른단 생각을 했지만, 툭 치고 나오는 위트가 즐겁다. 읽은 앞부분을 다시 펼쳐 보게 한 복선과 암시가 결론에 이르면 어두워진 하늘에 드러나는 8개의 별처럼 반짝인다. 잘 모르는 이들의 삶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본 화면처럼 떠오르는 여행이 가능한 것이 글이고 문학이다. 새삼스럽지만 대단히 아름답다.
내게도 오래 보관한 수집품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 잊고 사는 걸 보면 물질이란 생각보다 가치가 덜할 지도 모르겠다. 죽는 순간 생각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인간을 가두고 빼앗고 죽인 인류의 역사,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리만큼 먼 무관심이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