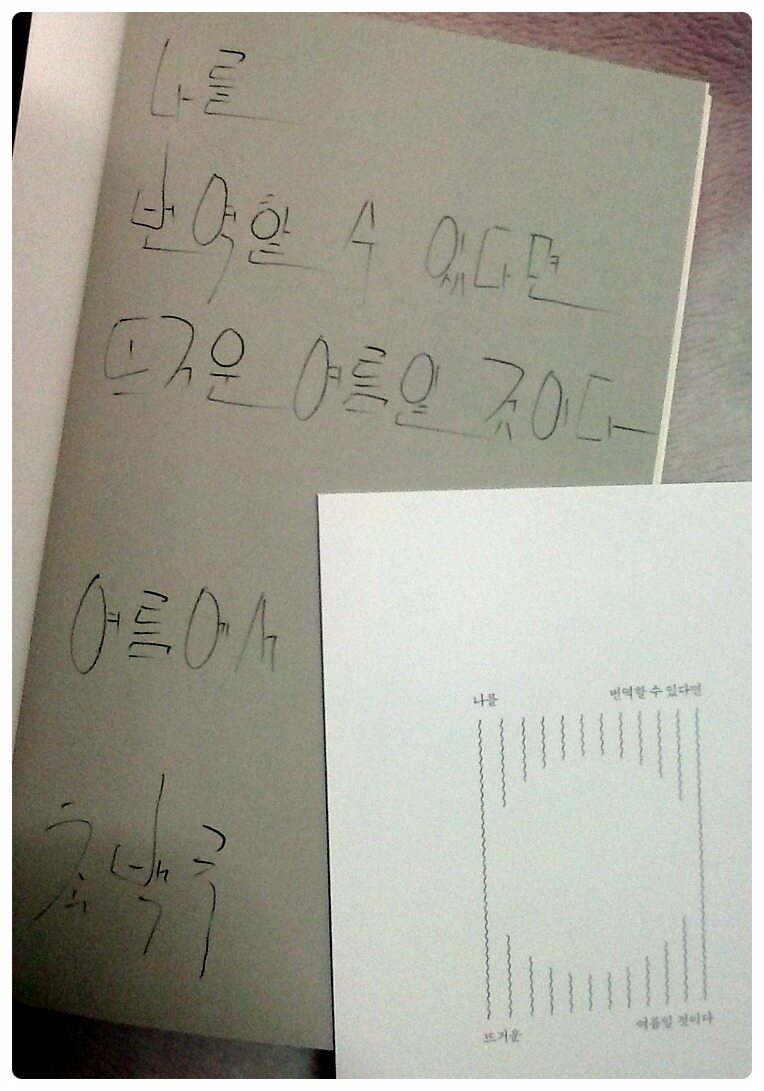-

-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 ㅣ 창비시선 469
최백규 지음 / 창비 / 2022년 1월
평점 :



시집을 여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듯했다.
봄 비... 인 듯 했다.
여름 장맛비처럼 빗줄기는 굵어졌지만
동글동글 눈처럼 부드럽게 내리는 여름의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그동안 많은 꽃이 차례대로 피고 지며
꺾이고 시들고 떨어지고 마른 향을 남겼다.
무거운데 가볍다.
90년대 생 시인이...
90년 대...(로 기억되는) 장면들을 어떻게 불러 주는 것일까...
모두가 나의 오독일까...
무엇이건 좋다...
이른 봄에 상상해보는 깊은 여름처럼
설레는 시집 선물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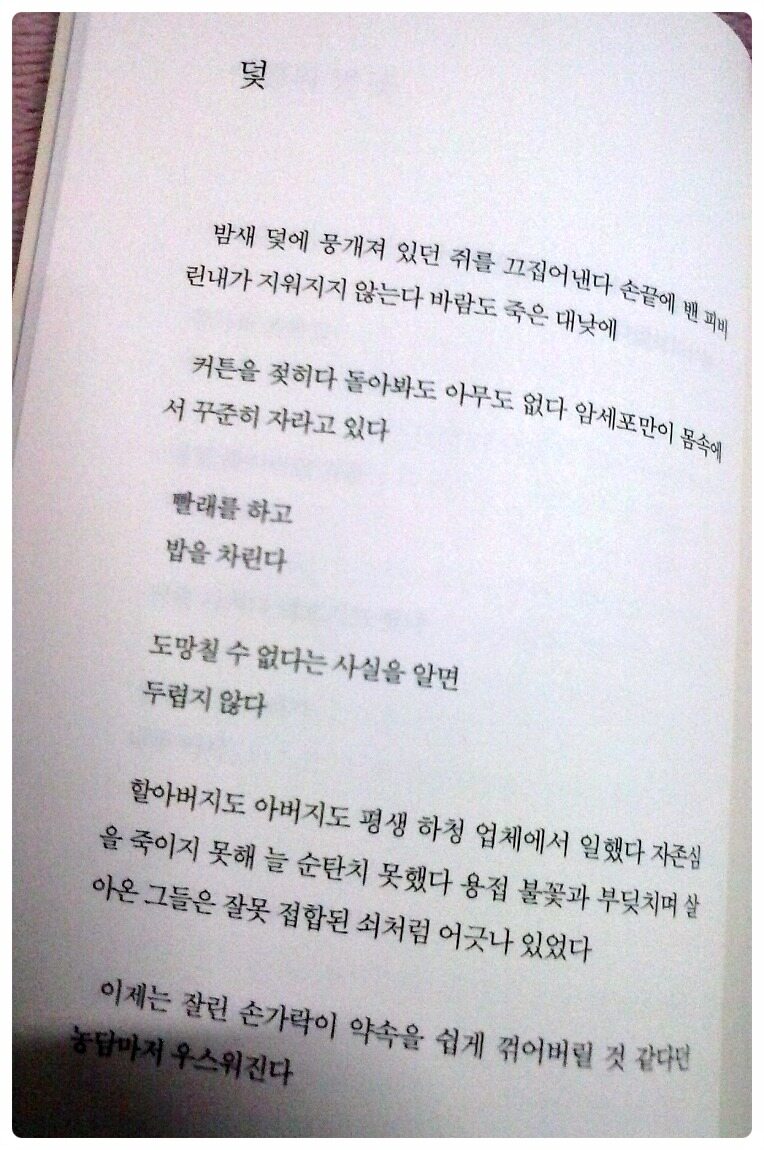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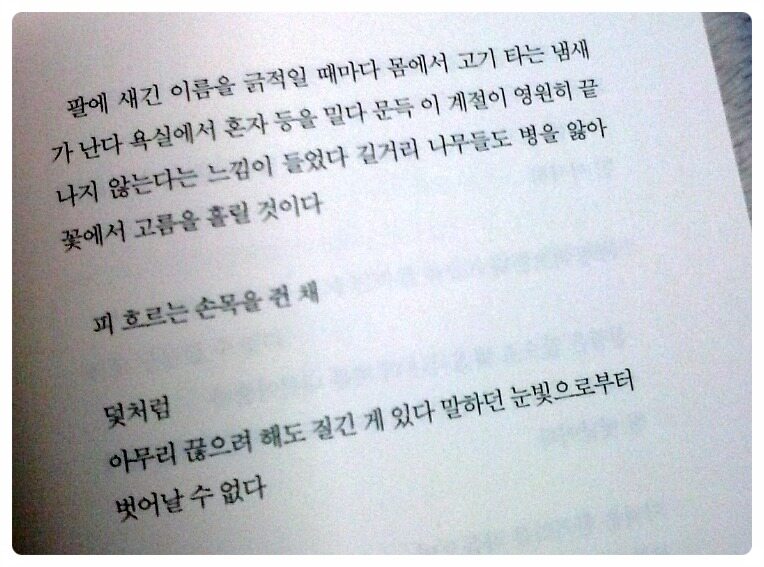
<덫>
행복한,
아주 행복한 감옥, 이라고 했던
오래 전 친구의 말....
모든 일상을 완벽하게 꾸리다
모든 이의 칭찬을 받다
아이가 노는 거실을 두고
베란다로 날아가 버린 선배...
도망칠 수 없어야 비로소 두렵지 않은 걸까...
그랬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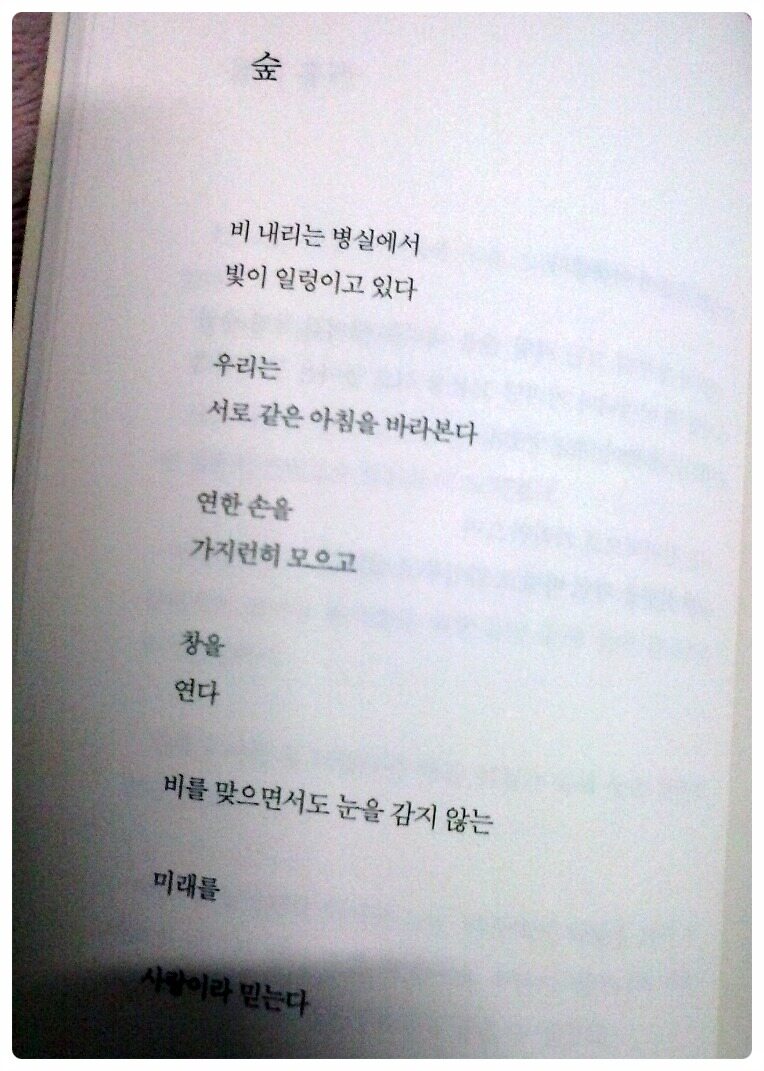
<숲>
숲에 가고 싶은 것인지
숲이 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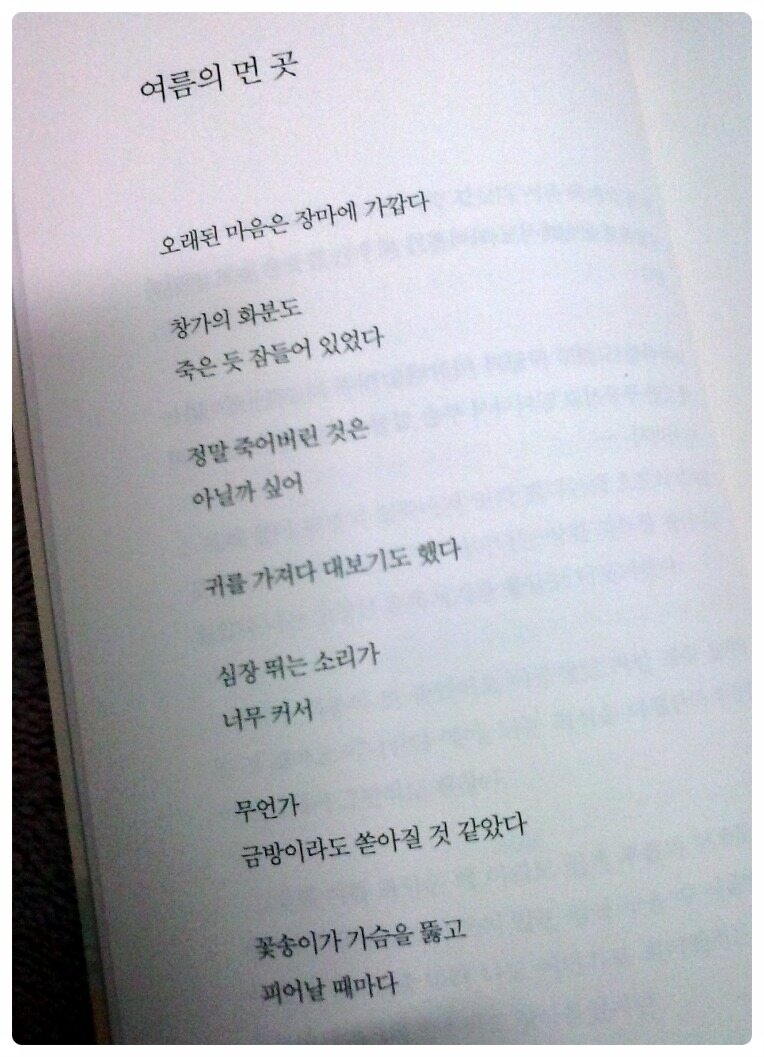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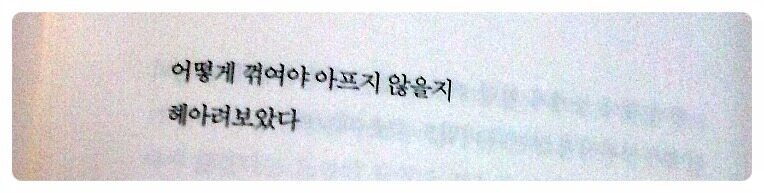
<여름의 먼 곳>
시인의 가슴에선 꽃이 피어나고
내겐 가끔 뾰족한 싹이 돋는다.
시인은 아프지 않게 꽃을 꺾어 보려 한다는데
나는 헤아려볼 생각도 없이 잡아 뜯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