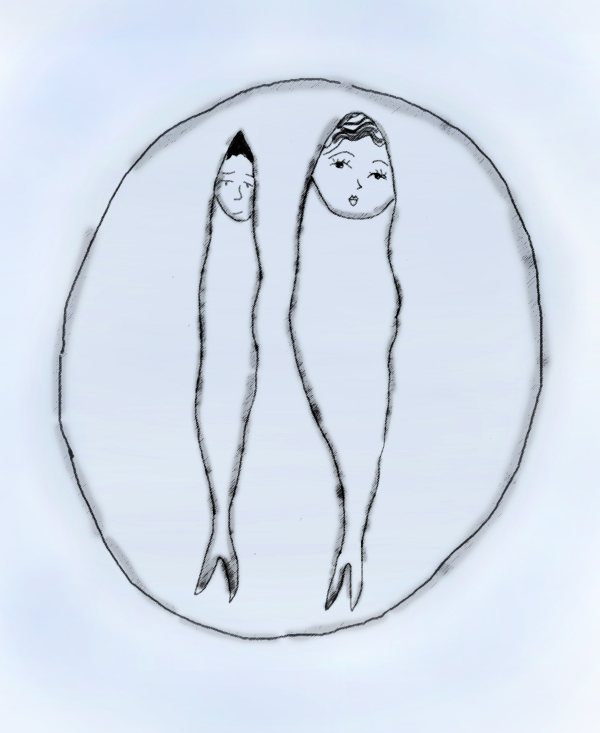
죽을 때 질질 끌지 않고 한 번에 딱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열두 천 번은 한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하고 겁이 나고 알 수 없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래서 잠이 들어 그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 주위를 보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가끔 넌지시 죽는 것에 대해서 우회하여 말을 꺼내면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친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저 생활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인사를 하며 매일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죽음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들은 나도 그렇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어쩌면 나만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나보다 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죽음을 봤다. 죽는 순간의 모습을 본 건 아니고 나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죽었다. 죽음은 곧 헤어짐이다. 헤어진다는 말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말로 나는 받아들였다. 이별은 어쩌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느낌이지만 헤어진다는 말은 더 이상의 만남은 없다는 느낌이 강하다.
글을 쓰면서 등장인물을 여럿 죽였다.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대해서 떠올려야 했다. 글을 적어야 하니까. 그래서 죽음이 있는 여러 소설을 읽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게 와닿지 않아서 구구절절하게 적지 못했다. 그렇다고 죽었다,라고 간결하게 끝을 내기도 너무 싫었다.
나의 아버지는 질질 끌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고통으로 점철된 많은 날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가래를 뱉어내지 못할 정도로 폐가 망가져 죽음을 맞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년 동안 대학병원의 입원실에서 밤새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아버지를 돌보았다. 오전에 의사가 왕진을 돌 때 어머니가 교대를 하러 오시면 나는 씻고 일을 하러 가서 저녁에 병원으로 와서 밤을 보냈다. 아버지는 고통이 점점 깊어져 갔지만 나을 수 있다는 알량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나아서 나온다 한들 생활은 엉망이 될 것이다. 점점 지쳐갔다. 입던 옷을 계속 입고 양말을 이삼 일씩 신었다. 집이 있되 집이 없는 사람 같은 꼴이 되었다. 어머니 역시 병간호를 하느라 혈압이 190까지 오르고 모든 것이 힘들었다. 아버지가 중환실에 입원을 하면 오히려 나았다.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밤에 그냥 잠을 잘 수 있었다.
신경을 쓰지 않고 밤새 잠이 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행복이었다. 평소에는 그런 것 따위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때는 그랬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가족들이 쉴 수 있는 방이 있었다. 큰 방인데 그 방에는 환자 가족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잠을 자거나 중환실에서 환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방이었다. 나는 그 방에서 며칠 잠을 잤는데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어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들어가서 그냥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발은 현관에 내고 방 위에 누워서 잠을 잤다. 방에는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춥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 5시에는 보일러를 끈다. 잠이 들었지만 잠이 들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잠. 그런 잠 속에서 그래도 깨지 않고 계속 자고 있는데 한기가 드는 느낌이 들었다. 아 보일러를 끈 모양이다. 일어나야지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또 따뜻함이 몰려왔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깊은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포근한 깊은 잠이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 그럴 리 없지만 나는 이대로 잠의 세계에 빠져들어 깨어나지 않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수선하고 아무리 해도 정돈되지 않는 삶, 꼬이고 꼬인 생활 속에서 만나는 따분한 사람들. 이대로 깨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뭐 어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여행을 할 뿐이다. 하지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직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버지를 놔두고 먼저 깨어나지 않는 건 너무나 비겁한 짓이다. 그날 눈을 떠보니 한 가족의 할머니가 내가 너무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자니 두꺼운 이불을 두 겹이나 덮어 주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아직 중환실의 면회 시간은 아니었다. 12월 중순. 벌써 이 년째. 아버지를 떠올리면 어린 시절 나를 데리고 다니며 장난감을 같이 만들며 즐거웠던 기억 밖에 없다. 중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대화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었다. 둘이 같이 집에 있게 되어도 서먹하기만 했다. 아버지에게는 가족 밖에 없는데 손을 뻗으면 아버지가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다. 개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아버지도 집에서 키우는 개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보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왔다. 개 역시 아버지를 제일 좋아했다. 생신이라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개가 보고 싶다며 다 먹지도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개는 오지 않는 아버지를 현관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렸다. 죽음이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는 것이다. 영영 보지 못하게 된다. 그게 싫다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헤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덜 할지도 모른다.
코로나 시기에 친구가 사고로 죽었다. 아직 어린 아들을 구하려다 그만 죽고 말았다. 사고라는 건 그렇게 일방적이다. 여지를 두지 않는다. 죽는 사람은 죽고 마는 것이다. 친구가 죽은 것은 나에게는 기묘한 충격이었다. 친구와 그렇게 친한 게 아니었다. 같이 어울렸지만 나와는 맞는 구석이 없었다. 그러나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맞는 구석이 없는 게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걸 알았다. 우리는 꽤 잘했다.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서로 맡은 파트를 열심히 했다. 정확하게는 친구가 사장이고 내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친하지 않더라도 서로 맞는 구석이 없더라도 일은 그렇게 몇 년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매일 보다 보면 정이라는 게 든다. 그런 친구가 사고로 죽어버린 일은 나에게는 알 수 없는 무력감을 잔뜩 안겨 주었다. 잠이 들어 꿈을 꾸면 예전 세월호 때 꾸던 꿈이 연장이 되었다. 배 안에서 물이 점점 차올라 숨이 막혀 컥컥하다가 고통스러워 잠에서 깨어난다. 친구는 어린 아들 둘을 구하려다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다. 물이 점점 나의 몸속으로 기어들어와 숨이 콱 막히는 그 기분 나쁜 느낌을 잠이 들면 느끼게 되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