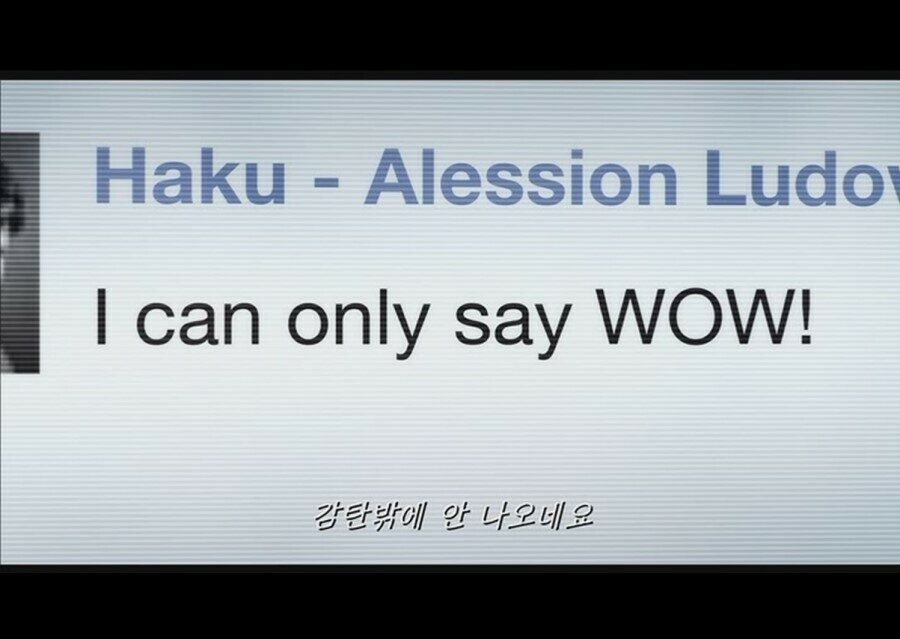









2007년 시카고의 역사책을 쓰려고 하던 아마추어 사진작가 존 말루프는 역사책을 쓰는데 필요할까 싶어 동네 창고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에서 30만 장이 넘는 사진 필름과 상상을 넘어버린 잡동사니를 구입하게 된다. 몇몇 사진을 인화해서 프로 사진가에게 보내보곤 했지만 답이 없어서 그저 처박아 두었다가 그 필름을 스캔을 하기로 한다. 스캔을 해서 봤더니 1950년대부터 1970년의 시카고와 뉴욕의 풍경, 그 풍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담은 사진이었다.
존은 일일이 스캔을 뜬 파일을 사진 블로그를 만들어 올리게 된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하기에 이른다. 놀랍다, 굉장하다, 감동적이다, 마음에 쏙 들어요,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놀라운 발견, 고마워요, 대단해요 등 반응이 엄청났던 것이다.
존은 사진들을 뉴욕 미술관에 보내지만 퇴짜를 맞고, 자신이 사진 전시회를 직접 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일일이 사진을 인화하고 다듬고 액자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존이 봤을 때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들은 잘 나온 사진보다 정말 좋은 사진이었다. 그래서 시카고 문화센터에 전시를 신청하게 되고 그 결과는 역대 최다 관람객이 보이면서 정보라고는 오직 이름뿐이었던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가 시작된다.
비비안 마이어? 비비안 마이어!! 비비안 마이어~~~ 비비안 마이어... 모든 매체는 거리의 사진가 비비안 마이어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존은 비비안 마이어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들을 보면 주로 인간을 담았다. 수필은 강과 바람 바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소설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사진은 보는 이들의 똑같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사람을 담은 사진에는 각각 다른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은 로베르 두아노의 익살스러움도 있고, 샐리 만의 빛도, 다이안 어버스의 금기를 담은 사진도 있고, 앙리 카르티에 브레숑의 찰나도 사진 속에 있었다.
메리 엘렌 마크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다. 그녀가 비비안의 사진에 대해서 놀라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사진을 담아냈다고 한다. 초상권이나 저작권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지만 비비안의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사람들을 담기 위해 요즘처럼 망원렌즈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찍기 위해, 촬영하기 위해, 그 사람을 담기 위해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는 것이다.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 같은 사진은 담아낼 수 없다. 비비안 마이어의 행적을 보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사진은 그녀를 ‘관계’에 대해서 다가가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흔히 찍는 셀카의 개념도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비비안 마이어였을지도 모른다. 그 이전의 사진가들은 전혀 거울에 리플렉션 되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보다는 개념이 없었다. 95년도에 일본의 히로 믹스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일본 열도와 전 세계 사진 바다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그때 히로 믹스가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을 코니카 빅 미니로 셀카를 찍었지만 비비안 마이어가 훨씬 이전에 이미 시도를 했다. 하지만 비비안 마이어는 아마추어 무명이라 그녀의 사진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
영화는 비비안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매개로 서서히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간다. 이 다큐의 특징이라면 다큐멘터리의 확정적인 개념에서 살짝 벗어나 비비안의, 비비안이라는 사람의 미스터리를 비비안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비비안 마이어를 통해, 그녀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순열주의’ 또는 ‘집단주의’ 또는 ‘엘리트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당시에는 무명, 아마추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창조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엘리트주의 속에 속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할까. 지금도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작금에서는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높이 평가하는 사진가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전과 다르게 말이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피카소 역시 냉대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자신의 재능은 자신 혼자서는 무리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주고 유지시켜주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떠 밤에 눈을 감기 전까지 꽤 열심히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전이 몇 해 전에 서울에서 있었다. 요즘은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유명 사진가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나는 늘 이것을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사 진부였을 때만 해도 사진 전시회를 보려면 그곳까지 가야 했고, 돈을 구해야 했고, 학생이라 문전박대당하기도 했고, 늦어서 문이 닫혀 돌아와야 했다. 그런 경험을 가진 나로서는 지금처럼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사진들을 귤을 까먹으며 볼 수 있다는 것에 늘 놀라고 있다. 그러니 지금 내 주위에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것들은 꽤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더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 싶다.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는 다큐 같지 않은 다큐였다. 흥미진진함이 영화 전반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밖에 없는 일생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도 생각하게 한다. 영화를 보면서 비비안 마이어도 찾고 자신도 찾아가길 바라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등을 구부리고 고독하게 창조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영화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