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아이폰3GS를 꺼내보았다. 11년 정도 되었으니(보통 오래된 기기를 말할 때 나온 년도에서 말한다. 아이폰3GS가 나온지는 11년이 되었지만 몇 년 사용하다가 아이폰4s로 바꿨으니 정확하게 11년 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일일이 따지고 들면 까다로운 놈,라고 할까 봐 그냥 11년 된,으로 표기) 켜지기나 할까 싶었는데 웬걸, 켜지는 건 물론이고 사진첩이나 카메라, 인터넷 같은 것도 구동이 된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이 글도 아이폰3gs로 적고 있는데 메모장에 타이핑하는 반응이 아이폰6s보다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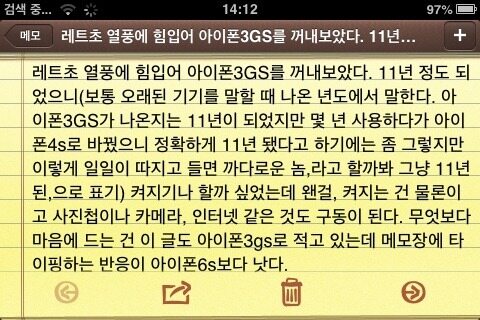




아이폰3GS는 가볍다. 나는 화면이 큰 폰을 들고 다니지 않음에도 아이폰3GS는 엄청 가볍다. 한 손에 쏙 들어온다. 뭐니 뭐니 해도 지난 기기에 대한, 레트로에 기인하는 점이 마음에 든다. 레트로, 레트로 하는데 레트로라는 의미는 복고주의다. '레트로'라는 말에 적응이 될 만하면 '뉴트로', '빈트로', '힙트로' 같은 새로운 언어가 쏟아진다. 헬린이나 달린이처럼 조금만 적응했다 싶으면 이 세계는 그런 나를 무시하듯 새로운 언어를 마구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공유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왜 복고를 좋아할까. 외국의 소설가(이름을 까먹었다)의 한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고향을 좋아하고 이 땅을 무한애정 하는 이유는 유년의 기억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년의 기억이 닦아 놓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아픈 기억보다 따뜻한 추억이 일상을 보내는 동안 손상받은 마음을 단단하게 안아준다. 그리하여 기꺼이 그 세계 속에 발을 담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더불어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기기가 열풍을 타게 된다. 지나간 과거의 기기로 무엇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걸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동안 추억에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꺼낼 수 있다.
근래에(몇 년 전부터)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은 80년대나 90년대가 주가 된다. 또 8, 90년대 유행했던 영화가 다시 재방되어 인기를 새롭게 얻는다. 요컨대 '백 투 더 퓨처' 시리즈가 그렇다. 1, 2, 3편 모두 보는 동안 영화가 천재잖아! 하는 생각이 든다. 영화 속 미래는 2015년도인데 이미 5년 전의 시대가 되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왜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의 시대가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될까,라고 한다. 최근의 원더우먼이 그랬고, 범블비 역시 배경이 80년대이며,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들을 범블비가 줄곧 틀어댄다. 넷플의 최고의 작품이었던 '기묘한 이야기' - 스트레인저 띵스, 의 배경도 80년대다. 영화나 드라마나 추천을 잘하지 않지만 이건 정말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왕좌의 게임과 함께 더불어 보고 나면 세계관이 넓어진다. 물론 나만의 생각이지만. 응답하라 시리즈 역시 90년대의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대를 학생으로 보냈던 세대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8, 9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분야에서든 지휘를 하거나 창작을 총괄하는 수장이기에 현재 활발하게 8, 90년대가 배경이 되는, 위에서 말하는 레트로의 영화, 드라마, 음악이 나온다.
지금의 시대를 학생으로 보낸 사람들이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에는 아마도 전 세계를 뒤덮은 감염병에 대해서 파고들어 영화, 음악, 드라마가 지금보다 훨씬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려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지금의 시대에 대해서, 감염병과 감염병을 둘러싼 '어떤' 것에 대해서 제대로 난도질해주길 바란다.
어떻든 나는 그런 레트로 기기인 아이폰3GS를 반나절 사용해 보았다. 그리고 새벽에 잠이 깨서는 한 시간 정도 메모를 했는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소모되지 않았다.
#
새벽에 잠이 깼다. 이대로 잠시 누워서 음악을 좀 들었다. 5시 12분. 내 것 같지 않은 시간. 벌써 날이 밝아오는 걸 보니 이제 밤의 길이도 조금씩 줄어든다. 그에 맞게 피부도 변해간다. 아직 어둠은 짙은데 창으로 어둠이 밀려가는 것이 보인다. 지금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 일 때문에 타지방으로 가서 오전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 기분과 흡사할 것이다. 여행이 아니라서 좋은 곳에서 일박을 하지 않고 타지방- 서울이라고 치자, 남산타워가 보이지만 어딘가 변두리 같은 인상이 풍기는 골목의 모텔이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제대로 잠을 설쳤다. 그 전날 짐을 풀고 잠시 나가서 문을 연 바비큐집에서 바비큐 치킨과 맥주를 마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 샤워를 하고 나서 누워 티브이를 트니 피곤한 몸과 몽롱한 정신으로, 그대로 밤을 지새웠다.
잠이 오는데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묘한 밤을 보낸다. 낯선 곳이 주는 기묘함과 익숙지 않은 익숙함이 점점 잠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5시가 좀 넘어 날이 조금씩 밝아온다. 일어나서 씻고 나갈 채비를 한다. 눈을 뜨면 늘 변기에 앉아 배설을 했지만 낯선 곳에서는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 예민한 성격과 예민한 몸인 것이다. 밖으로 나오면 날이 밝아 있지만 아직 해는 떠 있지 않다. 으스름한 푸른빛이 감도는 새벽의 시간. 누구도 보이지 않고 첫차의 버스가 지나가고 이른 출근을 하는 자동차들이 보인다. 새벽의 공기가 맑다. 공기 속에서도 낯선 냄새가 난다.
그 냄새에 이끌려 새벽 장사를 하는 육개장 집을 찾아 들어간다. 사람들이 꽤 있다. 메뉴는 딱 두 개. 육개장과 갈비탕. 오늘 일을 보려면 아침은 먹어둬야 한다. 육개장을 주문하면 3분 만에 나온다. 코를 찌르는 육개장의 냄새 때문에 허기가 제대로 깨어난다. 후추를 좀 뿌리고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뜬다. 미원의 맛이 강하지만 그래서 좋다. 뜨거운 음식은 오히려 빨리 먹게 된다. 새벽의 시간 육개장을 먹는 사람들은 매일 이 시간에 이 벌건 음식을 후루룩 먹는 것일까. 다 먹고 밖으로 나오면 데워진 얼굴에 시원한 낯선 바람이 와서 닿는다. 그 기분이 나쁘지 않다. 아직 해는 떠 있지 않다. 낯선 곳을 두리번거리며 좀 걷는다. 모르는 곳의 새벽 거리를 거니는 재미가 있다.
분명 매일 잠을 자는 익숙한 집이지만 낯선 잠을 잘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잠을 설치고 잔 듯 만 듯 새벽에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 베개를 좀 잘 못 베고 잤다거나, 전기장판의 온도가 좀 높아졌다거나 하면 예민한 몸은 낯선 곳으로 받아들이는지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듣게 한다.
새벽의 어스름한 시간은 대학교 모델링을 하며 밤을 지새울 때를 소환하기도 하고, 군대에서 마지막 야간 근무를 서면서 맞이한 여명을 떠올리게도 한다. 군대에서 야간 근무는 2시간씩 하는데 4시부터 6시까지의 마지막 근무는 오히려 낫다. 고참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고 본격적인 아침을 맞이하기 전 시간은 고요하고 평온하다. 야간 근무가 제일 좋은 시간은 20시부터 22시까지다. 9시에 저녁 점오가 있어서 무시무시한 점오 시간을 피할 수 있다. 막사 밖에서 막사 안의 점오 시간의 긴장된 순간을 보는 것 또한 묘미다. 큰 소리도 들리고 긴장된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근무가 끝나고 들어가서 씻고 그대로 누워 아침까지 잠들면 된다.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점오가 끝나고 고참들에게 한 따까리 받을 시간에 근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열외다. 근무가 끝나고 들어오면 전부 잠들어 있기에 배가 고프면 대기실이나 세탁실에서 초코파이나 빵과 우유를 먹기에도 편하다. 요즘도 가끔 새벽에 들어와서 군복도 벗지 않고 세탁실에 앉아 빵을 먹는 꿈을 꾼다. 도대체 제대한 지가 언제인데 군대의 꿈은 질리지도 않고 꿈에 나타날까. 꿈이라서 호러스럽게 흘러간다.
빵을 다 먹고 군복을 벗으려 하면 몸에 군복이 피부처럼 붙어 버려서 벗겨지지가 않는다. 꿈은 왜 늘 이럴까. 고작 스무 살 남짓 남자들이 하는 군생활인데도 비리가 많다. 마음에 들거나 고참에게 잘 보이는 놈은 어떻게든 야간근무의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더러운 세상이다. 하지만 군대라도 새벽을 맞이하면 나쁘지 않다. 저 멀리서 밝아오는 여명을 맞이하는 하루는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색채를 보는 건 나에게 있어서 가지지 못한 컬러를 채우는 일. 우리는 하루에서 새벽을 빼먹고 살아가지만 새벽이 없다면 그 멋진 저녁도 없을 것이다. 새벽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게 한다.
##
아이폰3GS가 감성의 물건으로 치부되어서 그런지 이 폰으로 으스름한 새벽에 메모를 하니 글 내용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