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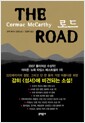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광고에 실린 서평들이 하도 요란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캄캄하고 막막하더니 아무리 책장을 넘겨도 변함이 없었다. 통상 이 정도쯤 되면 서서히 드라마도 생기고 독자를 위한 쉼표도 찍어줄 거라고 생각한 페이지가 되어도 작가는 끈질지게 시종여일. 이제는 소설 속의 부자보다 읽는 내가 더 지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별다른 사건도 없이 그저 암담 무인지경을 더듬는 소설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는 것. 결국 반나절 만에 책을 다 읽어버리고 말았다. 계속 한숨 쉬고 답답해 하면서!
일흔이 넘은 작가가 열 살 난 아들을 보며 떠올린 소설이라는데, 그래선가 부성이 안간힘으로 붙잡는 희미한 희망이 느껴진다. 물론 확신은 없다. 섣부른 희망을 담기에 작가의 가슴은 너무 명징하다. 하지만 그래도 소설의 마지막에서 내가 읽은 것은 희망이다. 혹은 암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정직한 위로다.
소설을 읽고 나서 [눈 먼 자들의 도시]를 떠올렸다. 둘 다 인간에 대해 절망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밖에 만들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말한다. 알레고리가 좀더 풍부한 것은 사라마구였다. 하지만 둘을 떠올린 건 비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유사함 때문이었다. 노년의 작가들이 이렇게 인간에 대해 정직하게 말할 힘을 지녔다는 게 놀랍기도 하다. 어설픈 잠언을 허용하지 않는 날 선 지성도. 사라마구의 소설은 정말 읽기가 힘들었는데, [로드]는 단숨에 읽었고 읽고난 뒤에도 마음이 덜 무거웠다. 역시 아버지의 시선이 깔려 있어서일까? 대신 그만큼 상상의 여운이 오래가지는 않았던 점이 아쉽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아주 싫었는데 이 책을 읽고나니 오히려 이만하면 살만하군, 하는 오기 같은 게 생겼다.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힘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