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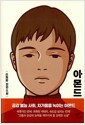
-
아몬드 (양장) -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년 3월
평점 :

절판

서점 한 켠에 켜켜이 쌓여 있는 책 표지를 무심히 보았다. 소설 코너에 있지 않았다면 만화로 착각할뻔 했다. 거기에는 한 소년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이 소년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쓰여져 있는 제목이 보였다. 아몬드.
"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도 그것을 가졌다.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물론, 아몬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다 읽고 나서도 아몬드가 가리키는 은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겠다. 주인공인 윤재에게 이상이 있는 딱 그만한 크기의 '편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절대 깨지지 않는 딱딱한 질감의 그 무엇(본성, 고집, 특징 같은 것)을 말하는지. 프롤로그의 아몬드를 '편도체'로 치환해 읽으니 조금 웃긴다. 그래서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고유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여겨본다.
성장소설이지만 마냥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다. 서두에 등장하는 사건을 담담히 묘사하고 결국 홀로 남겨진 윤재를 대할 때는 마치 <7년의 밤>의 서원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둘은 달랐다. 한 사람은 피해자의 자식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해자의 자식이다. 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일렉시티미아'라고 하는 감정표현불능증에 걸린 소년이고, 다른 한 사람은 트라우마에 의해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린 소년이다. 공교롭게도 읽다보니 이야기 속에 윤재와 대비되는 곤이가 등장한다. 버려졌다고 생각하기에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으로 사는 그 아이는 윤재가 성장하여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여는 또다른 계기가 된다.
생각해보니, 아몬드를 '일렉시티미아'로 치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겐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선천적인 감정의 씨가 있다. 더러는 말랑말랑한 씨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금방 떠지고 싹을 틔우지만, 어떤 이는 아주 딱딱한 것을 갖고 있어서 전혀 싹이 트지 않거나 싹을 틔우기에는 아주 많은 인고(忍苦)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의 존재를 느낄 수는 없다.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순간순간에 반응하며 즉시적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행동은 결국 내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아주 작은 씨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고립된 자아, 내면의 표출, 외부와의 갈등, 자신의 본성에 대한 탐구, 조화로운 자아의 형성은 성장소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소재들이다.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무엇도 정답이 아닌 무수한 갈래 길의 하나일 뿐이다. 그것이 선천적/후천적으로 보다 분명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희미하게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런 방황과 그것을 직면했을 때의 내 몸부림들이 지금의 나를 키운 것이다. 성장소설의 좋은 점은 이제는 잊혀진 내 무언가를 한번쯤 무심코 더듬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있는 것도 같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 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걸 바란단다. 그러다 안 되면 평범함을 바라지. 그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말이다, 평범하다는 건 사실 가장 이루기 어려운 가치란다. - 90쪽
사람들은 계절의 여왕이 5월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어려운 건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거다. 언 땅이 녹고 움이 트고 죽어 있는 가지마다 총천연색 꽃이 피어나는 것. 힘겨운 건 그런 거다. 여름은 그저 봄의 동력을 받아 앞으로 몇 걸음 옮기기만 하면 온다.
그래서 나는 5월이 한 해 중 가장 나태한 달이라고 생각했다. 한 것에 비해 너무 값지다고 평가받는 달. 세상과 내가 가장 다르다고 생각되는 달이 5월이기도 했다. 세상 모든 게 움직이고 빛난다. 나와 누워 있는 엄마만이 영원한 1월처럼 딱딱하고 잿빛이었다. - 152쪽
-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시멘트를 쫙 들이붓고 그 위에 자기가 설계한 새 건물을 지을 생각만 해. 난 그런 애가 아닌데... - 167쪽
삶이 장난을 걸어올 때마다 곤이는 자주 생각했다고 한다. 인생이란, 손을 잡아 주던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잡으려 해도 결국 자기는 버림받을 거라고. - 168쪽
어딘가를 걸을 때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던 걸 기억한다. 엄마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가끔은 아파서 내가 슬며시 힘을 뺄 때면 엄마는 눈을 흘기며 얼른 꽉 잡으라고 했다. 우린 가족이니까 손을 잡고 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대쪽 손은 할멈에게 쥐여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서도 버려진 적이 없다. 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건 양쪽에서 내 손을 맞잡은 두 손의 온기 덕이었다. - 171, 172쪽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한 사랑이라는 건, 어떤 극한의 개념이었다.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간신히 단어 안에 가둬 놓은 것. 그런데 그 단어가 너무 자주 쓰이고 있었다. 그저 기분이 좀 좋다거나 고맙다는 뜻으로 아무렇지 않게들 사랑을 입 밖에 냈다. - 176쪽
너무 멀리 있는 불행은 내 불행이 아니라고, 엄마는 그렇게 말했었다. - 24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