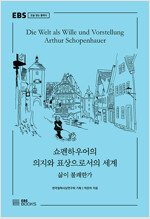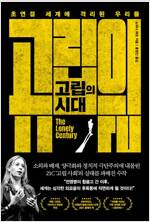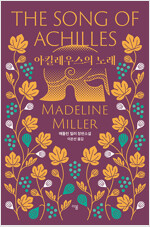쉽사리 물리치지 못하는 까닭에 책의 유혹은 여전히 그리고 즉흥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뽐내는 선전 문구에 이젠 멈추어야 한다던 다짐을 잊게 하기 일쑤이다.
불륜 스토리를 통해 인간의 구원 문제를 우회하여 넌지시 도덕성을 촉구하는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읽다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부터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던 농촌 귀족 ‘레빈’ 때문에, 혹은 기독교에 의해 쾌락주의 누명을 쓰고 고귀한 사상이 자칫 묻혀버릴 뻔 했던 에피쿠로스가 눈에 밟히던 중 마침 출간된 '존 셀라스'의 엑기스 같은 책을 저버리지 못하는 식이다.
퀴어가 대중적 이해를 획득함에 따라 새삼스레 부상하는 '미시마 유키오'의 『금색(禁色)』은 그의 군국주의자로서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인간의지의 치열한 투쟁의 공존과 균형을 향한 미학에 대한 호기심을 물리치기 어려워 구입하는가하면, '매들린 밀러'의 소설은 단지 화려한 장정과 '아킬레우스'의 현대적 해석은 어떤 것일까 하며 현혹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노리나 허츠’의 『고립의 시대』는 저자의 대중을 향해 내뱉는 유창한 설득의 언변에 매료되어 있던 차에 무조건적인 지적 신뢰가 통하였으며,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는 상처 받고 이방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울림을 뒤늦게 찾기도 했다. 아마도 공감의 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내 처지와 상통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인리히 호프만'의 『더벅머리 아이』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판 역시 스치듯 언급되던 역사서 모퉁이의 어느 한 문장이 떠올라 다행스럽게도 절판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구입을 미룰 수 없었던 책이라고 판단했다. 타셴에서 출간하는 책의 그 촘촘한 밀도의 구성에 매료되었던 기억으로 『20세기 사진 예술』 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의 압축으로서의 사진에 대한 매혹이 결합된 구매 욕심이었던 듯싶다.
이렇게 2월 한 달 구입한 책을 정리하면서 구입의 무수한 정당화의 변명을 하고, 책 마다 에 내 인상과 느낌을 기록해두는 의미를 기술해 본다. 이젠 그만 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책을 향한 욕심이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해 할 뿐이다. 이 책들은 또 어떤 책을 부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