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선자, 21세기 한국에 다시 출현한 타르튀프의 역겨움에 진저리치며
17세기 프랑스의 희극작가인 몰리에르(Moliere)가 발견 포착해 낸 《타르튀프(La Tartuffe ou L'imposteur)》의 그 야비하고 위선적인 인물이 공간과 시간을 넘어 21세기 한국사회에 격세유전(atavism)되어 출몰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파리 상류층의 자제로 성장했던 이 궁정좌파라 할 수 있는 ‘장 바티스트 뽀끄랭(몰리에르의 본명; Jean Baptiste Poquelin, 1622.1.15.~1673.2.27.)’의 당대 귀족들과 부르주아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선취한 리얼리즘 문학(희곡)이 자꾸 내 신경을 자극해 댔기에 몇 글자 남겨 놓기로 했다.
어쨌든 인간 세계에 죽지 않고 되살아나는 망령으로 인해 고전의 지위를 지니게 된 문학작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귀족 오르공의 집에 식객으로 대접받고 있는 타르튀프란 인간이 있다. 이 인물에 대해 날카롭게 벼려진 판단력을 보이는 인물은 오르공의 딸 마리안느의 몸종인 도린느다. 도린느는 타르튀프를 이렇게 평가한다. 한 때 승승장구하다 그 매력을 상실한 바람둥이가 버림받음의 어두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위장된 정숙, 청렴, 용기를 팔 수 밖에 없게 된 인간이라고. 사실 탄핵된 여인에게 팽 당했던 인물이 촛불정부에게 보였던 것이 이러한 순진무구로 가장된 권모술수였다. (제대로 된 사유하는 인간의 역을 하녀에게 부여한 몰리에르의 파격을 보라!)

오르공의 부인 엘미르의 오빠인 끌레앙뜨는 마치 21세기 한국사회에 등장한 이 괴물을 보기라도 한 듯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짓 눈짓과 꾸민 믿음으로 신용과 위엄을 사려고 하는 자, 일부러 신앙(정의)을 내세우는 꾸민 겉치레는 사기꾼”이라는 것이다. “온 세상이 뒤따라야 할 참된 신자는 뭐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법석을 떨지 않”는다고. 천박하고 저열한 인간 하나를 마치 새로운 정의의 수호자라도 되는 양 미디어들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철없는 대중들과 세상이 떠들썩하게 했나를 떠올려본다. 그 자와 태극기 부대가 법석을 떨어댈 때, 이미 그 가면을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 가장된 얼굴 이면의 민낯을 볼 생각들을 하지 못했던 것일 게다.
사실 이 비열함과 악덕으로 똘똘 뭉쳐진 인간, 자신의 입신과 재화에 대한 탐욕을 위해 온통 꾸며진 행위로 위장한 인간, 이 위선의 기형적 인간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 이 자가 설쳐댈 수 있게 된 근간, 이 자가 활개 칠 수 있는 토대가 된 동력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바로 위선과 진실(정의)을 구별 할 줄 모르는 맹목의 구정물에 깊숙이 빠져들어 사리분별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들이 바로 이런 사기꾼의 비옥한 토양이다. 오르공이란 인물과 이 자의 어머니인 뻬르넬르 부인이란 인물은 사실을 직접 겪은 자들의 증언조차 부인하며, 편협과 왜곡된 자기 인식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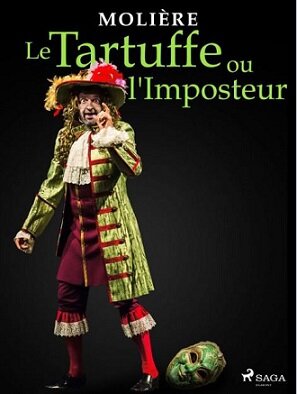
기실 자기 아내인 엘미르의 육체를 탐하고, 자신을 봉 취급함에도, 이를 목격하고 진실을 말하는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모든 이들이 자기가 신뢰하는 괴물을 모함하는 것이라 외면한다. 그리곤 전 재산을 증여하는 계약까지 하여 넘겨주기에 이른다. 마치 오늘 자신들이 선출해 놓은 자에게 모두 털려나가는 꼴이 오르공과 뻬르넬르 모자와 지나치게 닮았다. 집달리가 달려와 오르공 일족에게 집을 비우라는 명령이 잇따르고, 급기야 모반죄로 몰려, 끌려 갈 지경에까지 이른다. 17세기 극(劇)이니 수호신처럼 지상대권(地上大權)이란 것이 발동되어 이 사기꾼의 죄를 인식하여 오르공 일가는 재산을 수호하고, 인신의 안전을 도모하지만, 21세기 오늘의 한국에는 이 같은 기적이 발생할 여지도 없거니와 잃어버린 것들을 일시에 원상회복하는 길도 없다.
“도금한 금빛에 눈이 멀어”, 집단적 맹목에 휘둘리고, 그 가짜 금에게 자발적 복종으로 달려 간 우중의 시선이란 것이 아마 이것일 것이다. 오르공, 뻬르넬르. 진실과 외양을 구별할 줄 모르는 이 영원한 어리석음들이 여전히 자기 목줄을 쥔 개장수의 손을 핥아대고 있다. 곧 삶이란 것과 이별 할 줄 모르는 이 불구의 무지. 타르튀프에게 기만당하지 않으려면 맹목에서 벗어나는 길 밖에 없다. 오늘은 이 세계 밖에서 내려 올 신성한 구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혐오스러운 두 유형의 인간을 당대 귀족사회로부터 포착해 낸 한 위대한 연극인이자 문학인의 발견이 동양의 한 지역에서 4세기 후에 다시 회자되는 것을 안다면 대체 무어라 할까? 끈질기게 배우려하지 않는 이 외면의 의지를 무어라 불러야 하나?
이 희곡은 1664년 5월 12일 베르사유 궁정 축제일에 3막으로 초연 되었으나, 파렴치한 작품이라 바로 공연이 금지 되었다고 한다. 이후 1667년 개작하여 재연했으나 또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오늘 우리네가 읽는 희곡은 5막으로 개작되어 1669년 이후 공연된 것이라 하니, 사실 초연되었던 희곡의 그 신랄했을 풍자와 비판이 상상된다. 사이비 정의, 거짓된 공정의 가면이 판치는 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자처한 그 우민의 세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나만의 옹알이다. 타르튀프들이 원하는 빛깔로 물들인다고 이 사회가 이것들의 행동을 용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타프튀프의 헛된 망상을, 깨어난 오르공들이 처단해야 할 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