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계자들
김언수 지음 / 문학동네 / 2010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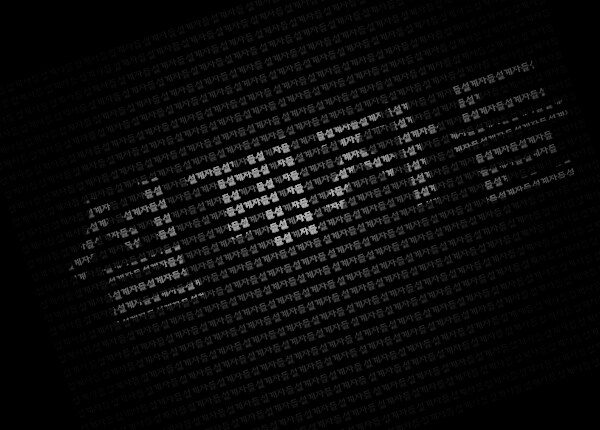
김언수 작가의 래생과의 만남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작년에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의 한 명으로 꼽는 루이스 세풀베다의 <감상적 킬러의 고백>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킬러를 소재로 한 소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딱 1년 만에 나의 그런 편견을 김언수 작가가 신작 <설계자들>로 단박에 빠개줬다.
작가는 <설계자들>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장군 암살에 나선 래생이라는 캐릭터를 독자에게 툭 던지는 것으로 소설을 시작한다. 냉혹한 킬러이면서, 동시에 남모르는 과거를 가진 래생의 실체를 한 꺼풀씩 벗겨 내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자객과 표적과의 갑작스러운 대면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자객의 세계에서 자객은 표적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암살을 주문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주문에 따라 암살을 ‘설계’한 설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자객은 움직인다. 래생은 표적 권장군으로부터 좋은 위스키와 인디오식으로 요리한 돼지고기 그리고 감자까지 얻어먹는다. 그렇다고 표적의 운명이 뒤바뀌진 않는다.
자, 이젠 래생의 과거가 등장할 차례다. 태어나자마자 수녀원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래생은 너구리 영감의 ‘도서관’에 입양되어 허드렛일을 하다가 너구리 영감의 수석 자객 훈련관 아저씨가 털보의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가 된 후, 본격적인 자객의 길에 나서게 된다. 그는 엄청난 양을 자랑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순수하게 책을 읽기 위핸 목적으로는!) 도서관에서 스스로 글자를 깨치고 너구리 영감이 읽지 않을 만한 책만 골라 읽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절름발이 너구리 영감의 도서관은 지난 90년간 온갖 추문이 얽힌 암살과 납치 그리고 실종이 얽힌 푸주의 입구였다.
그나마 영화 속의 레옹은 여자와 아이는 “클린”하지 않는다지만 래생에게는 애당초 그런 원칙 따위는 없다. 래생과 절친한 동료 자객 추가 이발사라는 이름의 칼잡이 고수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가 소개된다. 자객의 세계에서 표적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객에게 합당한 대가는 죽음뿐이다.
한편, 래생과 같은 도서관 출신의 한자는 미국유학파로 경호 보안업체로 대표로 있으면서 뒤로는 깔끔한 대형마트의 살인청부업을 수행한다. 아날로그 방식의 청부를 담당하는 래생과 기업식 킬링을 서비스하는 신사 한자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래생은 집에서 사제폭탄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김언수 작가의 신작 <설계자들>에 뿌리내린 서사구조는 독자가 거부할 수 없는 주술적 마력을 가지고 있다. 글을 읽을수록, 아무런 감정 없이 표적을 처리하는 래생의 삶과 하릴없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독서를 하는 그의 인문학적 감성이 언제고 사고를 치겠지하는 우려가 동시에 교차한다. 책 읽는 낭만자객 래생의 덤덤한 “클린”은 암살이라는 극단적 폭력에 대한 독자의 사고를 무장 해제시켜 버린다. 작가는 주문, 설계, 암살 그리고 사후처리에 이르는 푸주 시스템을 자본주의적 욕망의 아바타로 서술한다.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관심이 없듯이, 돈만 주면 귀찮을 일을 처리해주는 흥신소 직원들처럼 래생들은 움직인다.
17살 때부터 업계에 투신해서, 15년간 다양한 종류의 “클린”을 해온 래생이 표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래생 자신이 자객이라지만, 인간의 본성대로 래생 역시 살고 싶다. 자신의 동료 추가 그리고 ‘그림자’ 정안이 차례로 이발사의 칼에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복수를 꿈꾸었을까? 자신의 실력이 이발사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잃을 게 없다는 식의 아포토시스(apoptosis: 세포자살), 다시 말해서 자기희생을 통한 발생과 분화의 스텝을 따른다. 이 과정에서 래생의 자기희생은 자기보다 앞서 자발적 아포토시스를 결정한 미토를 그리고 그녀의 동생 미사의 생명연장에 대한 분화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일까? 아포토시스란 결국 존재의 궁극적 갱생을 의미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소설의 전반과 중반의 빼어난 전개와 서사 구조와 비교하면, 미토가 등장하는 후반부가 상대적으로 아쉬웠다. 연재가 계속되면서 결말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을까. 예상치 못한 급작스런 결말이 조금 당황스러웠다. 도서관의 주인장 너구리 영감이 자신에 도전하는 한자에 대해 제대로 한 건 해주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대로 침몰해 버리는 모습에 실망했다. 푸주 세계의 의자를 치워 버리겠다는 미토의 당찬 아이디어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delusion)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예상하지 못했던 캐릭터의 재등장과 반전은 일품이었다.
김언수 작가의 유머 코드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다. 폭력남편을 의뢰하기 위해 미나리 박을 찾아온 아줌마가 도저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가격을 흥정하는 장면에서 그만 빵 터져 버렸다. 지긋지긋한 삶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데도 시장가격 이상은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그녀의 태도는 정말 쿨했다! 팬티도 안입고 설쳐대는 곰돌이 푸우를 비롯해서 소설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두지 않아서, 어느 장면이라고 꼬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곳곳에서 빛나는 김언수 작가의 언어유희에 푹 빠져버렸다.
21세기 낭만자객으로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김언수 작가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기원한다. 작가와의 첫 만남은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아 참,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책들을 계속해서 검색했는데 결국 다카하시 겐이치로의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야구>는 결국 주문하고 말았다. 이 고질병은 당최 어찌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