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hu Xiao-Mei를 연달아 듣고 있다. 아마존에서 어제 도착한 스칼라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의 다섯 개의 CD 합본이다.
미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을 한국에서 구할 수 있어서 주문했으니 도착하면 제대로 들어볼 것이다. Glen Gould의 연주로만 들어본 Goldberg Variation도 이분의 연주로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풍월당이 이름이 나던 무렵의 저자는 대충 중장년 정도의 나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몸 이곳저곳이 고장나기 시작한 노년에 들어선 듯 글이 차분하고 약간은 서글프다. 여행기나 음악에 대한 이야기만 보면 그 열정은 여전하지만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음반을 수집하는 사람, 뭔가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인간이란 건 일종의 dying breed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글에서 희망보다는 쓸쓸함이 더 많이 느껴진다. 장수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사람은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남은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줄어듦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존재가 아닌가 싶다. 음악과 문학에 해박한 저자가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과 편지로 소통한 것을 모은 책이다. 해박한 지식만큼 reference도 좋아서 Zhu Xiao-Mei와 Maria Joao Pires라는 멋진 거장들을 소개 받았다. Joao Pires는 오늘 도착했으니 남은 주문이 모두 들어오면 하나씩 들어볼 생각이다만 Zhu Xiao-Mei는 본격적인 가을이 오는 듯 아침부터 어두컴컴하고 뿌옇게 흐린 날 듣기에 너무 좋다. 음악이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 분위기 모든 걸 타는 듯, 어제 퇴근 전에 늦게 조용해진 사무실에서 들으니 아침이나 오후와는 또다른 교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음악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음악을 만들기도 한다는 심플한 이치를 이제야 경험해본 것 같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매년 가을이 되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몇 권 읽곤 한다. 딱히 뭔가를 더 알아내려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추구하는 어떤 이유도 없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그의 첫 작품인데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읽는 것이라서 딱히 이야기가 새롭거나 하지는 않고 작품이 주는 기시감이 여전할 뿐이다. '색채가 없는 다카지...'는 두 번째 읽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각기 색이 뚜렷한 네 명의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무색채의 다자키 쓰쿠루가 그룹에서 잘려나가게 된 '그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아직 많이 열린 이야기라서, 늘 개작에 가까운 창작을 하여 과거의 모티브를 새로운 작품에서 풀어나가는 작가의 특성상 언젠가 다시 펼쳐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나온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뒤로 갈수록 한번만 읽어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작가의 소설이라서 이 또한 몇 번 더 읽을 것이 분명하다. 구덩이와 군인 등 몇 가지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 사용된 모티브가 보인다만 이제까지 본 하루키의 소설들과 조금은 다른 것 같다. 마구잡이로 던져보자면 사람, 그 사람의 그림자, 그 사람의 본질, 둘로 나뉘면 그림자가 본질인지 본질이 그림자인지 당사자는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쉽게 알기 어렵고. 책을 소화해온 소년은 도서관의 메타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각각 사람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상상의 세계인가 싶기도 하고. bits and pieces 퍼즐을 맞추려는 듯 바닥에 펼쳐놓은 조각들을 바라보는 심정이다. 쓰고서 보니 이건 무척 괴로운 상황이 아닌가. 재미있게 읽었으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바보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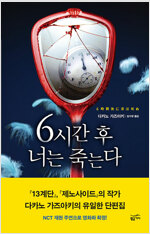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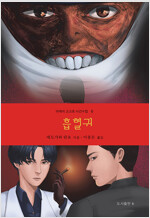
현대의 작가인 다카노 가즈아키의 책과 추리소설에 있어 일본의 아버지와도 같은 에도가와 란포의 작품을 각각 읽었다. 사무실을 열고 일보단 시간이 많았던 초창기에는 추리소설을 참 많이 봤었다. 일단 내가 읽지 못한 유명한 작품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인데 그 3-4년간 애거서 크리스티부터 해서 정말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사들여 읽었기에 요즘은 어쩌다 한 권 정도를 읽는 것이 전부다. 에도가와 란포의 작품은 요즘의 세련된 눈으로 보면 동화같기도 한 것이 마치 나레이션으로 배경을 설명해주거나 자신의 계획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악당이 등장하는 70년대의 만화를 보는 느낌이다.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는 정통추리라고 하기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이 나름 신선하다.

아직 작품의 연도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모티브가 되는 시대는 아무래도 70년대 정도가 아닐까 싶다.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 익숙한 American horror혹은 gothic한 모티브가 보인다. 네 가지 단편 모두 영화를 소설로 옮긴 듯 생생한 묘사가 압권이다. 나는 처음 읽지만 Joyce Carol Oates는 매우 유명한 이 분야의 작가라서 과연 이름값을 하는 것이다. 방금 찾아보니 85세로 연세가 있는 작가인데 이 책의 작품들이 쓰인 시기와 이에 따른 묘사와 모티브가 얼추 내가 생각한 것과 맞을 것 같다.
역시 다른 작품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작가는 아마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묘사의 생생함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자영업이란 것이 바빠도 힘들고 한가해도 힘든 것인데 최근 이상한 갑질을 하는 미친 X수 출신의 고객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쓰고 산다. 이것도 경험이 쌓이니 그날의 걱정은 그날로 끝내고 미래의 걱정은 닥치면 그때 맞춰 걱정을 하는 정도까지는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정은 up-and-down을 반복하는 것이 철이 덜든 것 같다. 오후 3시까지는 오늘도 계속 일하다가 문득 남은 건 내일 해도 될 것 같아서 책을 구경하던 김에 YouTube으로 서점이야기도 찾아서 보다가 이렇게 페이퍼를 정리할 수 있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도 될 것이니 오늘은 이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