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에 멈춰버린 나의 시계를 다시 돌리려 한다. 책은 언제나 열심히 읽고 있지만 글을 남길 마음도 없고 뭔가 써보려고 하면 욕만 계속 나오는 탓에 뭔가를 쓰고 싶지 않았다. 달리기도 하고 날도 좋은 (북켈리포니아의 봄은 정말 좋다) 이런 날 사무실에서 일찍 나와서 실로 2년만에 서점에 나와 커피와 함께 마침 난 넓은 탁자를 차지하고 노트북을 켰다. 기억이란 것이 가물가물하니 그간 읽은 것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이렇게 뭔가 다시 써보려 한다.
서점에 들어와서 책을 구경하면서 눈에 들어온 건 신간 말고도 새롭게 판본을 만들어 나온 - 그 많은 'Great Gatsby'들 중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 Great Gatsby였다. 책은 그렇게 예쁘지 않고 그저 두껍게 느껴지는 것이 눈에 띈 모양이다. 펼쳐보니 고급스러운 재질의 아주 두꺼운 종이에 코팅을 한 것처럼 인쇄가 된 사실 무척 차갑게 느껴지는 제본이다. 뭔가 Great Gatsby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질감이 확 다가온다. 이유는 모르지만 Great Gatsby는 Catcher in the Rye와 함께 닳고 구겨진, 마치 누군가의 뒷주머니에 들어있었을 듯한 정도록 낡고 손떄가 묻은 모습이 더 어울린다.
인생의 황혼기를 시작하려는 나이에 보는 Great Gatsby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일일이 적지도 표현하지도 못할 아련한 기억과 함께 가슴이 팽~ 하는 느낌의 아픔까지 줄 수 있는 소설인데 문제는 내 경우 그런 느낌은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부터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모르긴 해도 많은 경우 젊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책을 어린 시절부터 읽고 공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다. 그런 사람이라서 하루키처럼 글로 먹고 살게 되는 것일까.
서점에 다니지 못한 사이에 나온 책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미 3월까지를 살아버린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게다가 먹고 사는 걸 넘어 은퇴를 준비하느라 붓고 있는 이런 저런 것들까지 하면 늘 주머니가 가벼운 기분이다. 기실 알라딘에서 한번에 수 백불은 쉽게 결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막상 뭔가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땐 늘 지갑이 비어있다. 서점에 온 김에 눈이 가는대로 이런 저런 책을 몇 권 사들고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지지는 못했기에 서점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나오는 것으로 어제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조금 더 자주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구입하려고 한다.
운동을 가려고 일찍 일어난 토요일 새벽. 커피캡슐이 다 떨어진 것을 주중에 사놓지 못해서 차를 한 잔 우려내고 (티백이지만) 다시 정리를 시작해본다.

상당수는 거짓과 억측이 난무하고 함부로 떠들어대면,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기 딱 좋은 주제. 메타적인 주제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초과학적인 UFO와 시공간을 초월한 이동의 원리를 나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처음 읽었을 때나 지금이나 저자의 credential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매우 정신과 영성의 관점에서 UFO와 외계문명과의 조우를 말한다. '그림자 정부'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전통적인 음모론 계통의 냄새도 나지만 Qanon처럼 그리고 상당히 많이 퍼져있는 종교 base의 음모론 내지는 종말론과는 다른 설득력이 있다. 직접 본 것은 아니라서 전체적인 내용이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책을 처음 읽고 책에 나온 대로 몇 날 집중해본 어느 즈음에 조금 이상한 걸 보기는 했다. (믿거나 말거나) 새벽에 본, 달 옆에 떠 있던 그건 무엇이었을까? 별은 확실히 아니고 인공위성도 아닌, 육안으로 확연히 보이는 빛의 구체가 육안으로 보이는 크기와 위치에 뜬 달 옆에 딱 떠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갖고 있는 폰으로 찍었지만 사진은 꽤 구리게 나와서 뭔지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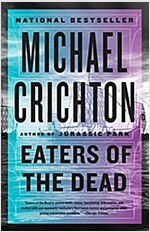
약 10세기 경 바그다드의 이븐 팔할란이란 사람이 칼리프의 명령으로 머나먼 불가리아 (당시의 불가리아)의 왕에게 사절로 가는 여정에서 만난 바이킹을 따라 그들의 나라로 가서 겪은 모험의 이야기. 원본은 소실된지 오래라서 이후 다양한 판본으로 전해지는 걸 19세기 무렵부터 조합하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팩션처럼 만들어진 이야기. 영화 13th Warrior의 원작. 별도로 펭귄북스에서 나온 이븐 팔할한의 여행기도 조만간 읽어보려고 구해놨다. 10세기에는 이미 멸종(?)했다고 알려진, 대모신의 숭배하는 고대의 인류가 현생인류와 공존했다는 추측을 낳은 이야기로 바이킹의 여러 나라들이 웬돌이라는, 감히 name되면 안되는 무서운 존재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팔할란이 포함된 13인의 전사들이 이들과 싸워 물리친다는 이야기. 순전히 상상의 산물일 수도 있으나 아랍어의 표현상 추측과 사실을 잘 구분해서 서술했다고 저자는 말하며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 영화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는 영화 Rudy와 함께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영화라서 못해도 13번 이상은 본 것 같다. 극장에서만 2-3번은 본 것으로 기억하니까.










3월 10일 이후 읽은 나머지 책들. '채링크로스'와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은 여러 번 읽었고 책이 잘 안 잡힐 때 가끔 꺼내어 보는 책이다. '사라진 서울'은 그다시 감흥이 없었던 것이 내가 서울사람도 아니고 서울에 대한 추억도 없으며 굳이 말하면 나라의 '암'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서울을 잘 찢어놓아야 균형잡힌 발전과 지속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침묵의 시대'는 읽을 당시의 감성이 잘 떠오르지 않고 '마션'과 '녹나무'는 그냥 재미로 읽어서 별로 남은 것이 없다. '마션'은 영어로 먼적 읽고 영화를 봤기에 한국어로는 뭔가 밋밋하게 느껴진다. 폴 오스터는 심심하면 뒤적거리는 작가인데 '빵굽는 타자기'는 편하게 읽기 딱 좋다. '고양이'도 좋았지만 '이렇게 책으로'는 별로. '밀라노'는 지금 읽을 때의 그 마음이 잘 떠오르지 않기에 늦게하는 정리의 아쉬움과 문제를 새삼 느낀다.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는 저자의 두 번째 이야기. 미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경양식이 서양음식의 전부로 알고 있었고 스파게티가 미국음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나에겐 매우 추억돋는 이야기. 세기말 끔찍한 콜라텍 화재사건 이전까지 인천의 중심은 대한서림과 전통있는 학교들이 모두 있었던 동인천이었는데 신포동 어디엔게 어머니가 데려가주신 경양식집, 석바위근처 경양식집 등에서 맛있게 먹던 빵, 밥, 채소스프, 비프까스가 생각나서 내내 추억에 젖어 읽었다.
이곳에 독일계 이민자가 하는 Gunther's라는 식당에서 일본식 '카츠'의 원조인 슈니첼을 먹어봤는데 내 입맛엔 '까스'가 더 맞는 것 같다. 저자도 말하거니와 슈니첼-카츠-까스로 이어지는 현지화에 따라 짜장면과 짬뽕처럼 사실상 한국음식이라고 봐도 무방한 '까스'는 경양식 레스토랑이 유행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금은 돈까스 전문점이 아닌 예전 그대로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뭔가 좀더 lasting하는 문화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이럴 땐 정말 아쉽다.
21세기 OECD 국가들 중 유일한 신정국가로 탈바꿈한 한국. 굥과 그를 내세운 건건의 수렴청정의 이 빨리 끝나기를 희망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