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 내일이면 벌써 2주를 꽉 채운 후의 3주의 시작이다. 매일 무엇인가 일을 줘야 하고, 덕분에 조금씩 모든 걸 내가 처리하던 일정이 나눠지고 있다. 거기에 아무래도 혼자의 머리로 정리와 구성을 맞춰가던 reset의 한계도 더 나아지고 있으니 넉넉하게 잡고 11월 중반까지는 이런 부분의 정리가 드디어 끝날 것 같다. 이런 저런 행정적인 reset도 11월 중으로는 다 끝낼 예정이고 12월에는 내년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경영을 시작할 준비도 할 것이니 많이 바쁘고 정신 없는 2019년의 마지막을 향할 것이다.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적절한 사람을 하나씩 더해서 탄탄하고 멋진 조직을 꾸리고 싶다만 여러 모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고 다시 어느 정도는 원래의 패턴을 찾았다. 예전처럼 사무실에서 마구잡이로 일을 하다가 쉬면서 독서를 하는 식은 좀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질 땐 언제나 책을 읽을 생각을 한다.

경찰이나 검찰이 실수로 누군가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를 작품에서는 '원죄'라고 표현한다. 그 '원죄'가 발생할 때 함께 사건을 맡았던 형사가 조직의 박해와 왕따를 견뎌내며 '원죄'에 대한 속죄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과거와 진범을 잡고, 더 나은 형사가 되어 가는 모습까지만 나왔다면 그저 그런 이야기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런 '원죄'를 불러일으키는 강압적인 수사방식과 자백을 유도하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수사, 검경과 판사까지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짓밟은 인권. 이걸 개선하기 위한 혼자의 노력,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미스터리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파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하면 별건수사와 끝없는 수사대상의 확대를 통해 사돈의 팔촌의 사돈의 팔촌까지도 털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의 삶을 파탄내버리는 언론과 검찰이라는 절대악과도 같은 절대권력의 횡포를 눈앞에서 보는 21세기의 19번째 해. 과연 그자들은 '원죄'에 대한 속죄의식, 아니 인식이라고 있을런지.

꾸준히 문제의식을 갖고 읽는 서경식선생의 책. 지금까지 한국어로 번역된 걸 모두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두 권이 더 있길래 구했다. 제목처럼 복잡한 identity가 필연적인 재일조선인의 눈으로 보는 소속의 문제, 일본에 의한 차별, 한국으로 와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같은 이슈들에 대한 에세이를 모았다.
생각해보면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에서는 한국계 이방인으로 이런 저런 탄압과 차별의 대상이지만, 한국에 오면 '일본놈'으로 또다시 이런 저런 묘한 뒷담화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아키야마 요시히로 (한국명: 추성훈)이 한국에서 유도선수로 생활하던 당시 받았던 차별 (한국어가 서툴러 쪽발이란 말을 들었다던)과 유도계에 만연한 특정학교의 횡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일본으로 귀화했던 바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다른 많은 일들이 함께 계기가 되었지만 적어도 그가 한국땅에서 쪽발이나 왜놈이란 소릴 들었다는 건 한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무의식/의식적인 각종 인종차별과 무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하나가 재일조선인이란 것이 많이 속상하고 많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서경식선생의 형들 두 분은 박정희때 모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빨갱이'로 몰려 갖은 고문과 불법적인 행위에 시달렸고 무척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더랬다. 모국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이 아닌 한국인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남북이 각각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두고 이용하고 괴롭혀온 것이 재일조선인/모국의 역사였던 것.
경계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재일조선인들의 모습은 팔레스타인사람들이나 2차대전 때 박해를 받고 '인종청소'를 당했던 유대인들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선생은 보는 바, 그를 통해 에드워드 사이드나 프리모 레비를 접하고 약간은 그런 관점에 대한 이해를 했던 것 같다.
그냥 나쁜 '일본사람'에서 끝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삶에 읽은 걸 대입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 역시도 어쩌면 조금 더 나은 형편의 경계인이 아닐까...미국인이되 한국인이고 한국인이되 미국인인...


늘 이런 잔잔한 책을 주기적으로 구해서 읽곤 한다. 그러다가 알라딘을 열고 관심이 가는 책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책을 잘 정리해서 꽂아둔 따뜻하고 멋진 서재를 갖는 날을 꿈꾸다가 어느 날엔가는 평화롭게 조용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곳에서 은퇴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zillow.com을 켜고 하와이의 호놀룰루나 코나섬의 집값을 뒤져보는 것이다. '책꽂이 투쟁기'를 보다가 이번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버린 자계서류의 책들을 떠올리면서 과연 그때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가 생각해보았고, '속초'를 보면서 산과 바다, 그리고 좋은 서점이 있으면서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덕분에 상대적으로는 좀더 나은 조건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속초라는 도시를 떠올렸다. 나도 바닷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교도 어쩌다 보니 바닷가를 지척에 둔 산속캠퍼스에서 보낸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곳에 끌린다. Santa Cruz, 아니면 거기서 1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몬트레이를 지나면 나오는 Carmel by the Sea 같은 작고 예쁜 타운에서 늙어가도 좋겠다. 물론 아직은 하와이가 지상낙원의 구현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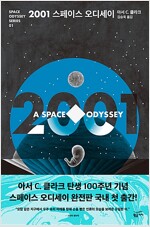

이건 영화를 꼭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영화는 아직 못 봤다. 2001년이면 이런 과학기술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꽤 예전에 나온 책과 영화라는 면도 생각하면 재밌다만, 더욱 신기한 건 이 책에서 그린 과거와 미래의 연결이 아닐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 전에 이미 과학문명을 이룩하고 진화를 거듭해서 파동으로 존재하는 어떤 인류에 의해 우주 곳곳에서 이뤄진 문명촉진, 그 이후 다시 한번 이를 통해 진화하는 우리 시대의 '첫 번째 원숭이'가 출현하는 부분이 아마 다음 편의 시작이 될 것 같다. 천천히 아껴 먹고 있는 시리즈.
10월이 나흘이면 끝인데 아마 첫 날의 예상과는 달리 잘해야 12권에서 15권 사이를 읽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남은 11월과 12월은 잉여가 아닌 기대목표치를 reach하기 위해 발버둥칠 필요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