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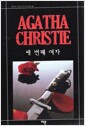
-
세번째 여자 ㅣ 애거서 크리스티 미스터리 Agatha Christie Mystery 34
애거서 크리스티 지음, 김석환 옮김 / 해문출판사 / 1989년 8월
평점 :



나는, 말하자면, 애거서 크리스티를 소위 '고전 미스테리 작가' 분류에 우겨넣어서 생각하고 있다. 별로 깔끔하거나 논리적인 분류는 아니고 말 그대로 '자의와 편견으로 가득차서' 코난 도일이나 앨러리 퀸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좁은 런던 골목길, 마차, 샤넬라인 스커트, 펠트 중절모 등도 떠올리곤 한다. 한 마디로 크리스티는 내게 1920년대의 이미지인 것이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면상의 이야기이다. 때문에 그 둘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모순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크리스티의 이미지에 대한 나의 '사실'과 '느낌'의 차이는 코미디 소재나 무식한 인간의 표본으로 삼아도 좋을만큼 어긋나고 있다. 아니 분명 크리스티 여사는 1920,30년 경에도 활동했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의 작품 중 많은 수가 1950년대, 60년대 심지어는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말 단순무식한 인식라고는 할 수 있겠다.
어쨌든, 때문에 나는 크리스티 여사의 작품에서 자동차, 마약, 청바지, 록큰롤, 비행기, 그리고 전후라는 말이 나오면 화들짝 놀라곤 한다. '세 번째 여자' 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나 이 작품은 거의 풍속소설 분위기가 날 정도로 시대배경이 자주 묘사되고 있으므로 더욱 심했던 것 같다. '비틀즈'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니! (게다가 해문 문고판에는 그 옆에 역주도 달려있다. 1960년대 영국의 유명한 록그룹, 이던가 해서)
그리고 이런 시대 배경-크리스티 여사로 치면 상당히 후반기인-은 외적인 부분에 뿐만 아니라 소설 내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 듯 하다. 심령술과 심리에 대한 관심은 마약과 사회악으로 옮겨가고, 연극적이기까지 했던 제한적인 배경과 정적인 사건진행은 하드보일드 장르와는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긴 해도 도시와 모험속으로 뛰어든다. 그 속에서 크리스티 여사는 변하는 시대를 바라보며, 과거로의 향수와 추억에 젖어들곤 한다. 아마 크리스티 여사를 내가 1920년대의 서구사회의 분위기와 연결시킬 수 밖에 없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콧수염을 가다듬고, 초컬릿 차를 즐기는 포와로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1920,3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가 택시를 불러서 타든, 비행기를 타든, 비트세대와 마약거래의 한 가운데 휩쓸리든 간에, 그는 제국주의와 브루조아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던 바로 그 때 그 사람인 것이다. 크리스티 여사가 그러하듯이. 노인네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크리스티의 후반기 작품에서 드러나는 과거에 대한 향수는 내겐 일종의 로맨틱함으로 다가온다.
덧붙여, 정말 사소하고 사적인 감상을 남기고 싶다. 우선은 추리소설계의 일등급 커플 매니저 포와로라지만 이번 작품에서의 그의 커플 매니저로서의 활약은 조금은 난데 없었던 것 같다. 결말에 가서 맺어지는 두 사람이 저렇게 얼렁뚱땅 난데없이 맺어져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굉장히 쓸데 없는 걱정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올리버 여사의 활약이 무척 반가웠다는 점이다. <테이블 위의 카드>와 <창백한 말>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읽었기 때문인지 그녀의 수다와 '여자의 직감!'을 만날때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지낸 친구를 보는 것 같아 즐거웠다. 물론, 올리버 여사가 스벤 저슨(올리버 여사가 쓰는 추리소설의 핀란드인 탐정이다)을 살짝 깔아 뭉갤때마다 혹시 우리의 포와로가 크리스티 여사에게 그랬던 것인가 싶은 기우에 고개를 흔들곤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