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계사를 바꾼 50권의 책 - 역사를 움직인 책 이야기 ㅣ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시리즈
대니얼 스미스 지음, 임지연 옮김 / CRETA(크레타) / 2023년 4월
평점 :



아, 놀래라.
세계사를 바꾼 책이라니.
그런 엄청난 힘을 지닌 책이라니.
놀란 마음 진정하고,
세계사를 바꾼 책인가,
세계사에 빛나는 책인가,
확실히 하고 싶다.
흰말궁둥이나
백마엉덩이나
같은 거 아니냐고 할 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일 지도 모른다.
세계사를 바꾼 책은 '세계사'에 그래도 무게 중심이 나눠져 있고,
세계사에 빛나는 책은 '책'에 확연한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책 소개 문구를 보고 더 모호해졌다.
여기에 소개된 50권의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인류 문명에 큰 자취를 남긴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세계사를 관통해 온 다양한 사건과 사상은 무엇인지 시대적 흐름을 따라 일별할 수 있다. 이 50권의 책은 다양한 주제와 시대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 세계 문학의 걸작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해당 작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세계사에 '자취'를 남긴 것과
세계사를 들어서 방향을 틀어 버리는(바꾸는 것)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는가?
부제는 '세계사를 바꾼 책'인데
책 소개는 어째 조금 기세가 꺾인 듯 보이지 싶은데...
더 보자.
◆ 마오쩌둥, 맥아더, 콜린 파월은 모두 《손자병법》의 애독자였다.
◆ 스티븐 호킹의 과학서 《시간의 역사》는 마돈나의 화보집 《섹스》의 판매 부수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 구텐베르크는 파산해 자신이 제작한 인쇄 장비와 출판했던 성경책을 모두 빼앗겼다.
◆ 인류 최초로 생명체를 다룬 과학사 《동물 탐구》를 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학을 누가 먼저 창시했느냐를 두고 진흙탕 논쟁을 벌였다.
◆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은 문학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신호탄이었다.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권력을 빼앗긴 메디치가를 쇄신하기 위해 쓰였다.
◆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2,000개가 넘는 셰익스피어의 글이 인용문으로 실려 있으며, 셰익스피어는 1,70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
◆ 노예 출신이었던 《린다 브렌트 이야기》의 저자 해리엇 제이콥스는 필력이 너무 뛰어나, 이 책을 직접 쓰지 않았다고 의심받았다.
이게, 세계사를 '바꾼' 책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지 않은가?
어떤 이유로 인해,
혹은 어떤 동력에 힘입어 바뀌어가는
세계사의 흐름에서(혹은 그 흐름을 타고)
편집컷처럼
광채를 발하는 책들.
이런 맥락과 더 가깝게 보이는데...
즉, 이 책들이 세계사를 바꾼 게 아니라,
어떤 연유로 바뀌어가는 세계사에 한 획을 그은.
이 책의 원제는 번역본 제목과 좀 뉘앙스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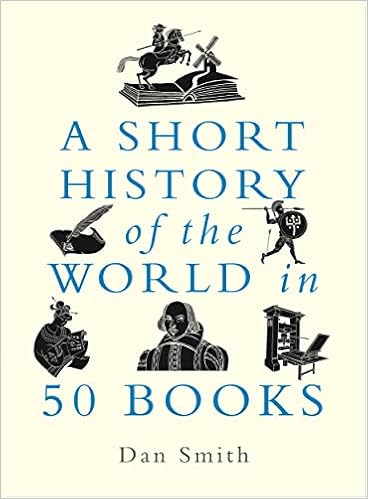
수동적이다.
50권의 책 속에 담긴 짧은 세계사.
이 제목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바뀐 것이다.
세계사를 바꾼 50권의 책.
대단히 능동적이다 못해, 적극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원제를 보면 50권의 책에 스민 역사적 맥락을 탐구한다...
는 의도로 보이지
세계사를 바꾸기까지 한 '파격'은 덜 느껴진다.
흰말궁둥이
백마엉덩이일 수도 있는 근소한 단어 차이갖고
이러는 건
구매 결정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다.
세계사를 바꾼 책들이 맞다면 정독하고 싶고,
세계사에 빛나는 책이라면 이미 비슷한 접근의 책이 많이 있고,해서다.
나름의 이유는 있다, 뭐.
(마케팅 차원에서 제목/부제에
내용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어느 정도의 적극성이 개입되는 건
뭐 통상적인 일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이 '통상'을 '상식'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게 '규범'이 되는 예가 적지 않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적극성인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