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마감] 9기 신간평가단 마지막 도서를 발송했습니다.
[활동마감] 9기 신간평가단 마지막 도서를 발송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줄만 알았는데 훅 흘러가 버리네요. 아쉽고도 아쉬운 시간이였습니다. 한달에 2권씩 12권의 책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책은 아무래도 최근에 읽은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입니다. 막 읽었기에 기억에 남고 생각보다 술술 읽혀지다 보니 소설처럼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민화에 한발을 들여 놓은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겠다는 생뚱맞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약간 아쉬움이 드는 <101명의 화가>도 기억에 남습니다. 화가들의 생을 2장에 담아낸 저자의 내공도 놀라웠지만 화가들이 들쑥날쑥 하게 등장한것도 아쉬웠고~ 그림들이 앙증맞기도 하였으나 내용전달에 있어서 약간은 부담을 줄 정도이지 않았나 싶어서 기억에 남으면서 아쉬운 책입니다.
내 맘대로 좋았던 책 5권을 뽑아 보자면, 음음음~ 생각보다 뽑는게 쉽지 않은 일이네요. 흠흠~



첫번째는 도대체 그로테스크가 뭐야?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입니다. 아마도 알라딘 9기를 하지 못했더라면 읽어보지 못했을 책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게 읽어 내려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아서 읽는데 애를 먹었지만 새로운 책을 읽는 다는 즐거움을 준 책이였습니다. 조금 그로테스크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정이였구요. 예술의 다양한 세계가 어느 틀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퍼져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번째는 신나게 웃어주자고 <본격 시사인만화>입니다. 솔직히 칙칙한 표지를 보면서 별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책입니다. 무슨 책이든 심한 기대와 편견 혹은 넘겨짚기는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대중 예술문학측의 책에서는 마냥 재미나게 읽어간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을꺼라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마냥 책상을 쳐가면서 웃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읽는 분량은 가벼워서 훨훨 날것 같았지만 뒷맛은 씁씁해졌지요.
세번째는 단단히 각오해 <지혜로 지은 집, 한국 건축>입니다. 책을 받아 들었을때부터 묵직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내용도 알차고 보는 이로 하여금 약간의 심적인 부담은 있었으나 읽을때 한국 건축을 조금씩 알아가는 맛이 뿌듯한 책이였습니다. 언제든지 펼쳐서 볼 수 있는 책이고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고 지식에 한몫을 단단히 할 책입니다. 알은체도 할 수 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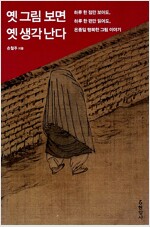
네번째는 에세이궁 <안도 다다오의 도시방황>입니다. 그의 작품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매우 친숙하게 된것만 같은(제 느낌이죠)느낌이 듭니다. 그의 건축에 대한 생각들, 제목처럼 방황들에 대해서 엿볼 수 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읽어 내려간 책입니다. 가벼운 소다수의 느낌이랄까요.
다섯번째는 뒷태가 심상치 않아 <옛 그림 보면 옛 생각난다> 입니다. 책표지를 보면서 끌렸던 책입니다. 왠지 모를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옛그림 이야기를 옷고름 풀듯이 풀어주는 느낌~ 우리것을 알아가는 기분~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외에도 빠지면 무지 아쉬워 할 것 같아서 나머지 책들도 불러 봅니다.




 빠진 다섯권의 책들이 매우 섭섭해 할 것 같습니다. <사유속의 영화>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읽었던 책입니다. 솔직히 재미가 있네 없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속의 영화이기 때문이죠. 무슨말이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영화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꽤나 고달프다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고달픈책이 나쁘다거나 별로라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책이 아무리 고달퍼도 사람이 사는 인생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냥 책일뿐이죠. 어렵고 지루해도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어냈다는 자부심 또한 가져도 좋습니다.
빠진 다섯권의 책들이 매우 섭섭해 할 것 같습니다. <사유속의 영화>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읽었던 책입니다. 솔직히 재미가 있네 없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속의 영화이기 때문이죠. 무슨말이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영화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꽤나 고달프다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고달픈책이 나쁘다거나 별로라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책이 아무리 고달퍼도 사람이 사는 인생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냥 책일뿐이죠. 어렵고 지루해도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어냈다는 자부심 또한 가져도 좋습니다.
<차이콥스키,그 삶과 음악>그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저도 단박에 호두까기 인형을 말할정도라면 차이콥스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을 정도랍니다. 글속에 담긴 편지글이 흡사 키다리 아저씨와 주고 받았던 편지를 연상시키지는 않았지만, 때론 추리소설속에서 남긴 필적과 비슷하지도 않았지만, 약간은 코믹하고 재미있는 차이콥스키의 성격이라든지, 생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책 제목처럼 그의 삶을 볼 수 있었죠. 어쩌면 음악가나 예술가나 작품만으로 남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농담이죠~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 모더니즘편>은 제가 딱히 음~ 즐겨읽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서양미술사 과목도 간신히 점수를 얻긴 하였지만서도 매우 재미나다거나 신난다거나 그런것과는 무관하게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학문 중 하나입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날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심드렁했던 책입니다.
<사진철학의 풍경들>은 사진의 불편함을 단순화 시켜준 책이라고나 할까요. 사진은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찍는 사진들이야 그냥, 재미삼아서, 추억으로 찍는 거지만. 어쩌면 작품이 될 사진보다더 평상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 더 중요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작품사진 한장찍는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요. 사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함을 주는 책이였습니다. 긴장 풀고 셔터 눌러 보고 저 파란 하늘 바라보니 기분이 좋지 아니한가~ 뭐 그런 분위기였죠.
<우리 기억속의 색>은 대략 책을 훑어 보고는 왜 '색'책인데 책속에 그림이 단 한장도 없냐며 애
꿎은 책을 야단치며 버럭했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터라 책을 읽어가며 이 책은 그런책이 아니라는~ 너의 편견을 버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세이와 예술이 적절하게 섞여진 우리 기억속의 색이였습니다.
평상시에 말이 많아서 그런지 글도 은근히 길게 썼네요. 아마도 9기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여운이 길어서 일겁니다. 그럼 우리 10기로 또 만나요. 제가 완벽하게 하는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see you again.
I'll be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