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그러므로 바타이유가 말하는 '불가능한 것(l'impossible)'의 개념은 단순한 저항성의 상징이나 진보에 대한 순진하고 낙관적인 믿음을 넘어선다. 진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해도 한계와 불가능의 확인과 완성 과정의 진전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 직선적인 역사관은 순환적인 것으로, 금기와 위반의 반복이 그려내는 원환으로 변용된다. 따라서 바타이유가 위반이라는 개념을 통해 겨냥했던 것은 단순히 무조건적인 전복이나 낙관적인 진보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인간과 사회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직시에 다름 아니다. 이성과 그에 따른 철학의 전 체계에 대항할 수 있는 방식, 즉 '코기토' 철학과 상품 형태의 물신에 대해 위반의 '불경'을 저지를 수 있을 신성모독의 방식은, 그러므로 그러한 체제에 대해 단순히 반대의 대립항을 설정하는 즉물적인 저항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 자체로 지니고 있는 한계, 그것들이 결코 자신 안에 포착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 재현의 철학이 결코 동질화할 수 없는 이질성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타이유는 초현실주의자의 낭만주의와 유토피아주의를 경멸하고, 저주하며, 넘어선다(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칸트적 '비판(Kritik)'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것, 혹은, 연대적 순서를 따라 『순수이성 비판』 후에 『판단력 비판』을 읽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판단력 비판』을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 읽는 행위에 해당할 터).


▷ Georges Bataille, L'expérience intérieure, Paris: Gallimard(coll. "Tel"), 1978.
▷ Georges Bataille, Œuvres complètes. Tome V: la somme athéologique I,
Paris: Gallimard, 1973.
*) 바타이유의 『내적 체험』은 그의 '무신론 대전(la somme athéologique)' 3부작의 첫째 권을 이루는, 가히 바타이유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아직 국역된 바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 책의 초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지만 마땅한 출판사를 아직 찾지 못했다.
15) "지성 속에는 하나의 맹점(tache aveugle)이 존재한다. 그것은 눈의 구조를 연상시킨다. 눈 안에서처럼 지성 안에서도 우리는 그 맹점을 어렵사리 찾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눈의 맹점이 보잘것없는 것임에 반해 지성은 본성상 자신의 맹점이 그 안에 지성 자체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를 원한다."
ㅡ 바타이유, 『내적 체험』, 전집 5권, p.129.
지성이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바로 이 "맹점"은 불가능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의 지성은 그 맹점에 도달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지성의 한계를 표시하고 언제나 지성의 표상 작용으로부터 벗어나며 불가능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 바로 이 맹점인 것이다. 따라서 바타이유의 맹점은 곧 지성과 철학, 경제와 제도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표라는 의미를 띠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포착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이러한 불가능성이 존재의 '진리'이자 인간의 '실상'이 되고 있는 것.

▷ Renata Salecl, Slavoj Žižek(eds.), Gaze and Voice as Love Objects,
Durham/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6.
*) '시선'의 문제는 사르트르(Sartre)나 라캉에게뿐만 아니라 바타이유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에게서 이 문제는 '송과선 눈(œil pinéal)'이라는 주제를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이 '눈'의 문제는 사실 데카르트(Descartes)의 '시각론' 혹은 '광학론'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차후에 다른 글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그리고 '재미있게') 다뤄보기로 하겠다. 다만 레나타 살레츨과 슬라보이 지젝이 함께 편집한 위 책에 두 번째로 수록된 알렌카 주판치치(Alenka Zupančič)의 글 "Philosophers' Blind Man's Buff"가 이 문제에 관련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만을 언급하고 지나가기로 한다.
16) 이러한 맥락에서 상징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환상과 이데올로기의 작용에 불현듯 상처와 균열을 내어 존재의 심연을 드러내주는 라캉(Lacan)의 실재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바타이유적인 불가능성의 개념과 많이 닮아 있다. 인간은 상징적 질서로의 편입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주체'로 탄생한다. 그러므로 라캉이 말하는 상징계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 우리가 하나의 주체로서 '정상성'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코드와 제도와 규칙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를 의미한다. 상징계 안에서 우리는 언어로 소통하며, 모든 것을 언어적으로 코드화된 질서 속에서 파악하고 포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징계는 이성적인 표상을 통해 포착 가능한 세계, 곧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질서로서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징적 세계의 안정성은 사실 라캉이 의미하는 바 "환상(fantasme)"의 효과에 다름 아니다. 상징계의 환상은 불현듯 그것의 표상 작용과 상징화 작용을 언제나 초과하여 노출되는 어떤 혼란, 코드화되지 않고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잉여적이고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상처 입고 균열이 가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본질적이고도 근원적인' 균열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다시 환상과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게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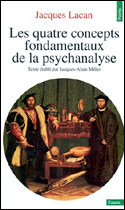
▷ Jacques Lacan,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Le séminaire, livre XI, Paris: Seuil(coll. "Le Champ freudien"), 1973.
▷ Jacques Lacan,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Le séminaire, livre XI, Paris: Seuil(coll. "Points essais"), 1990.
*) 이 세미나 11권은 일전에도 박상륭에 대한 글을 차용해 잠시 소개했던 적이 있다. 특히 이 책은 라캉의 세미나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들 중의 하나로 1990년에 문고판으로도 다시 간행된 바 있다.
17) 그러므로 실재라고 하는 것은 상징계의 제도적이며 코드화된 질서로써는 포착될 수 없는 어떤 '바깥'의 경험, 현실의 전부라고 여겨지던 언어적 구조로서의 상징계가 맞닥뜨리게 되는 일종의 "기묘한 현실(l'étrange réalité)"(세미나 11권, p.57)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재라고 하는 '전혀 다르고 낯선' 이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징적인 세계가 조화와 질서와 언어에 의해서 코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혼돈의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므로 바타이유의 불가능성과 마찬가지로 라캉의 실재 개념은 상징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가 결코 현실의 '전체'가 아님을, 우리의 이성적인 언어와 의식이 미처 다 포착할 수 없는 어떤 이질적인 '외부'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따라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세계가 은폐하고 있던 한계를 끈질기게 재확인시켜주는 어떤 트라우마와도 같은 것이 우리 존재의 '근원'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라캉이 "전체가-아님(pas-tout)"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모순적으로밖에는 규정될 수 없는 이러한 '상처(Trauma)'로서의 존재 사태이다.
18)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성과 실재의 개념은 단순한 허무주의 또는 패배주의적 순응성의 산물로 보일 수 있다. 직선적인 진보를 상정하는 역사관에 입각할 때 이러한 트라우마적이고 무질서한 규정될 수 없는 심연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은 분명 '보수적'이고 무기력하며 '반동적'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바타이유와 라캉의 사유는 초현실주의자들을 비롯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진보'에 대한 신념과 대립하고 결별한다. 바타이유의 불가능성과 라캉의 실재 개념이 공히 머금고 있는 의의는, 불가능 또는 실재에 대한 환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은폐 작용이 결코 완벽하게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줬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은 의식을 초과하며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실재는 끊임없이 의식의 장으로 넘어오면서 상징계라는 질서의 공간에 흠집을 낸다. 그러므로 '전체가-아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이러한 부단한 변화에 대해서 항상 개방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기도 한 것. 이러한 '불가능'의 세계, 멈추지 않는 실재의 침입으로 파악되는 세계는 분명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불가능성과 실재의 개념은 순진한 이상주의와 진보에 대한 신념을 상정하지 않으며 초현실주의자들보다 존재 사태의 '실상'과 '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게다가 비록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의 '잔혹성'을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유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그것이 진보적인 아방가르드 운동의 '혁명적' 성격 뒤에 감추어진 순진성과 물신성을 들추어냄으로써 향후 모든 '급진적인' 이론과 운동의 진정성을 '상대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데올로기와 환상의 효과가 종국에는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심층적이고 불가해한 존재의 심연을 우리 앞에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바타이유와 라캉의 사유는 어쩌면 가장 '급진적인' 극단에 서 있는 것인지 모른다. 특히나 이러한 종류의 '진보주의'는 초현실주의와 아방가르드 예술의 '순진한' 신념에 대해 바타이유의 인류학적이고 반(反)유토피아적인 '정치 철학'이 갖는 변별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Denis Hollier(éd.), Georges Bataille après tout, Paris: Belin, 1995.
▷ Les Temps modernes n° 602, Décembre 1998 - Janvier-Février 1999.
*) 위의 두 책은 최근 10년간의 바타이유 연구에 있어 중요한 논문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도 결국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항 대립을 넘어서는 '진보'의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욱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전복'을 위한 사회 운동의 메타적인 심급은 어디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물음이 될 것이다. 바타이유 사후, 특히나 바타이유의 '정치 철학', 특히 '공동체(communauté)'와 관련된 그의 사상이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정치 철학'의 계보에 마슈레(Macherey)와 낭시(Nancy)의 이론적 작업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Louis Althusser, Écrits sur la psychanalyse. Freud et Lacan,
Paris: STOCK/IMEC, 1993.
▷ Louis Althusser, Psychanalyse et sciences humaines. Deux conférences,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IMEC, 1996.
*) 정신분석에 대한 알튀세르의 책으로는 위의 두 권을 추천한다. 첫 번째 책의 몇몇 글은 예전에 국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마도 윤소영 선생의 번역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두 번째 책은 아직 국역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얄궂은 것은, 이 책이 더 쉽고 재미있다...). 알튀세르 '유행'이 한물간 지금, 이 책의 국역본이 나올 수 있을까? 어쨌든 언제나 번역을 고대하고 있는 책들 중의 하나.
19) 이러한 맥락에서 라캉의 정신분석과 마르크스주의의 접점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간파했던 이는 알튀세르(Althusser)였다. 그의 이데올로기론 자체가 라캉의 실재 개념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중층 결정"이라는 개념 역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라캉 이론 전반과 사회 철학, 그리고 독일 관념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논의를 제시해주고 있는 이는 지젝(Žižek)인데, 그는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현실을 왜곡하는 환상과 은폐의 장치로서만 파악하는 평면적인 마르크스주의의 대척점에 라캉을 위치시킨다. 우리가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임의적인 환상을 고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에 근거하여 현실을 현재의 상태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재를 '모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재를 '모르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마르크스가 "현실적 차이들을 사상함으로써만, 즉 모든 노동을 인간 노동력의 지출이라는 공통적인 성격으로 환원시킴으로써만"(디츠판, pp.87-88/김수행 번역, 93쪽) 물신 숭배의 기저에 숨어 있는 폭력적이고 임의적인 동질화 과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을 때, 동등한 것으로 교환될 수도 없고 동질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도 없는 노동이 바로 상품 물신성의 배후에 존재하는 '실재', 곧 우리가 그러한 교환 과정 안에서 '알고자 하지 않는' 실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바로 이어 마르크스가 "그들은 이것[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생산물들을 교환을 위해 가치로서 동질화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Sie wissen das nicht, aber sie tun es)"(디츠판, p.88/김수행 번역, 93-94쪽)라고 말했던 것은, 곧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하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이는 행위/실천(praxis)의 층위에서 작용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실재를 '알고' 있지만 마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양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p.33)는 것.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는 행위 그 자체이다. 실재를 알면서도 그것을 직시하거나 인식하고자 하지 않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작용과 심리는 또한 앞서 위에서 살펴보았던 프로이트적인 의미에서의 페티시즘과도 맞닿아 있는데, 그 작용의 메커니즘이 상징적 세계가 결코 전체가 아니며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즉 '실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부인(Verleugnung)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페티시즘의 '전형적인' 양태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New York: Verso, 1989.
▷ Slavoj Žižek,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London/New York: Verso, 1991.
*) 지젝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도 이곳저곳에서 열광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거의 확신하건대,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지젝을 읽고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지젝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는 위의 두 책을 추천한다. 지젝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들을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지젝-프로토콜'로서의 책들.
20)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대립항으로서의 초현실주의와 아방가르드는, 그것이 부르주아 예술관을 '대체'하는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다시금 '무관심성'의 근대적 낭만주의 미학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실재를 은폐하려는 낙관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안에 속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바타이유의 불가능성 개념과 라캉의 실재 개념이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과 궁극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은 바로 '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개인의 '내적인' 혁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일 텐데, 직선적인 진보에 대한 순진하고 낙관주의적인 믿음과 불가능성과 실재에 대한 비선형적이고 반유토피아주의적인 사유 사이에서 드러나는 양자의 차이점이 그러한 '혁명'의 가능 조건들을 전혀 상이한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에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다.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1: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