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읽은 글. The Mind: Less Puzzling in Chinese? 페이지는:
http://www.nybooks.com/daily/2016/06/30/the-mind-less-puzzling-in-chinese/

필자는 이 책의 저자. 제목이 <중국어의 해부>라니 내가 읽고 싶진 않으면서, 어떤 얘기 하는 책인지 (좀 많이) 알고 싶다. "다른 문화를 공부하는 이들은 두 번 득을 본다고 사람들은 말하곤 한다. 먼저,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다음, 자기 문화의 어떤 가정들이 자의적임을 알게 된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중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중국어로 하는 철학과 영어로 하는 철학의 차이, 그 철학이 다루는 문제들의 차이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에 대해 질문하는 글. <중국어의 해부>를 쓸 때 그가 품었던 의문 중엔, 정신 개념을 놓고 서양 철학이 벌여온 싸움의 일부는 서양 언어에 그 뿌리가 있는 게 아니냐.. 가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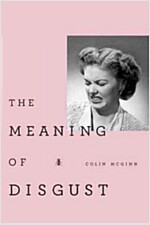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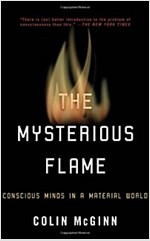
그런 의문, 질문을 영국 출신 재미 철학자 콜린 맥긴의 글들을 읽으면서 다시 떠올렸다 하는데,
내겐 조나단 밀러가 만들었던 BBC <무신론의 짧은 역사> 시리즈로 알았던 콜린 맥긴. 지금 이거 쓰면서 그의 책을 처음 검색해보는 콜린 맥긴. 많은 책들을 썼고 어떤 건 바로 관심이 간다. 위의 셋 중에선 특히 왼쪽. Mindfucking: A Critique of Mental Manipulation. 마인드퍽킹. 이 말이 책 제목으로 쓰였구나(처음은 아닐지 몰라도)며, 잠시 감사함.
어쨌든, "정신, 중국어론 그리 수수께끼 아닐 듯?" 이 글의 필자에 따르면,
중국어에선 동사가 강하고 영어에선 명사가 강하다. feel, experience, 이런 말들이 중국어에선 동사로 표현되지만 (현대 중국어가 영어식 표현 역어들을 갖게 되면서 그 경향이 약해지긴 했어도), 영어에선 명사로 표현되는 강한 경향이 있고, 그 때문일까 본질적으로 동사로 쓰여야할 말들까지 명사화하는 경향이 영어엔 있다. 이 강력한 명사화 경향 때문인지 몰라도, 실체 규정이 아마 불가능한 것들까지, 그걸 부르는 명사가 언어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로 접근되는 일. 정신의 문제, 심신 문제와 관련한 서양 철학의 곤경은 이런 서양 언어의 특징과 적어도 어느 정도는 관련 있지 않겠냐는게 필자의 결론.
짧은 글이고 애매하게 끝난다. 프린스턴 철학과의 한 교수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자기 생각을 말했더니,
"그래서, 심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같은 식으로 ㅋㅋㅋㅋ; 반응했다나.
막연히 (무식하게), 마인드-바디 프라블럼 이건 정말 양인들의 프라블럼.. 같은 생각을 나도 하긴 했었다. 이 글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 그 필자 자신, 아니면 누구라도, 자세하고 강력한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단 생각도 그래서 듬.
그런가 하면, 동양언어(한국어)와 서양언어(영어) 사이의 차이는
구속력과 해방력, 이걸 기준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도 듬. 언젠가 일기를 쓰면서, 누군가를 강력히 비판해야 했는데 그를 지칭하는 일이 큰 문제였다. 홍길동은.. 홍길동이.. 이러는 것도 너무나 어색했으며, "성 + 직업" 조합도 참으로 어색했고, "성 +"씨"" 조합도 마찬가지. ㅋㅋㅋ;;;; 영어에서 학술적이거나 어쨌든 공식적인 글에선 사람을 성으로만 가리키는 일, 이거 따라해서 성으로만 불러봤다. 그래도 어색했지만. 여기서 나는, 울프를 포함해 블룸스베리 사람들이 쓴 일기나 편지들에서, 사람을 이름으로 (퍼스트네임) 부르면서 그 사람에 대해 못할 말이 없다는 걸 기억했고, 여기에도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자문했다. 한국어에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애정이 강요된다. 아닌가? 그의 이름만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교착어는 애착을 강제하는 거야. : 자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