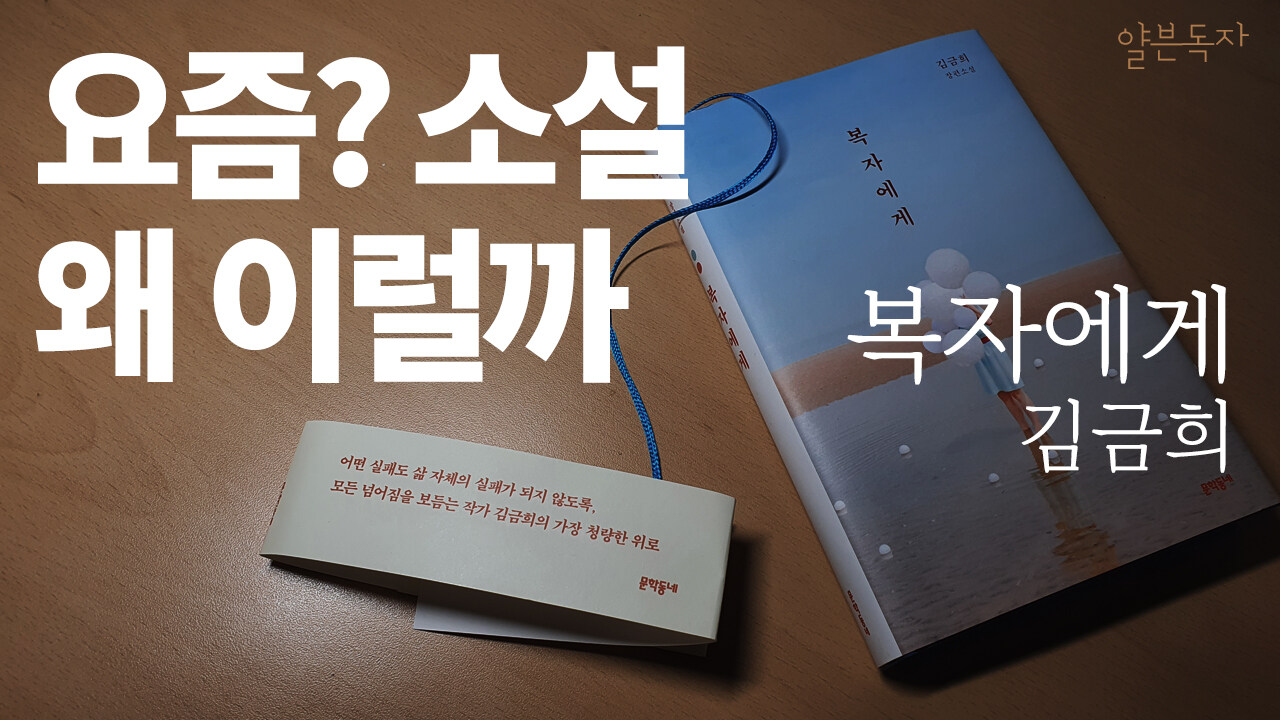-

-
복자에게
김금희 지음 / 문학동네 / 2020년 9월
평점 :



요즘 소설 왜 이래?
두서 없는 주절거림
좀 어거지일 수 있고 어그로스러울 수도 있는 리뷰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소설 내용을 자세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아니다.
제목을 ‘요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요즘’이란 것이 어디서부터 인지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요즘이 아닌 시절 그러니까 요즘 이전은 언제를 말하는거냐 할 수 있겠는데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나는 김애란, 황정은, 한유주 같은 작가들의 데뷔와 대략 그들의 두 번째 소설집이 출간되는 그 어디 즈음부터 출간되는 신인 작가들의 소설들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린게 아닐까 싶다 물론 사실관계를 들춰 확인해보면 전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막연하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최근 두 번째 소설집을 낸 정영수 작가처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작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든 작가들의 소설만 읽어온 건 아니고 그 사이 발표된 다른 작가들의 소설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 읽지 않은 것도 아니란 점도 말해 둔다
흥미가 시들해진 예를 하나만 말해보자면 이렇다
2016년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가 출간되고 나름 많은 소설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니 나 역시 궁금해 “쇼코의 미소”를 읽어봤는데 나는 좀 시큰둥했다
잘 쓰여진 작품이고를 떠나 소설을 쓰는 방식이라고 해야하나 그런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테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점이 헷갈린다는 것이다. 해당 소설이 특정 사건과 관련된 걸 다루려는가 하면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다. 정작 그것에 대해서는 슬쩍 냄새만 피우거나 흔적만 남길 뿐 주요 이야기는 그것들을 곁가지로 세워두고 그 주변의 이야기만 해서 김 빠지더라 뭐 그런 것이다.
작가의 작법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안읽으면 그만인 문제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금희 작가의 “복자에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김금희 작가의 작품에 별 관심이 없다 어떤 이유가 있어 한번 읽어보자 하게 되었고 소설을 읽기 전에 작가의 말이나 해설을 먼저 읽는 편이라 평균 이상의 길이로 쓰여진 작가의 말을 우선 읽어 보게 되었다
소설 “복자에게” 뒤편에 실려 있는 작가의 말 일부를 옮겨와 본다
『복자에게』는 제주의 한 의료원에서 일어난 산재사건과 그 소송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개 과정은 각색 되었거나 허구이며 특히 복자라는 인물은 창작된 인물임을 밝히고 싶다. 그럼에도 그 산재 인정을 위해 무려 팔 년간 싸워온 분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소설로 가져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짚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사건을 알고 나서야 제주에 대해 써보고 싶다는 막연한 열의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솔직히 나는 이 ‘작가의 말’만 믿고 너무 기대가 컸거나 아니면 그 기대 때문에 오독을 한 것은 아닌가란 생각을 소설을 다 읽고 나서야 했다.
일단 저 옮겨온 작가의 말만 보면 “복자에게”란 소설은 의료원에서 일어난 산재 사건과 그 투쟁과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소설의 주를 이루는 소설이어야 할지 모른다. 물론 그 사건이 모티프라고는 했지만 말이다.
소설을 읽어본 독자라면 이 소설 안에서 앞서 언급한 것들이 얼마나 소설화 되었는지 알 것이라 생각한다.
전체 230여 페이지 분량의 소설을 무식하게 무 자르듯 전후반으로 나눠볼 때 전반부는 거의 이영초롱과 복자의 이야기에 머무르고 있다. 의료원 산재 사건이 소설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밀도는 부족하다 느낀다.
제주에 대해 써보고 싶다고 작가는 말했지만 소설적 공간이 제주가 아니라 다른 도서 지방에서 일어난 산재 사건이라면 소설은 어떤 모습이 될까? 꼭 제주여야 하는 필연적 요소는 무엇일까? 솔직히 제주가 가진 역사적 피해와 그 그늘에서 살아오고 제주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삶을 그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굳이 제주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냐 그 말이다.
소설을 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은 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제주를 언급하고 작가의 말대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짚어봤다는데 점수를 줄 독자도 있을 것이다. 다만 나는 거기에 대해 강한 부정적 입장이라는 것이고.
“복자에게” 라는 소설을 다 읽은 지금 작가가 이 소설을 왜 썼을까 하는 생각만 남는다.
2017년 이탈리아 대표 문학상인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와 같은 소설을 바란 건 아니다.
어떤 실패도 삶 자체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모든 넘어짐을 보듬는 작가 김금희의 가장 청량한 위로
위 문장은 이 소설의 띠지 카피 문장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작가의 말 일부를 옮겨와 본다
소설의 한 문장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실패를 미워했어, 라는 말을 선택하고 싶다.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실패는 아프게도 계속되겠지만
그것이 삶 자체의 실패가 되게는 하지 말자고,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선언보다 필요한 것은 그조차도 용인하면서 계속되는 삶이라고 다짐하기 위해
이 소설을 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설을 쓰게 된 모티프가 무엇이 되었든 모티프는 그 발화점으로 남겨두고 일단 불 붙이는데 성공했다면 그 불을 더 키워 이야기를 전개했다면 하는 것이다.
이영초롱의 입장에서 복자라는 어릴적 친구와 함께 지나왔던 과거를 전개하고, 그리고 현재의 복자가 처한 상황의 배경으로 의료원 산재사건이 배경처럼 깔리는데 그 사건으로써의 제주도 배경은 소설의 초점만 흐리는 게 아닌가 싶다.
작가의 말에서 무엇무엇 누구는 허구이며 어디는 가상의 섬이다 라고 했다. 나는 이것 역시
작품에 대해 안개를 둘러친 보호막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소설은 취재 파일의 나열이 아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라는 걸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 알고 있다. 굳이 안해도 될 말을 붙여 놓는 건 내 소설에 대한 일종의 안전 장치일 수 있는데 이 안전 장치 없이 작가는 더 뻔뻔하게 철판을 깔거나 더 확실한 위장을 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운 소설이었다
소설의 모티프는 의료원 산재사고로 시작 되어 결국엔 일상적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이 삶 자체의 실패는 아니길 바라며 소설을 썼다고 한다.
나처럼 투덜대는 독자도 있겠고 격려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판단은 각자 하는 것이니 이쯤에서 투덜투덜은 그만하기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반대 의견을 가진 상대방과 물고 뜯고 씹고, 치고 박는 난상토론을 해야 재미가 있는데 일방적 주장만을 전달한다는 게 아쉽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리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