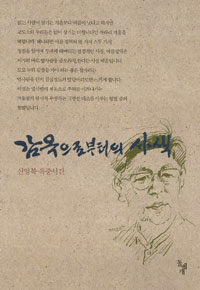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 돌베개 / 400쪽
(2015. 10. 08.)
독서는 타인의 사고를 반복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걱거리를 얻는다는 데에 보다 참된 의의가 있다. 세상이란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이다.
(P.24)
고독한 상태는 일종의 버려진 상태입니다. 스스로 나아간 상태와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창조의 산실'로서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독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어두운 옥방의 고독이 창조의 산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찬란한 햇빛 아래 산과 들과 숲과, 건물과...... 모든 것이 저마다 생동하는 우람한 합창 속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고독한 자리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인가.
고독은 고득 그것만으로도 가가스로 한 짐일 뿐 무엇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고독을 깨뜨리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으리라. 우렁찬 저 햇빛 찬란한 합창을 향하여 문 열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P.60)
우리는 거개가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냉정한 반면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는 무척 관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 우여곡절, 불가피했던 여러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 반하여, 타인의 그것에 대하여는 그 처지나 실수가 있기까지의 과정 전부에 대해 무지하거나 설령 알더라도 극히 일부밖에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연 너그럽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징역 속의 동거는 타인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P.115)
<시경>에 담긴 시들은 그 시대의 여러 고뇌와 그 사회의 여러 입장을 훌륭히 반영함으로써 그 시대를 뛰어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시대에 충실하였음은 물론 당시의 애환이 오늘의 숱한 사람들의 가슴에 까지 면면히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비로소 시가 그 시대를 뛰어넘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P.171)
해마다 가을이 되면 우리들은 추수라도 하듯이 한 해 동안 키워온 생각들을 거두어봅니다. 금년 가을도 여느 해나 다름없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공허한 마음은 뼈만 데리고 돌아온 '마다의 노인'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언제 한번 온몸으로 떠맡은 일 없이 그저 앉아서 생각만 달리는 일이 부질없기가 얼음 쪼아 구슬 만드는 격입니다. 그나마 내 쪽에서 벼리를 잡고 엮어간 일관된 사색이 아니라 그때 그때 부딪쳐오는 잡념잡사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연습 같은 것들이고 보면 빈약한 추수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정직한 최선을 다하지 못한 후회까지 더한다면 이제 문닫고 앉아 봄을 기다려야 할 겨울이 더 길고 추운 계절로만 여겨집니다.
(P.225)
세모의 사색이 대체로 저녁의 안온함과 더불어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는 이른바 유정(幽情)한 감회를 안겨주는 것임에 비하여, 새해의 그것은 정월달 싸늘한 추위인 듯 날카롭기가 칼끝 같습니다. 이 날선 겨울 새벽의 정신은 자신과 자신이 앞으로 겪어가야 할 일들을 냉철히 조망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P.229)
증오는 그것이 증오하는 경우든 증오를 받는 경우든 실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불행이 수반되게 마련이지만, 증오는 '있는 모순'을 유화(有和)하거나 은폐함이 없기 대문에 피차의 입장과 차이를 선명히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오의 안받침이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P.256)
장승처럼 선 자리에 발목 박고 세월보다 먼저 빛바래어가는 우리들에겐 수시로 우리의 얼굴을 두들겨줄 여름 소나기의 질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릎 칠 공감을 구하여 깊은 밤 살아 있는 책장을 넘기기도 하고, 같은 앞음을 가지기 위하여 좁은 우산을 버리고 함께 비를 맞기도 하며, 어줍찮은 타산의 돌 한 개라도 소중히 간수하면서......,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를 질타해줄 한 그릇의 소나기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P.257)
제가 징역 초년,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는 생각의 녹을 상대하면서 개달은 사실은 생각을 녹슬지 않게 간수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녹을 닦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컨대 일어서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역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 시작하는 일이 책을 읽는 일입니다. 그러나 독서는 실천이 아니며 독서는 다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시 한 발 걸음이었습니다. 더구나 독서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한 발 걸음이라 더디다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인식→인식→인식...'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현실의 튼튼한 땅일 잃고 공중으로 공중으로 지극히 관념화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른 모든 불구자가 그러듯이 목발을 짚고 걸어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목발로 삼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 즉 '과거의 실천'이었습니다.
(P.277)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가 몸소 겪은 자기 인생의 결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사상을 책에다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이끌어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조잡하고 단편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사상은 그 사람의 삶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이 조건에 대하여는 무지하면서 그 사람의 사상에 관여하려는 것은 무용하고 무리하고 무모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대로 둔 채 그 사람의 생각만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여하한 시도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폭력입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는 삶과 사상의 일체성을 끊어버림으로서 그의 정신세계를 이질화하고 결국 그 사람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P.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