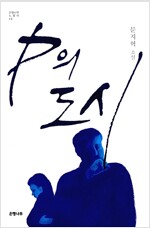
P의 도시
문지혁 / 은행나무 / 176쪽
(2018. 9. 13.)
다시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 주체할 수 없는 살의가 온몸의 신경 세포를 장악했다. 그건 마치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를 둘러싼 공기가 미세하게 변화하고, 지금 이 순간을 통과해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이 미묘하게 뒤틀리는 느낌.
방금 지나친 어떤 문이 닫히고 잠겨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기분. 분명 익숙한 공간인데도 처음 이곳에 던져진 것 처럼 모든 게 낯설었다.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괴부하가 걸려 멈춰버린 컴퓨터처럼, 나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끝내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P.16)
언제부턴가 나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가하고 있었다. 골목 한 귀퉁이에 버려진 식물처럼 아무도 모르게 날마다 조금씩 시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처음엔 투정도 부려보고 화도 내봤지만 기본적으로 오빠는 그런 걸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벽에 다 대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벽은 벽일 뿐이다. 어쩌면 그건 벽의 잘못도 아니다. 아주 나중에서야, 그건 오빠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P.60)
책을 덮는다.
사무실 밖으로 거리가 내려다보인다. 도시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다. 새벽기도가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와 앉아 있는 이 시간은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밤이 아침이 되는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둠이라는 고통을 빛이라는 신의 은총이 덮어주는 순간. 거대한 지구를 돌리는 신비한 힘이 지구상 의 모든 존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선사하려는 찰나. 나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풍경을 유심히 바라본다. 일 년 삼백육십오일 똑같아 보이는 풍경에도 날마다의 결이 있고 달마다의 변화가 있다. 그 출령이는 매일의 물결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는 영혼이 필요하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책상 한쪽의 라디오를 켠다. 구식이지만 아직 쓸 만하다. 늘 맞취놓는 클래식 채널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흘러 나온다. 혼자 아침을 맞는 순간에 썩 어울리는 음악이다. 창문 밖 저 멀리서 가느다랗게 빛이 들어온다. 신의 손길은 결코 전등 스위치처럼 한 번에 온 오프를 가르지 않는다. 대신 숙련된 첼리스트의 활처럼 언제나 부드럽고 온화하다. 아둔한 자들의 감각으로는 그 변화를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만이 존재하던 거리에 서서히 희미한 윤곽들이 드러난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리 끄트머리에서 불이 탁, 하고 켜진다.
(P.140)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피, 목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고루한 표현이 여기에 들어맞을 줄이야. 저주란 그런 것이다. DNA에 새겨진 악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한평호는 자신의 운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고, 따라서 그는 오지웅이든 강간범이든 이웃시촌이든 죽여야만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총을 달라는 그의 요구는 젖을 달리는 영아의 울음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한평화의 말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에게 그가 원하는 저주를 전달해주는 일의 아름다움에 관해 생각했고, 세상에 흩어진 고통과 고통을 연결해주는 일의 신성함을 연구했다. 결국 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고통이다. 삶이란 인간이 고통을 뭉뚱그려 부르는 방식에 다름 아니니까.
(P.147)